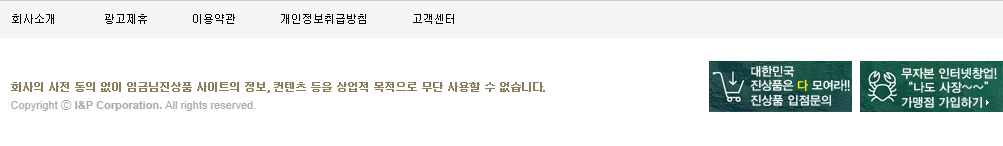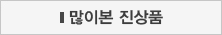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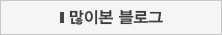

무형유산 지식백과(무형문화지식연구원)
http://hidream.or.kr/dongeuibogam/index.html - 한글 동의 보감 -음양오행 -사상의학 -장부학 -쑥뜸과 부항 -지압과 경락 -수지침요령 -민간요법과 질병기초 -한방약초의 종류와 효능 -한방식품의 종류와 효능 -한방약차 -한방약술 -암에 도움되는 약초 -건강 상식 -건강정보자료 -한방처방전 -민간약상식 -향약집성방과 향약본초 -1000가지 일반 요리법
태조 - 철종 1대 태조(1392년~) 2대 정종(1399년~) 3대 태종(1401년~) 4대 세종(1418년~) 5대 문종(1450년~) 6대 단종(1452년~) 7대 세조(1455년~) 8대 예종(1468년~) 9대 성종(1469년~) 10대 연산군(1494년~) 11대 중종(1506년~) 12대 인종(1545년~) 13대 명종(1545년~) 14대 선조(1567년)선조수정(1567년~) 15대 광해군중초본(1608년~)광해군정초본(1608년~) 16대 인조(1623년~) 17대 효종(1649년~) 18대 현종(1659년~)현종개수(1659년~) 19대 숙종(1674년~)숙종보궐정오(1674년~) 20대 경종(1720년~)경종수정(1720년~) 21대 영조(1724년~) 22대 정조(1776년~) 23대 순조(1800년~) 24대 헌종(1834년~) 25대 철종(1849년~) 고종 - 순종 26대 고종(1863년~) 27대 순종(1907년~) 순종부록(1910년~)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보통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작다고 생각하면 주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십니다. 엄마 혹은 아빠를 닮았기 때문에 작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키작은 아이는 단 한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키작은 아이 무엇이 문제일까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은 이유 1. 유전적인 요인 앞서 말한 유전적인 요인은 실제 원인의 30% 정도에만 해당합니다. 즉 나머지 70%의 역량은 부모의 관심과 아이의 습관, 후천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때문에 우리아이가 키가 작다면 유전적인 요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키가 크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키가 크기 위한 진리입니다. 밤 10시에서 2시 사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왕성한 시간대이기 때문이지요. 요즘 아이들은 과도한 학업량으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학교에서 조는 시간이 많은데요. 밤시간대만큼은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균형잡힌 영양상태 아이의 영양상태에 따라서 평균 키가 5cm 가량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타고나는 것 이상으로 균형잡힌 식사는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영양상태가 불균형하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역량보다 더 작게 자라게 됩니다. 환경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 소화가 잘 되는 영양풍부한 음식으로 준비해주세요 4. 운동부족 잠을 잘 자는 것 외에 운동이 부족해도 성장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키 작은 아이가 고민이시라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 능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농구처럼 몸을 뻗을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키가 작은 아이들로 고민이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워낙 외모가 중시되는 풍토에서 키는 빼놓을 수 없는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각종 한의원 프로그램에는 아이의 성장을 돕도록 오장육부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히 아이가 부족한 부분의 영양상태를 균형있게 맞춰주기 때문에 키가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근본적으로 튼튼해 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키 작은 아이 무엇이 문제일까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충분한 부모님의 관심과 아이의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는 조건들이니만큼 가정에서도 아이의 키에 한결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아이의 키도 한뼘 더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고흥김(흥양김) 해태(海苔), 해의(海衣), 자채(紫菜),청태(靑苔), 감태(甘苔), 건태(乾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숨 쉬는 땅, 전남 완도. 완도가 김과 미역의 천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가볍지만 비중 있는 음식으로, 처음에는 바닷가의 암초에 붙은 돌김을 뜯어먹었는데 1640년대 이후 김여익이란 사람이 양식, 건조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태인도 사람들은 해의을 처음 보는 해산물이라 그 이름을 몰라 단순히 태인도 김씨가 만든 것이라고 부르다가 몇 년 뒤에 김이라 부르고 한자로는 소해의(小海衣)라고 썼다. 이 김은 왕실에 진상하는 특산물로도 인기가 높아 임금이 광양김으로 수라를 드신 후 한 신하가 광양의 김아무개가 만든 음식이옵니다 아뢰자, 임금이 앞으론 이 바다풀을 그의 성을 따서<김>으로 부르도록 하여라... 하여 그 후 이름이 김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김에 관한 기록으로는 경상도지리지에 토산품으로 기록된 것과 ≪동국여지승람≫에 전라남도 광양군 태인도의 토산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양식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진상품관련근거김[海衣]은 강원도(간성군, 강릉대도호부, 삼척도호부, 양양도호부, 울진현, 평해군, 감영, 평해) 경상도(거제, 고성, 곤양, 기장, 남해, 울산, 하동, 경주부, 곤양군, 기장현, 동래현, 영덕현, 영일현, 울산군, 장기현, 청하현, 흥해군) 전라도(강진, 순천, 영광, 영암, 장흥, 해남, 흥양, 나주목, 영암군, 강진현, 장흥도호부, 진도군, 해남현, 제주목, 광양현, 보성군, 순천도호부, 흥양현(고흥)) 충청도(결성현, 남포현, 면천군, 보령현, 비인현, 서천군, 태안군, 해미현, 홍주목)에서 대전, 왕대비전, 혜경궁, 중궁전, 세자궁에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춘관통고, 공선정례 등에서 해의(海衣), 소해의(小海衣)라는 이름으로 임금님께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김을 먹은 시기 1285년 삼국유사(고려 충렬왕 11년) 기록이 최초. 신라시대 부터 먹기 시작한 것으로 복쌈(복리:福裏)이라 하여 대보름날에 취나물이나 배추 잎, 혹은 김에 밥을 싸서 먹는 것을 말 한다.1424~1425년 경상도 지리지(경남 감사 하연이 편찬한 지리책)에 따르면 조선시대 초기 경상남도 하동에서 김을 먹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년 전 한 할머니가 섬진강 어구에서 조개를 채취하고 있던 중 에 김을 먹어 보았더니 의외로 맛이 좋아, 그 후 대나무를 물속에 박아 세워 인공으로 김을 착생시킨 데서 김 양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429년 세종실록 - 조선시대 명나라에 보낼 진상품중 하나로 해의(김)가 기록되어 있다. 1456년 조선왕조실록-해의(김)을 진상품, 또는 무역품중 하나로 사고 판 기록이 있다. 1486년 동국여지승람 - 전라남도 광양군 태인도의 토산물로 채취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전라남도 광양에서는 김시식지(전라남도기념 물113호)와 함께 김여익이란 사람이 해의로 양식법을 고안해내 그 후 김 양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김 양식이 있기 전에는 해의(海衣)라고 부르던 자연산 돌김뿐이었다. 흔히 이 돌김을 양식하게 된 것이 일본 사람들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360여년 전 광양의 김씨(金氏) 성을 가진 사람이 양식하는 방법을 개발해내 그 사람의 성을 따서 김이라 불렀다. 1640년~1660년 광양 태인도에 살던 김여익이 해의를 보고 김양식과 건조법을 고안해낸 것을 기록하고 있다. 김 양식은 1640년 인조 때 전남 광양 태인도의 김여익(金汝瀷)이라는 사람이 해변에 표류해온 참나무 가지에 김이 붙은 것을 보고 양식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1714년 2월 광양현감 허심이 쓴 김여익 공의 묘표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세종지리지 등 문헌상에도 기록) 김여익은 짚을 엮어 ‘발장’을 만들고, 그 위에 해의를 고루 펴서 말린 뒤에 떼어내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후 태인도 주민들은 이를 보고 앞 다투어 해의를 양식하고 그것을 하동(河東)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1688년~1703년 겐로쿠 시대에 들어 일본의 김양식이 시작됨. 1840년 대나무 발을 엮어 한쪽은 바닥에 고정시키고 한쪽은 물에 뜨도록 한 떼밭 양식 개발. 1920년 떼발 양식을 개량한 뜬발 양식 시작(김을 일정 기간 동안만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 정문기(鄭文基) [조선의 수산] : 200여년 전 전라남도 완도에서 ‘방렴(防廉)’이라는 어구에 김이 착상한 것을 발견, 편발을 만들어 양식한데서 비롯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의 특성1600년대에는 대나무나 참나무 가지를 간석지에 세워 김을 이 가지에 달라붙어 자라게 하는 섶양식이 시작되었고, 1800년대에는 대나무 쪽으로 발을 엮어 한쪽은 바닥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물에 뜨도록 한 떼발 양식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떼발 양식을 개량한 뜬발 양식이 시작되었는데, 이 방법은 김을 날마다 일정 기간 동안만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으로 요즈음에도 이 방법을 쓰고 있다. 김은 세계적으로 약 80여 종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방사무늬김, 둥근돌김, 긴잎돌김, 잇바디돌김 등 10여 종이 알려져 있다. 형태는 세포가 한층으로 된 댓잎모양 또는 둥근 엽상체이며 수온이 낮은 가을과 봄에 본체가 나타난다. 수온이 높은 시기에는 곰팡이의 균사처럼 생긴 사상체로서, 조가비 속에서 살다가 가을에 각포자(殼胞子)를 내어 김으로 성숙하게 된다.<姜悌源> 김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서 구워 먹기도 하고 좌반, 부각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특히, 좌반이나 부각은 봄철에 김이 묵어 맛이 떨어질 때 이용하면 적격이다. 우리나라 수산양식업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긴 것은 김 양식업으로 이에 관해 구전되어 오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경상남도 하동지방에는 한 노파가 섬진강 하구에서 김이 많이 붙은 나무토막이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하여, 대나무나 나무로 된 섶을 세워서 양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와, 약 360년 전에 관찰사가 지방을 순시할 때 그 수행원 중의 한 사람이 김의 양식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또, 인조 때 태인도의 김여익(金汝瀷)이라는 사람이 해변에 표류해온 참나무 가지에 김이 붙은 것을 보고 양식하기 시작하였다고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미루어 조선 중기에는 양식을 시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양식방법은 나뭇가지를 세워서 양식하는 주립식조타홍(株立式粗朶篊) 또는 일본홍(日本篊)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뒤 발로 된 염홍(簾篊)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완도군 장용리에 거주하는 한 어민이, 어전(漁箭:물속에 나무를 세워 고기를 들게 하는 나무울)의 발에 김이 붙은 것에 착안하여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말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양식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김 양식이 가장 성행했던 곳은 광양만으로서 연안 도처에 섶이 세워져 있고, 김 양식장이 토지처럼 사유화되어 매매되고 있었다 한다. 민족항일기에는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였는데 이것은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으로서 반농반어적인 어민에게 적합한 사업이었으며, 일본인들이 특히 김을 기호하기 때문이었다. 양식법은 뜬발을 사용하는 법이 개발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김의 해외시장이 상실됨으로써 일대 타격을 받았으나, 얼마 후부터 일본 등지로의 수출이 활발해졌고, 근년에 이르러서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내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대량생산을 하고 있다. 양식방법도 그물발을 사용하는 망홍식으로 크게 개량되어 생산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이 오징어, 한천 등과 함께 3대 수산물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50일 정도 자란 김이 알맞게 연하고 색깔도 좋고 향기와 맛이 좋다. 발에서 떼 낸 김을 발장에 넣어 말린 것을 마른김(乾海苔)이라고 하여 먹는데, 마른김을 공기 중에 그대로 놓아두면 공기 중의 물기를 흡수하여 김의 독특한 색과 향기가 없어지게 되므로, 습기를 먹지 않도록 보관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김은 바다의 암초에 이끼처럼 붙어서 자란다. 길이 14∼25cm, 나비 5∼12cm이다. 몸은 긴 타원 모양 또는 줄처럼 생긴 달걀 모양이며 가장자리에 주름이 있다. 몸 윗부분은 붉은 갈색이고 아랫부분은 파란빛을 띤 녹색이다. 1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는 불규칙한 3각이나 4각 또는 다각형이며 불규칙하게 늘어선다. 단면은 4각형이고 높이는 폭보다 크거나 거의 같다. 밑부분 세포는 달걀 모양이거나 타원 모양이며 크고 무색인 헛뿌리를 낸다. 한국의 연안에서는 10월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겨울에서 봄에 걸쳐 번식하고, 그 뒤는 차차 줄어들어 여름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남해안, 서해안 등지에 분포한다. 김의 성분과 효능 1. 비타민 A 마른김에는 비타민 A가 100g 당 3750.0mg이 함유되어있는데, 이는 당근에 비해 약 3배, 시금치의 약 8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타민 A는 시각유지에 필수적인 로돕신을 생성하는 영양소이다. 또한 피부와 점막형성 및 기능유지, 상피세포 보호기능이 있다. 2. 비타민 B1 마른김 100g 에는 비타민 B1이 1.20mg 함유되어있는데, 이는 달걀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타민B1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의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촉매역할을 하기에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비타민이다. 3. 비타민 B2 마른 김 100g당 비타민 B2가 2.80mg으로 우유에 비해 약 22배가 함유되어 있다. 이는 에너지대사 과정에서 산화, 환원, 조효소로 작용해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4. 비타민 C 마른김 100g에는 비타민C가 93.0mg이 들어있는데, 이는 레몬(100g당 70.0mg)보다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 C의 결핌으로 인한 괴혈병의 예방에 도움을 주고 체내에 들어온 독성물질과 직접 결합해 독성성분을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5. 단백질마른김 100g에는 단백질이 38.60g으로 다른 해조류에 비하면 약 10~15%정도 높고, 고단백질 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콩의 단백질 함유량과 거의 비슷하고 계란의 3배가 넘는다. 다만 질은 계란보다는 떨어지는 편이다. 김의 질이 낮을수록 단백질의 함량은 낮다. 6. 식이섬유 마른김 100g에는 식이섬유소가1.70mg 함유되어있는데, 이는 양배추의 약 16배, 귤의 약 30배 이상이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의 합성을 막아주고 대장에 있는 발암물질을 흡착해 배설시켜주어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7. 무기질해조류의 특성상 칼륨, 칼슘, 철분, 인, 요오드 등이 풍부하여 무기질 공급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칼슘의 경우 265g, 인690g, 철분 15.3g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다른 식품에 비해 많은 편이다. 청태, 즉 초록색 김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칼슘의 함유량은 많아진다. 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오드는 곰팡이의 세포막을 파괴시켜 곰팡이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구은 김보다는 생김에 요오드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요오드가 함유된 생김을 고추장 위에 젚어 놓으면 곰팡이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김의 건강관련 효능1. 혈압을 떨어뜨린다.우리 몸은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염분 중에 들어 있는 나트륨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는데, 해조류 에 함유된 칼륨이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신장기능 저하 등 각종 성인병 증세에 효과가 있다. 2. 골다공증을 예방해준다.다시마, 미역, 김, 톳 등의 해조류에는 칼슘 함량이 분유와 맞먹을 많이 들어있다. 칼슘은 뼈와 이의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어린이의 성장발육을 돕고 갱년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을 예방해 준다. 3. 갑상선 부종을 막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한다.우리 몸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약해져서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저하되며 기력이 없어지게 된다. 성장기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부어오르고 지능 발달이 늦어지며 머리털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등의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해조류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인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을 보호해 주므로 갑상선 부종을 방지하고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가꾸어 준다. 4. 변비 치료 및 항암효과가 있다.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식물성 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대변을 부드럽게 해주므로 변비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5. 다이어트 효과 해조류의 성분을 보면 단백질이 10%, 당질이 30~40% 정도이고 그밖에 칼슘, 칼륨, 요오드 등의 무기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관련문헌 및 출처 두산백과, 김의 유래|작성자 김삿갓, 경상도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춘관통고, 공선정례, 동국여지승람, 세종지리지
&nb...의(海衣)’, ‘자채(紫菜)’라고 하며 우리에게는 ‘해태(海苔)’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일본식 표기로, 우리나라에서의 ‘파래’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김에 관한 기록으로는 경상도지리지에 토산품으로 기록된 것과 ≪동국여지승람≫에 전라남도 광양군 태인도의 토산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양식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진상품관련근거김[海衣]은 강원도(간성군, 강릉대도호부, 삼척도호부, 양양도호부, 울진현, 평해군, 감영, 평해) 경상도(거제, 고성, 곤양, 기장, 남해, 울산, 하동, 경주부, 곤양군, 기장현, 동래현, 영덕현, 영일현, 울산군, 장기현, 청하현, 흥해군) 전라도(강진, 순천, 영광, 영암, 장흥, 해남현, 흥양, 나주목, 영암군, 강진현, 장흥도호부, 진도군, 해남현, 제주목, 광양현, 보성군, 순천도호부, 흥양현) 충청도(결성현, 남포현, 면천군, 보령현, 비인현, 서천군, 태안군, 해미현, 홍주목)에서 대전, 왕대비전, 혜경궁, 중궁전, 세자궁에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춘관통고, 공선정례 등에서 해의(海衣), 소해의(小海衣)라는 이름으로 12월에서 2월 사이에 임금님께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김의 유래 해태(海苔), 해의(海衣), 자채(紫菜), 청태(靑苔), 감태(甘苔)라고도 하며 마른김은 건태(乾苔)라 한다. 처음에는 바닷가의 암초에 붙은 돌김을 뜯어먹었는데 1640년대 이후 김여익이란 사람이 양식, 건조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태인도 사람들은 해의을 처음 보는 해산물이라 그 이름을 몰라 단순히 태인도 김씨가 만든 것이라고 부르다가 몇 년 뒤에 김이라 부르고 한자로는 소해의(小海衣)라고 썼다. 이 김은 왕실에 진상하는 특산물로도 인기가 높아 임금이 광양김으로 수라를 드신 후 한 신하가 광양의 김아무개가 만든 음식이옵니다 아뢰자, 임금이 앞으론 이 바다풀을 그의 성을 따서<김>으로 부르도록 하여라... 하여 그 후 이름이 김이 되었다고 한다. 김을 먹은 시기 1285년 삼국유사(고려 충렬왕 11년) 기록이 최초. 신라시대 부터 먹기 시작한 것으로 복쌈(복리:福裏)이라 하여 대보름날에 취나물이나 배추 잎, 혹은 김에 밥을 싸서 먹는 것을 말 한다.1424~1425년 경상도 지리지(경남 감사 하연이 편찬한 지리책)에 따르면 조선시대 초기 경상남도 하동에서 김을 먹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년 전 한 할머니가 섬진강 어구에서 조개를 채취하고 있던 중 에 김을 먹어 보았더니 의외로 맛이 좋아, 그 후 대나무를 물속에 박아 세워 인공으로 김을 착생시킨 데서 김 양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429년 세종실록 - 조선시대 명나라에 보낼 진상품중 하나로 해의(김)가 기록되어 있다. 1456년 조선왕조실록-해의(김)을 진상품, 또는 무역품중 하나로 사고 판 기록이 있다. 1486년 동국여지승람 - 전라남도 광양군 태인도의 토산물로 채취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전라남도 광양에서는 김시식지(전라남도기념 물113호)와 함께 김여익이란 사람이 해의로 양식법을 고안해내 그 후 김 양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김 양식이 있기 전에는 해의(海衣)라고 부르던 자연산 돌김뿐이었다. 흔히 이 돌김을 양식하게 된 것이 일본 사람들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360여년 전 광양의 김씨(金氏) 성을 가진 사람이 양식하는 방법을 개발해내 그 사람의 성을 따서 김이라 불렀다. 1640년~1660년 광양 태인도에 살던 김여익이 해의를 보고 김양식과 건조법을 고안해낸 것을 기록하고 있다. 김 양식은 1640년 인조 때 전남 광양 태인도의 김여익(金汝瀷)이라는 사람이 해변에 표류해온 참나무 가지에 김이 붙은 것을 보고 양식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1714년 2월 광양현감 허심이 쓴 김여익 공의 묘표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세종지리지 등 문헌상에도 기록) 김여익은 짚을 엮어 ‘발장’을 만들고, 그 위에 해의를 고루 펴서 말린 뒤에 떼어내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후 태인도 주민들은 이를 보고 앞 다투어 해의를 양식하고 그것을 하동(河東)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1688년~1703년 겐로쿠 시대에 들어 일본의 김양식이 시작됨. 1840년 대나무 발을 엮어 한쪽은 바닥에 고정시키고 한쪽은 물에 뜨도록 한 떼밭 양식 개발. 1920년 떼발 양식을 개량한 뜬발 양식 시작(김을 일정 기간 동안만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 정문기(鄭文基) [조선의 수산] : 200여년 전 전라남도 완도에서 ‘방렴(防廉)’이라는 어구에 김이 착상한 것을 발견, 편발을 만들어 양식한데서 비롯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광천 김의 특성1600년대에는 대나무나 참나무 가지를 간석지에 세워 김을 이 가지에 달라붙어 자라게 하는 섶양식이 시작되었고, 1800년대에는 대나무 쪽으로 발을 엮어 한쪽은 바닥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물에 뜨도록 한 떼발 양식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떼발 양식을 개량한 뜬발 양식이 시작되었는데, 이 방법은 김을 날마다 일정 기간 동안만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으로 요즈음에도 이 방법을 쓰고 있다. 김은 세계적으로 약 80여 종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방사무늬김, 둥근돌김, 긴잎돌김, 잇바디돌김 등 10여 종이 알려져 있다. 형태는 세포가 한층으로 된 댓잎모양 또는 둥근 엽상체이며 수온이 낮은 가을과 봄에 본체가 나타난다. 수온이 높은 시기에는 곰팡이의 균사처럼 생긴 사상체로서, 조가비 속에서 살다가 가을에 각포자(殼胞子)를 내어 김으로 성숙하게 된다.<姜悌源> 김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서 구워 먹기도 하고 좌반, 부각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특히, 좌반이나 부각은 봄철에 김이 묵어 맛이 떨어질 때 이용하면 적격이다. 우리나라 수산양식업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긴 것은 김 양식업으로 이에 관해 구전되어 오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경상남도 하동지방에는 한 노파가 섬진강 하구에서 김이 많이 붙은 나무토막이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하여, 대나무나 나무로 된 섶을 세워서 양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와, 약 360년 전에 관찰사가 지방을 순시할 때 그 수행원 중의 한 사람이 김의 양식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또, 인조 때 태인도의 김여익(金汝瀷)이라는 사람이 해변에 표류해온 참나무 가지에 김이 붙은 것을 보고 양식하기 시작하였다고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미루어 조선 중기에는 양식을 시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양식방법은 나뭇가지를 세워서 양식하는 주립식조타홍(株立式粗朶篊) 또는 일본홍(日本篊)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뒤 발로 된 염홍(簾篊)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완도군 장용리에 거주하는 한 어민이, 어전(漁箭:물속에 나무를 세워 고기를 들게 하는 나무울)의 발에 김이 붙은 것에 착안하여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말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양식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김 양식이 가장 성행했던 곳은 광양만으로서 연안 도처에 섶이 세워져 있고, 김 양식장이 토지처럼 사유화되어 매매되고 있었다 한다. 민족항일기에는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였는데 이것은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으로서 반농반어적인 어민에게 적합한 사업이었으며, 일본인들이 특히 김을 기호하기 때문이었다. 양식법은 뜬발을 사용하는 법이 개발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김의 해외시장이 상실됨으로써 일대 타격을 받았으나, 얼마 후부터 일본 등지로의 수출이 활발해졌고, 근년에 이르러서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내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대량생산을 하고 있다. 양식방법도 그물발을 사용하는 망홍식으로 크게 개량되어 생산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이 오징어, 한천 등과 함께 3대 수산물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50일 정도 자란 김이 알맞게 연하고 색깔도 좋고 향기와 맛이 좋다. 발에서 떼 낸 김을 발장에 넣어 말린 것을 마른김(乾海苔)이라고 하여 먹는데, 마른김을 공기 중에 그대로 놓아두면 공기 중의 물기를 흡수하여 김의 독특한 색과 향기가 없어지게 되므로, 습기를 먹지 않도록 보관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김은 바다의 암초에 이끼처럼 붙어서 자란다. 길이 14∼25cm, 나비 5∼12cm이다. 몸은 긴 타원 모양 또는 줄처럼 생긴 달걀 모양이며 가장자리에 주름이 있다. 몸 윗부분은 붉은 갈색이고 아랫부분은 파란빛을 띤 녹색이다. 1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는 불규칙한 3각이나 4각 또는 다각형이며 불규칙하게 늘어선다. 단면은 4각형이고 높이는 폭보다 크거나 거의 같다. 밑부분 세포는 달걀 모양이거나 타원 모양이며 크고 무색인 헛뿌리를 낸다. 한국의 연안에서는 10월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겨울에서 봄에 걸쳐 번식하고, 그 뒤는 차차 줄어들어 여름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남해안, 서해안 등지에 분포한다. 김의 성분과 효능 1. 비타민 A 마른김에는 비타민 A가 100g 당 3750.0mg이 함유되어있는데, 이는 당근에 비해 약 3배, 시금치의 약 8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타민 A는 시각유지에 필수적인 로돕신을 생성하는 영양소이다. 또한 피부와 점막형성 및 기능유지, 상피세포 보호기능이 있다. 2. 비타민 B1 마른김 100g 에는 비타민 B1이 1.20mg 함유되어있는데, 이는 달걀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타민B1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의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촉매역할을 하기에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비타민이다. 3. 비타민 B2 마른 김 100g당 비타민 B2가 2.80mg으로 우유에 비해 약 22배가 함유되어 있다. 이는 에너지대사 과정에서 산화, 환원, 조효소로 작용해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4. 비타민 C 마른김 100g에는 비타민C가 93.0mg이 들어있는데, 이는 레몬(100g당 70.0mg)보다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 C의 결핌으로 인한 괴혈병의 예방에 도움을 주고 체내에 들어온 독성물질과 직접 결합해 독성성분을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5. 단백질마른김 100g에는 단백질이 38.60g으로 다른 해조류에 비하면 약 10~15%정도 높고, 고단백질 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콩의 단백질 함유량과 거의 비슷하고 계란의 3배가 넘는다. 다만 질은 계란보다는 떨어지는 편이다. 김의 질이 낮을수록 단백질의 함량은 낮다. 6. 식이섬유 마른김 100g에는 식이섬유소가1.70mg 함유되어있는데, 이는 양배추의 약 16배, 귤의 약 30배 이상이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의 합성을 막아주고 대장에 있는 발암물질을 흡착해 배설시켜주어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7. 무기질해조류의 특성상 칼륨, 칼슘, 철분, 인, 요오드 등이 풍부하여 무기질 공급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칼슘의 경우 265g, 인690g, 철분 15.3g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다른 식품에 비해 많은 편이다. 청태, 즉 초록색 김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칼슘의 함유량은 많아진다. 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오드는 곰팡이의 세포막을 파괴시켜 곰팡이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구은 김보다는 생김에 요오드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요오드가 함유된 생김을 고추장 위에 젚어 놓으면 곰팡이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김의 건강관련 효능1. 혈압을 떨어뜨린다.우리 몸은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염분 중에 들어 있는 나트륨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는데, 해조류 에 함유된 칼륨이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신장기능 저하 등 각종 성인병 증세에 효과가 있다. 2. 골다공증을 예방해준다.다시마, 미역, 김, 톳 등의 해조류에는 칼슘 함량이 분유와 맞먹을 많이 들어있다. 칼슘은 뼈와 이의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어린이의 성장발육을 돕고 갱년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을 예방해 준다. 3. 갑상선 부종을 막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한다.우리 몸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약해져서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저하되며 기력이 없어지게 된다. 성장기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부어오르고 지능 발달이 늦어지며 머리털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등의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해조류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인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을 보호해 주므로 갑상선 부종을 방지하고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가꾸어 준다. 4. 변비 치료 및 항암효과가 있다.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식물성 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대변을 부드럽게 해주므로 변비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5. 다이어트 효과 해조류의 성분을 보면 단백질이 10%, 당질이 30~40% 정도이고 그밖에 칼슘, 칼륨, 요오드 등의 무기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관련문헌 및 출처 두산백과, 김의 유래|작성자 김삿갓, 경상도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춘관통고, 공선정례, 동국여지승람, 세종지리지
광천김은 해태(海苔), 해의(海衣), 자채(紫菜),청태(靑苔), 감태(甘苔), 건태(乾苔) 김은 한자어로는 ‘해의(海衣)’, ‘자채(紫菜)’라고 하며 우리에게는 ‘해태(海苔)’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일본식 표기로, 우리나라에서의 ‘파래’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김에 관한 기록으로는 경상도지리지에 토산품으로 기록된 것과 ≪동국여지승람≫에 전라남도 광양군 태인도의 토산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양식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숨 쉬는 땅, 전남 완도. 완도가 김과 미역의 천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가볍지만 비중 있는 음식으로, 처음에는 바닷가의 암초에 붙은 돌김을 뜯어먹었는데 1640년대 이후 김여익이란 사람이 양식, 건조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태인도 사람들은 해의을 처음 보는 해산물이라 그 이름을 몰라 단순히 태인도 김씨가 만든 것이라고 부르다가 몇 년 뒤에 김이라 부르고 한자로는 소해의(小海衣)라고 썼다. 이 김은 왕실에 진상하는 특산물로도 인기가 높아 임금이 광양김으로 수라를 드신 후 한 신하가 광양의 김아무개가 만든 음식이옵니다 아뢰자, 임금이 앞으론 이 바다풀을 그의 성을 따서<김>으로 부르도록 하여라... 하여 그 후 이름이 김이 되었다고 한다. 진상품관련근거김[海衣]은 강원도(간성군, 강릉대도호부, 삼척도호부, 양양도호부, 울진현, 평해군, 감영, 평해) 경상도(거제, 고성, 곤양, 기장, 남해, 울산, 하동, 경주부, 곤양군, 기장현, 동래현, 영덕현, 영일현, 울산군, 장기현, 청하현, 흥해군) 전라도(강진, 순천, 영광, 영암, 장흥, 해남, 흥양, 나주목, 영암군, 강진현, 장흥도호부, 진도군, 해남현, 제주목, 광양현, 보성군, 순천도호부, 흥양현(고흥)) 충청도(결성현, 남포현, 면천군, 보령현, 비인현, 서천군, 태안군, 해미현, 홍주목)에서 대전, 왕대비전, 혜경궁, 중궁전, 세자궁에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춘관통고, 공선정례 등에서 해의(海衣), 소해의(小海衣)라는 이름으로 12월에서 2월 사이에 임금님께 진상하였고 청와대에도 공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김을 먹은 시기 1285년 삼국유사(고려 충렬왕 11년) 기록이 최초. 신라시대 부터 먹기 시작한 것으로 복쌈(복리:福裏)이라 하여 대보름날에 취나물이나 배추 잎, 혹은 김에 밥을 싸서 먹는 것을 말 한다.1424~1425년 경상도 지리지(경남 감사 하연이 편찬한 지리책)에 따르면 조선시대 초기 경상남도 하동에서 김을 먹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년 전 한 할머니가 섬진강 어구에서 조개를 채취하고 있던 중 에 김을 먹어 보았더니 의외로 맛이 좋아, 그 후 대나무를 물속에 박아 세워 인공으로 김을 착생시킨 데서 김 양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429년 세종실록 - 조선시대 명나라에 보낼 진상품중 하나로 해의(김)가 기록되어 있다. 1456년 조선왕조실록-해의(김)을 진상품, 또는 무역품중 하나로 사고 판 기록이 있다. 1486년 동국여지승람 - 전라남도 광양군 태인도의 토산물로 채취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전라남도 광양에서는 김시식지(전라남도기념 물113호)와 함께 김여익이란 사람이 해의로 양식법을 고안해내 그 후 김 양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김 양식이 있기 전에는 해의(海衣)라고 부르던 자연산 돌김뿐이었다. 흔히 이 돌김을 양식하게 된 것이 일본 사람들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360여년 전 광양의 김씨(金氏) 성을 가진 사람이 양식하는 방법을 개발해내 그 사람의 성을 따서 김이라 불렀다. 1640년~1660년 광양 태인도에 살던 김여익이 해의를 보고 김양식과 건조법을 고안해낸 것을 기록하고 있다. 김 양식은 1640년 인조 때 전남 광양 태인도의 김여익(金汝瀷)이라는 사람이 해변에 표류해온 참나무 가지에 김이 붙은 것을 보고 양식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1714년 2월 광양현감 허심이 쓴 김여익 공의 묘표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세종지리지 등 문헌상에도 기록) 김여익은 짚을 엮어 ‘발장’을 만들고, 그 위에 해의를 고루 펴서 말린 뒤에 떼어내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후 태인도 주민들은 이를 보고 앞 다투어 해의를 양식하고 그것을 하동(河東)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1688년~1703년 겐로쿠 시대에 들어 일본의 김양식이 시작됨. 1840년 대나무 발을 엮어 한쪽은 바닥에 고정시키고 한쪽은 물에 뜨도록 한 떼밭 양식 개발. 1920년 떼발 양식을 개량한 뜬발 양식 시작(김을 일정 기간 동안만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 정문기(鄭文基) [조선의 수산] : 200여년 전 전라남도 완도에서 ‘방렴(防廉)’이라는 어구에 김이 착상한 것을 발견, 편발을 만들어 양식한데서 비롯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의 특성1600년대에는 대나무나 참나무 가지를 간석지에 세워 김을 이 가지에 달라붙어 자라게 하는 섶양식이 시작되었고, 1800년대에는 대나무 쪽으로 발을 엮어 한쪽은 바닥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물에 뜨도록 한 떼발 양식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떼발 양식을 개량한 뜬발 양식이 시작되었는데, 이 방법은 김을 날마다 일정 기간 동안만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으로 요즈음에도 이 방법을 쓰고 있다. 김은 세계적으로 약 80여 종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방사무늬김, 둥근돌김, 긴잎돌김, 잇바디돌김 등 10여 종이 알려져 있다. 형태는 세포가 한층으로 된 댓잎모양 또는 둥근 엽상체이며 수온이 낮은 가을과 봄에 본체가 나타난다. 수온이 높은 시기에는 곰팡이의 균사처럼 생긴 사상체로서, 조가비 속에서 살다가 가을에 각포자(殼胞子)를 내어 김으로 성숙하게 된다.<姜悌源> 김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서 구워 먹기도 하고 좌반, 부각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특히, 좌반이나 부각은 봄철에 김이 묵어 맛이 떨어질 때 이용하면 적격이다. 우리나라 수산양식업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긴 것은 김 양식업으로 이에 관해 구전되어 오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경상남도 하동지방에는 한 노파가 섬진강 하구에서 김이 많이 붙은 나무토막이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하여, 대나무나 나무로 된 섶을 세워서 양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와, 약 360년 전에 관찰사가 지방을 순시할 때 그 수행원 중의 한 사람이 김의 양식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또, 인조 때 태인도의 김여익(金汝瀷)이라는 사람이 해변에 표류해온 참나무 가지에 김이 붙은 것을 보고 양식하기 시작하였다고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미루어 조선 중기에는 양식을 시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양식방법은 나뭇가지를 세워서 양식하는 주립식조타홍(株立式粗朶篊) 또는 일본홍(日本篊)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뒤 발로 된 염홍(簾篊)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완도군 장용리에 거주하는 한 어민이, 어전(漁箭:물속에 나무를 세워 고기를 들게 하는 나무울)의 발에 김이 붙은 것에 착안하여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말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양식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김 양식이 가장 성행했던 곳은 광양만으로서 연안 도처에 섶이 세워져 있고, 김 양식장이 토지처럼 사유화되어 매매되고 있었다 한다. 민족항일기에는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였는데 이것은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으로서 반농반어적인 어민에게 적합한 사업이었으며, 일본인들이 특히 김을 기호하기 때문이었다. 양식법은 뜬발을 사용하는 법이 개발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김의 해외시장이 상실됨으로써 일대 타격을 받았으나, 얼마 후부터 일본 등지로의 수출이 활발해졌고, 근년에 이르러서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내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대량생산을 하고 있다. 양식방법도 그물발을 사용하는 망홍식으로 크게 개량되어 생산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이 오징어, 한천 등과 함께 3대 수산물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50일 정도 자란 김이 알맞게 연하고 색깔도 좋고 향기와 맛이 좋다. 발에서 떼 낸 김을 발장에 넣어 말린 것을 마른김(乾海苔)이라고 하여 먹는데, 마른김을 공기 중에 그대로 놓아두면 공기 중의 물기를 흡수하여 김의 독특한 색과 향기가 없어지게 되므로, 습기를 먹지 않도록 보관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김은 바다의 암초에 이끼처럼 붙어서 자란다. 길이 14∼25cm, 나비 5∼12cm이다. 몸은 긴 타원 모양 또는 줄처럼 생긴 달걀 모양이며 가장자리에 주름이 있다. 몸 윗부분은 붉은 갈색이고 아랫부분은 파란빛을 띤 녹색이다. 1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는 불규칙한 3각이나 4각 또는 다각형이며 불규칙하게 늘어선다. 단면은 4각형이고 높이는 폭보다 크거나 거의 같다. 밑부분 세포는 달걀 모양이거나 타원 모양이며 크고 무색인 헛뿌리를 낸다. 한국의 연안에서는 10월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겨울에서 봄에 걸쳐 번식하고, 그 뒤는 차차 줄어들어 여름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남해안, 서해안 등지에 분포한다. 김의 성분과 효능 1. 비타민 A 마른김에는 비타민 A가 100g 당 3750.0mg이 함유되어있는데, 이는 당근에 비해 약 3배, 시금치의 약 8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타민 A는 시각유지에 필수적인 로돕신을 생성하는 영양소이다. 또한 피부와 점막형성 및 기능유지, 상피세포 보호기능이 있다. 2. 비타민 B1 마른김 100g 에는 비타민 B1이 1.20mg 함유되어있는데, 이는 달걀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타민B1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의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촉매역할을 하기에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비타민이다. 3. 비타민 B2 마른 김 100g당 비타민 B2가 2.80mg으로 우유에 비해 약 22배가 함유되어 있다. 이는 에너지대사 과정에서 산화, 환원, 조효소로 작용해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4. 비타민 C 마른김 100g에는 비타민C가 93.0mg이 들어있는데, 이는 레몬(100g당 70.0mg)보다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 C의 결핌으로 인한 괴혈병의 예방에 도움을 주고 체내에 들어온 독성물질과 직접 결합해 독성성분을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5. 단백질마른김 100g에는 단백질이 38.60g으로 다른 해조류에 비하면 약 10~15%정도 높고, 고단백질 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콩의 단백질 함유량과 거의 비슷하고 계란의 3배가 넘는다. 다만 질은 계란보다는 떨어지는 편이다. 김의 질이 낮을수록 단백질의 함량은 낮다. 6. 식이섬유 마른김 100g에는 식이섬유소가1.70mg 함유되어있는데, 이는 양배추의 약 16배, 귤의 약 30배 이상이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의 합성을 막아주고 대장에 있는 발암물질을 흡착해 배설시켜주어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7. 무기질해조류의 특성상 칼륨, 칼슘, 철분, 인, 요오드 등이 풍부하여 무기질 공급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칼슘의 경우 265g, 인690g, 철분 15.3g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다른 식품에 비해 많은 편이다. 청태, 즉 초록색 김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칼슘의 함유량은 많아진다. 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오드는 곰팡이의 세포막을 파괴시켜 곰팡이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구은 김보다는 생김에 요오드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요오드가 함유된 생김을 고추장 위에 젚어 놓으면 곰팡이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김의 건강관련 효능1. 혈압을 떨어뜨린다.우리 몸은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염분 중에 들어 있는 나트륨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는데, 해조류 에 함유된 칼륨이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신장기능 저하 등 각종 성인병 증세에 효과가 있다. 2. 골다공증을 예방해준다.다시마, 미역, 김, 톳 등의 해조류에는 칼슘 함량이 분유와 맞먹을 많이 들어있다. 칼슘은 뼈와 이의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어린이의 성장발육을 돕고 갱년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을 예방해 준다. 3. 갑상선 부종을 막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한다.우리 몸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약해져서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저하되며 기력이 없어지게 된다. 성장기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부어오르고 지능 발달이 늦어지며 머리털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등의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해조류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인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을 보호해 주므로 갑상선 부종을 방지하고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가꾸어 준다. 4. 변비 치료 및 항암효과가 있다.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식물성 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대변을 부드럽게 해주므로 변비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5. 다이어트 효과 해조류의 성분을 보면 단백질이 10%, 당질이 30~40% 정도이고 그밖에 칼슘, 칼륨, 요오드 등의 무기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관련문헌 및 출처 두산백과, 김의 유래|작성자 김삿갓, 경상도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춘관통고, 공선정례, 동국여지승람, 세종지리지

≪ 굴(참굴) 무엇...경기도(강화도호부,교동현,김포현,남양도호부(화성),부평도호부,수원도호부,안산군,인천도호부,통진현,풍덕군) 경상도(고성현(통영),곤양군,김해도호부,동래현,사천현,울산군,熊川縣,진해현,창원도호부,하동현) 전라도(강진현,나주목,낙안군,무안현,보성군,부안현,순천도호부,영광군,영암군,옥구현,장흥도호부,진도군,함평현,해남현,흥양현) 충청도(당진현,면천군,보령현,서산군,서천군,태안군,해미현,홍주목) 평안도(곽산군,귀성도호부,박천군,삼화현,선천군,숙천도호부,안주목,영유현,용강현,용천군,정주목,증산현,철산군,평양부,함종현) 함경도(경원도호부,경흥도호부,덕원도호부,문천군,부령도호부,안변도호부,영흥대도호부,함흥부,강령현,연안도호부,옹진현,해주목) 제주도(제주) 황해도(안악군)에서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춘관통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역주탐라지에 기록되어있다. 주치증상<本經(본경)>: 傷寒(상한)의 寒熱往來(한열왕래), 溫病(온병)과 瘧疾(학질)의 심한 발열, 심한 怒氣(노기)를 치료하고 임파선염, 여성의 대하를 치료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고 귀신들린 것을 치료하고 수명을 늘린다.<別錄(별록)>: 관절과 營衛(영위)에 침범한 熱(열)을 제거하고 虛熱(허열)이 간헐적으로 왕래하는 것을 치료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번잡하며 心痛(심통)이 있으며 氣(기)가 울결되는 증상을 치료한다. 땀을 그치게 하고 갈증을 그치게 하며 瘀血(어혈)을 제거하고 精液(정액)이 세는 것을 그치게 한다. 大腸(대장)과 小腸(소장)의 연동운동을 조절하여 大小便(대소변)을 자주 보는 것을 치료하며 인후가 붓고 호흡이 곤란하며 咳嗽(해수)하는 증상을 치료하고 명치 밑이 결리고 열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陳藏器(진장기): 가루를 몸에 바르면 어른과 어린이의 盜汗(도한)을 치료한다. 麻黃根(마황근), 蛇牀子(사상자), 乾薑(건강)을 같은 량으로 가루내어 사용하면 陰部(음부)에 땀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甄權(견권): 여성의 崩漏(붕루)를 치료하고 통증을 멎게 하며 風熱(풍열)의 邪氣(사기)를 제거하고 溫病(온병)과 瘧疾(학질)을 치료하며 夢精(몽정)을 치료한다.李珣(이순): 남성의 과로로 인한 쇠약을 치료하며 腎(신)을 돕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열나는 증상을 없앤다. 소아의 경련성 질환을 치료한다.王好古(왕호고): 늑골 아래가 단단하고 그득한 증상을 없애며 임파선염과 모든 부스럼을 치료한다.李時珍(이시진): 痰(담)을 없애고 단단하게 뭉친 것을 풀어준다. 熱(열)을 내리고 濕(습)을 없애고 心(심)과 脾(비)의 氣(기)로 인한 통증을 그치게 하고 痢疾(이질)을 치료하며 남녀의 생식기에서 백색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을 치료하고 하복부의 심한 통증과 적취를 제거하고 임파선염을 치료한다.약물이름의 기원이명으로는 牡蛤(모합), 蠣蛤(려합), 古墳(고분), 蠔(호)가 있다.陶弘景(도홍경): 道家(도가)에서는 왼쪽으로 돌아보는 것을 수컷이라고 하였으므로 牡蠣(모려)라고 하였고, 오른 쪽으로 돌아보는 것을 牝蠣(빈려)라고 하였다. 혹은 尖頭(첨두)가 왼쪽으로 돌아간 것을 뜻한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자세하지 않다.陳藏器(진장기): 天(천)이 만물을 낳음에 모두 암컷과 수컷이 있다. 蠣(려)도 짠물에서 몸집을 키우는 것으로 흙덩이도 역시 변함없이 陰陽(음양)의 이치를 따르니 어찌 陰陽(음양)의 道(도)를 따르지 않겠는가? <本經(본경)>에서 牡(모)라고 한 것은 마땅히 수컷을 뜻하는 것이다.寇宗奭(구종석): <本經(본경)>에서는 왼쪽으로 돌아본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단지 도홍경의 말일 뿐이다. 段成式(단성식)도 牡蠣(모려)에서 牡(모)라는 것은 수컷을 뜻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牡丹(모단)을 예를 보더라도 어찌 牝丹(빈단)이라는 것이 존재하겠는가? 그리고 이 약재는 눈이 없는데 어찌 돌아볼 수 있다는 말인가?李時珍(이시진): 조개류는 모두 胎生(태생)과 卵生(난생)인데, 오직 이것 만 化生(화생, 역자주: 암수의 성질이 변하여 생식한다는 의미)하여 오로지 수컷만 있고 암컷이 없기 때문에 牡(모)라는 명칭이 생겼다. 蠣(려)나 蠔(호)라는 명칭은 그 생김새가 거칠고 크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 참조: 중국에서는 3가지 종류의 굴을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근강모려[近江牡蠣: Ostrea rivularis Gould.]조가비는 2개로서 단단하고 두꺼우며 원형이나 계란형, 삼각형 등이다. 좌각 즉 하각은 부착되어 있고 비교적 크고 두껍다. 우각 즉 상각은 약간 편평하고 좌각보다 작으며 표면에 아주 얇고 곧은 황갈색 또는 자갈색의 비늘 조각이 고리 모양으로 붙어 있다. 1~2년이 된 것은 비늘 조각이 편평하고 얇고 연하며 유리된 모양으로 되어 있다. 2년 내지 몇 년 된 것은 비늘 조각이 평탄하고 어떤 것은 뒷부분의 가장자리에 매우 작은 물결 모양의 기복이 있다. 오래 자란 것은 비늘조각층이 몇 겹으로 겹쳐져 있어 돌처럼 단단하고 두껍다. 각면(殼面)의 색깔은 회색, 청색, 자주색, 갈색 등이고 내면은 흰색이며 가장자리는 회자색이다. 인대는 자흑색이며 폐각근의 흔적은 매우 크고 담황색이며 대다수가 달걀 모양 또는 신장형으로 중앙부의 뒤쪽에 있다. 발은 퇴화되어 족사(足絲)가 없다. 강어귀에서 서식한다. 잡식성으로서 매우 작은 플랑크톤을 먹는다. 중국의 연해에 분포되어 있다. 중국의 광동(廣東), 복건(福建), 산동(山東)의 연해에서는 양식하기도 한다. 장모려에 대해서 <중국본초도록> 제 5권 220면 2444호 [근강모려(近江牡蠣, 모려:牡蠣) 기원: 모려과(牡蠣科: Ostreidae)동물인 근강모려(近江牡蠣: Ostrea (Crassostrea) rivularis Gould ) 의 건조 패각(貝殼)이다. 형태: 패각(貝殼)은 대형이고 형상은 변화가 다양하여 원형(圓形), 장형(長形), 삼각형(三角形) 등이 있으며 각질(殼質)은 딱딱하고 두꺼우며, 우각(右殼)은 약간 평평하고 좌각(左殼)보다 크기가 작으며 인편(鱗片)이 얇고 평직하고 층차(層次)가 적고, 좌각(左殼)은 동심인편(同心鱗片)의 층차(層次)가 더욱 적다. 교합부(鉸合部)는 좁고, 인대(靭帶)는 길고 넓으며 소뿔 모양이다. 패각(貝殼)의 표면은 회색(灰色), 청색(靑色), 자색(紫色) 등이 보이고 내면은 백색(白色)이다. 분포: 저조선(低潮線)에서 수심 7m까지의 얕은 바다에서 서식한다. 중국의 각 해역에 고루 분포. 채취 및 제법: 연중 채취할 수 있으며 육질부분을 제거한 패각(貝殼)을 햇볕에 말려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불에 구워서 사용하다. 성분: 인산칼슘, 황산칼슘, 산화알루미늄. 기미: 맛은 짜고, 성질은 약간차다. 효능: 자음잠양(滋陰潛陽), 진경안신(鎭驚安神), 연견화담(軟堅化痰), 수렴고삽(收斂固澁). 주치: 허로번열(虛勞煩熱), 유정(遺精), 도한(盜汗), 붕루대하(崩漏帶下), 임파선결핵(淋巴腺結核). 용량: 15-50g. 참고문헌: 중국약용동물지(中國藥用動物誌), 1권, 27면.] 2, 장모려[長牡蠣: Ostrea gigas Thunb.]조가비는 대형으로 단단하며 두껍고 긴 가지 모양이다. 배부와 복부는 대체로 평행을 이루고 일반적으로 조가비의 길이는 높이의 3배이다. 좌각은 붙어 있다. 우각은 편평하고 비늘 조각은 고리 모양으로 나며 물결 모양으로 성글게 배열되었는데 각층수는 아주 적다. 각면은 연한 자색, 회백색 또는 황갈색을 띤다. 각의 내면은 유백색을 띤다. 폐각근의 흔적은 말굽 모양의 다갈색이며 각의 후부에 있다. 좌각은 함몰되어 있고 비늘 조각은 우각보다 크다. 육질부는 연하고 아가미가 직선형으로 배후의 각에 까지 이른다. 중국의 연해에 분포되어 있다. 강어귀나 바닷가의 후미진 곳에서 양식하기 적합한 품종이다. 장모려에 대해서 <중국본초도록> 제 5권 220면 2443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알려주고 있다. [장모려(長牡蠣, 모려:牡蠣) 기원: 모려과(牡蠣科: Ostredae)동물인 장모려(長牡蠣: Ostrea (Crassostrea) gigas Thunberg)의 건조 패각(貝殼)이다. 형태: 패각(貝殼)은 대형이고 기다란 선형(線形)이며 일반적으로 길이가 높이의 3배가 된다. 배부(背部)와 복부(腹部)는 거의 평행하고, 우각(右角)은 평평하고 인편(鱗片)이 딱딱하고 두꺼우며 층차(層次)가 적고, 표면은 담자색(淡紫色)이거나 회백색(灰白色)이며 내면은 백색(白色)이고 자기질과 비슷하고, 좌각(左殼)은 깊게 함몰되어 있고 인편(鱗片)이 굵고 크며 내면이 백색(白色)이다. 인대(靭帶)가 붙는 홈은 길고 나비가 크다. 분포: 저조선(低潮線)이하 수심이 수십미터에 이르는 지역까지의 암석에서 고착 생활을 한다. 중국의 각 해역에 고루 분포. 채취 및 제법: 연중 채취할 수 있으며 육질부분을 제거한 패각(貝殼)을 햇볕에 말려서 그대로 쓰거나 불에 구워서 쓴다. 성분: 인산칼슘, 황산칼슘, 산화알루미늄. 기미: 맛은 짜고 성질은 약간 차다. 효능: 자음잠양(滋陰潛陽), 진경안신(鎭驚安神), 연견화담(軟堅化痰), 수렴고삽(收斂固澁). 주치: 허로번열(虛勞煩熱), 유정(遺精), 도한(盜汗), 붕루대하(崩漏帶下), 임파선결핵(淋巴腺結核). 용량: 15-50g. 참고문헌: 중국약용동물지(中國藥用動物誌), 1권, 28면.] 3, 대련만모려[大連灣牡蠣: Ostrea talienwhanensis Crosse.]조가비는 대형이고 두게가 중간 정도이며 양쪽 모두 길게 뻗어 있고 각정(殼頂)에 후부로 가면서 넓어져 삼각형 비슷하게 되어 있다. 좌각은 붙어 있다. 우각 표면의 비늘 조각은 물결 모양이지만 근강모려(近江牡蠣)만큰 평탄하지 않다. 방사륵(放射勒)은 뚜렷하지 않다. 각면은 담황색이고 각의 내면은 흰색이다. 폐각근의 흔적은 흰색이거나 자주색이고 뒤쪽에 위치하여 있다. 육질부는 긴 네모 모양이고 아가미가 앞쪽부터 등쪽의 중앙 부분까지 이어져 있으며 만족된 정도는 작다. 중국의 북방 연해에 분포되어 있다. 대련만모려에 대해서 <중국본초도록> 제 6권 208면 2963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알려주고 있다. [대련만모려(大連灣牡蠣, 모려:牡蠣) 기원: 모려과(牡蠣科=굴과: Ostreidae)동물인 대련모려(大連牡蠣: Ostrea talienwhanensis Cross) 의 건조된 패각(貝殼)이다. 형태: 패각(貝殼)은 대형이고 대략 삼각형(三角形)을 나타낸다. 우각(右殼)은 평탄하고 각정(殼頂)의 인편(鱗片)은 유합 하는 경향이 있다. 각표면(殼表面)은 담황색(淡黃色)이고 뚜렷한 방사륵(放射肋)은 없다. 각내면(殼內面)은 회백색(灰白色) 이고 광택이 있다. 좌각(左殼)은 심하게 볼록하고 방사륵(放射肋)은 굵고 단단하며 인편(鱗片)은 단단 하고 두껍다. 각표면(殼表面)의 색(色)은 옅고 황백색(黃白色)이다. 내면(內面)은 백색(白色)이다. 인대조(靭帶槽)는 길고 깊으며 삼각형(三角形)이다. 분포: 염도(鹽度)가 편고(偏高)한 해안 가까이의 수중에서 생활한다. 중국의 황해(黃海)와 발해(渤海)에 분포한다. 채취 및 제법: 연중 채취가 가능하며 잡아서 육(肉)을 제거하고 패각(貝殼)을 햇볕에 말려 생용(生用)하거나 혹은 불에 구워 쓴다. 성분: 각(殼): 인산칼슘, 황산칼슘, 산화알루미늄. 기미: 맛은 짜고 성질은 약간 차다. 효능: 자음잠양(滋陰潛陽), 진경안신(鎭驚安神), 연견화담(軟堅化痰), 수렴고삽(收斂固澁). 주치: 허로번열(虛勞煩熱), 유정(遺精), 자한(自汗), 붕루대하(崩漏帶下), 임파선결핵(淋巴腺結核). 용량: 15-50g. 참고문헌: 중국약용동물지(中國藥用動物誌), 1권, 28면.] 우리나라에서는 9가지 종류의 굴이 살고 있는데 <원색 한국패류도감> 354-357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1, 토굴[Ostrea denselamellosa Lischke]tnfla 10m 근방의 돌이나 바위에 붙어사는 대형종이다. 둥근 모양이다. 굴은 왼쪽 껍질이 대상물에 붙고 오른쪽 껍질이 위에 온다. 오른쪽 껍질의 각피는 소나무껍질 모양을 하는데 각정부는 윤맥(성장륵)이 보이고 둘레에는 방사륵이 있으며 방사륵 위에는 얇은 돌기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마르면 각피가 쉽게 떨어져 나간다. 각피가 모두 탈피하고 나면 성장맥만 뚜렷하게 남는다. 왼쪽 껍질은 오른쪽 껍질보다 움푹 들어 갔으며 역시 소나무 껍질 모양의 각피를 가지며 방사륵이 우각보다 뚜렷하다. 왼쪽의 앞뒤에는 귀 모양의 돌기가 나고 둘레에는 몇 개의 돌기가 있다. 껍질은 매우 두껍고 안쪽은 순백색이고, 안쪽 껍질속에는 물을 품고 있다. 껍질이 마르면 안쪽의 진주층이 쉽게 떨어지는 것은 물이 말라 버렸기 때문이다. 종명의 'denselamellosa'는 빽빽한 층상구조라는 뜻으로 성장맥이 난 모양에서 따왔다. 각고, 각장 모두 8~16cm.일본, 우리나라의 남해안에 분포한다. 2, 태생굴[Ostrea circumpicta Pilsbry]조간대의 바위에 붙어 산다. 원판형에 가깝고 부착장소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오른쪽 껍질은 편평하고 각피는 소나무 껍질 같다. 껍질 안의 색은 어두운 자갈색이다. 인대의 양쪽에 주름이 있다. 각고, 3cm, 각장 7cm.일본, 우리나라의 남해안에 분포한다. 3, 가시굴[Saccostrea echinata(Quoy et Gaimard)]조간대의 간조선 부근의 바위 위에 떼를 지어 붙어 있다. 껍질의 모양은 부착면에 따라 다르나 둥그스름하거나 사각형에 가깝다. 흑자색의 작은 관 모양의 돌기가 무수히 많이 붙어 있다. 소형으로 상업적 가치는 없으나 식용한다. 도화, 떡굴, 갓굴, 벗굴, 개굴, 토굴, 피굴, 꿀, 석화, 애굴 등의 지방명이 있다. 패총의 대부분이 굴 껍질인 것으로 보아 옛부터 중요한 식량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종명의 'echinata'는 '가시'라는 뜻이다. 각고, 각장 모두 3cm일본, 우리나라의 남해안에 분포한다. 4, 참굴[Crassostrea gigas(Thunberg)]담수의 영향을 받는 하구쪽이나 만조선 근방의 바위에 붙어 산다. 양식하는 굴은 모두 이 종이다. 왼쪽, 오른쪽 껍질 모두가 성장맥이 잎모양으로, 여러겹으로 되어 있다. 껍질은 비늘 모양으로 거칠다. 왼쪽 껍질은 흰색이나 오른쪽 껍질에는 방사륵이나 황색 때가 있기도 한다. 환경에 따라 껍질의 형태, 색, 껍질의 두께 등이 모두 다르다. 식용한다. 각고 5cm, 각장 10cm.일본, 아시아의 모든 나라, 우리나라의 전역에 분포한다. 5, 긴굴(신칭)[Crassostrea gigas elongata (Thunberg)]수심 10m 근방의 진흙 바닥에 산다. 크게는 참굴로 묶지만 참굴보다는 가늘고 길며 서식처가 진흙 바닥이라는 서식 환경의 차이도 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많이 분포한다. 각고, 6cm, 각장 9cm.일본,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분포한다. 6, 갓굴[Crassostrea ariakensis (Wakiya)]가까운 바다의 진흙에 산다. 참굴(C. gigas)과 비슷하나 편평하고 둥글며 성장액이 판 모양을 하며 겹쳐난다. 인대 양쪽에 주름이 없으며 방사륵도 없다. 담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은 곳에 산다. 각고, 7cm, 각장 9cm.일본,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분포한다. 7, 일본굴[Crassostrea nipponica (Seki)]조간대 아래에 암초지대의 바위에 왼쪽 껍질의 각정부가 달라 붙는다. 크고 껍질이 두꺼우며 긴 타원형이다. 오른쪽 껍질은 얇은 편이며 표면이 소나무 껍질 모양을 한다. 안쪽은 희다. 근육은 보라색을 띤다. 인대 양측에 주름이 없다. 'Crassostrea belcheri'는 이명이다. 각고, 4cm, 각장 10cm.일본,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분포한다. 8, 주름꼬마굴[Neopycnodonta musashiana (Yokoyama)]수심 50~300m 깊이의 큰 돌에 붙으며 딱딱한 나무에도 붙는다. 우각은 작고 편편하고 좌각에 묻혀 뚜껑 같다. 좌각은 다른 물체에 붙으며 크고 오목하다. 왼쪽 껍질은 둘레 끝이 얇고 주름모양을 한다. 안쪽은 모두 흰색이다. 껍질은 매우 가볍다. 각고, 1.5cm, 각장 1.5cm.일본, 우리나라의 남서해안에 분포한다. 9, 옆주름덩굴굴(신칭)[Dendostrea crenifera Soweirby] 조간대의 바위에 붙어 산다. 삼각형에 가깝고 납작하다. 두 껍질은 옆에서 보면 주름모양(파도모양)을 하면서 겹쳐져 있다. 각정부의 아래 양쪽에 톱니 모양의 돌기가 4~5개 있다 껍질 안쪽은 부분적으로 검은 보라색을 띤다. 각고, 3.5cm, 각경 4cm.일본 남부, 우리나라의 남서해안에 분포한다. 굴의 여러 가지 이름은 모려[牡蠣=mǔ lì=무V리↘, 여합:蠣蛤: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고분[古賁: 이물지(異物誌)], 좌고모려[左顧牡蠣: 보결주후방(補缺肘後方)], 모합[牡蛤: 명의별록(名醫別綠)], 여방[蠣房, 호보:蠔莆: 본초도경(本草圖經)], 호각[蠔殼: 절강중약수책(浙江中藥手冊)], 해려자각[海蠣子殼, 해려자피:海蠣子皮: 산동중약(山東中藥)], 좌각[左殼: 중약지(中藥誌)], 근강모려[近江牡蠣, 장모려:長牡蠣, 대련만모려:大連灣牡蠣: 중약대사전(中藥大辭典)], 여산[礪山, 여방:蠣房, 호보:蠔莆, 오봉호:五峯蠔: 소송(蘇頌)], 잔굴[소려:小蠣, 홍굴, 홍려:紅蠣, 석화:石華, 금통굴, 통려:桶蠣, 보살굴, 오봉호:五峯蠔, 홍밀주알, 석항호:石肛蠔, 석사:石蛇: 자산어보(玆山魚譜), 정문기 옮김], Crassostrea[Ostrea: 학명(學名)], Oyster shell[영명(英名)], 석화(石花), 굴조개, 태생굴, 가시굴, 참굴, 긴굴, 갓굴, 일본굴, 주름꼬마굴, 옆주름덩굴굴, 도화, 떡굴, 갓굴, 벗굴, 개굴, 토굴, 피굴, 꿀, 애굴, 굴 등으로 부른다. 음액(陰液)을 수렴하고 양(陽)을 키우며 땀을 멈추게 하고 정(精)을 수렴하며 담(痰)을 제거하고 단단한 덩어리를 부드럽게 한다. 경간, 현기증, 자한, 도한, 유정, 배뇨가 곤란하면서 소변 색이 뿌연 증상, 붕루, 대하, 나력, 영류(癭瘤) 등을 치료한다. 1, <신농본초경>: "상한한열(傷寒寒熱), 온학(溫瘧), 경에노기(驚恚怒氣)를 치료한다. 근경련과 서루(鼠瘻)를 치료하고 여자의 적백 대하를 제거하며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골절을 강하게 한다." 2, <명의별록>: "관절 혈행(血行)에 열이 머무르는 것을 제거하고 자주 발생하는 허열 , 번만(煩滿)을 제거하며 땀을 멎게 하고 심통기결(心痛氣結)을 치료하며 갈증을 멎게 하고 노혈(老血)을 제거하며 대소장을 수렴해서 설사를 멎게 한다. 유정, 후비(喉痹), 기침, 심협하비열(心脇下痞熱)을 치료한다." 3, <약성론>: "주로 여자의 붕중(붕중)을 치료한다. 도한을 멎게 하고 풍열을 제거하며 통증을 멎게 하고 온학(溫瘧)을 치료한다. 또 두충(杜仲)과 함께 복용하면 도한을 멎게 한다. 허(虛)하며 열이 많은 환자에게는 지황(地黃), 소초(小草)를 함께 쓴다." 4, <본초강목습유>: "짓짛어서 가루내어 몸에 바르면 어른, 소아가 잘 때에 흘리는 땀을 치료한다. 마황근(麻黃根), 사상자(蛇床子), 건강(乾薑) 등을 함께 가루내어 쓰면 음한(陰汗)을 제거한다." 5, <해약본초>: "주로 남자의 유정과 허로 결손 등을 치료한다. 신(腎)을 보하고 기(氣)를 바르게 하며 도한을 멎게 하고 번열을 제거하며 상한에 의한 열담(熱痰)을 치료한다. 양(陽)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소아의 경간을 치료한다." 6, <진주낭>: "비적(痞積)을 연하게 하고 또한 대하, 온학(溫瘧), 창종을 치료한다. 단단한 덩어리를 연하게 하고 수렴한다." 7, <본초강목>: "담을 삭이고 단단한 덩어리를 연하게 하며 열사(熱邪)와 습사(濕邪)를 제거하고 심비기통(心脾氣痛), 설사, 적백탁(赤白濁)을 멎게 한다. 산가적괴(疝瘕積塊), 영질(癭疾), 결핵을 치료한다." 8, <의학충중참서록(醫學衷中參西錄)>: "딸꾹질을 멎게 한다." 9, <현대실용중약>: "각종 제산제(制酸劑)로 쓰이는데 위기(胃氣)를 고르게 하고 진통하는 작용을 한다. 위산 과다, 신체 허약, 도한 및 동계, 육윤(肉瞤)등을 치료한다. 임신부 및 소아의 칼슘 부족과 폐결핵 등에도 효곽 있다." <살> 음(陰)을 자양하고 혈액을 자양하는 효능이 있다. 번열로 인한 불면증, 심신 불안, 단독(丹毒)을 치료한다. 1, <최우석, 식경>: "불면증, 정신이 불안정한 증세를 치료한다."2, <본초습유>: "삶아서 복용하면 주로 허로(虛勞), 여자의 혈기부족을 치료하고 중초를 조화시키며 단독(丹毒)을 해독한다. 강초(薑酢)를 넣어 생것으로 먹으면 단독(丹毒), 음주 후의 번열을 주치하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3, <의림찬요>: "폐열(肺熱)을 없애고 심장을 강화하며 음(陰)을 자양하고 혈액을 자양한다." [용법과 용량] 내복: 0.3~1냥을 물로 달여서 복용하거나 환을 만들어 먹거나 가루내어 먹는다.외용: 가루내어 뿌리거나 개어서 바르거나 가제에 묻혀 두드리며 바른다. [배합과 금기(주의사항)] <껍질> 1, <신농본초경집주>: "패모(貝母)를 사용한다. 감초(甘草), 우슬(牛膝), 원지(遠志), 사상(蛇床) 등을 배합하면 좋다. 마황(麻黃), 수유(茱萸), 신이(辛夷)와 함께 쓰면 안 된다."2, <신농본초경소>: "허(虛)하여 열이 많은 환자는 써도 좋지만, 허(虛)하고 몸이 냉한 환자는 쓰면 안 된다. 신허무화(腎虛無火), 정한(精寒)하여 유정(遺精)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살> 1, <칠권식경(七券食經)>: "나창(癩瘡)이 있는 사람은 복용하면 안된다."2, <본초구원(本草求原)>: "비허(脾虛)로 인한 유정이 있는 사람은 복용해서는 안된다." 굴에 대해서 허준의 <동의보감> [모려(牡蠣) 성질이 평(平)하고(약간 차다[微寒]고도 한다) 맛이 짜며 독이 없다. 대소장을 조여들게 하고 대소변이 지나치게 나가는 것과 식은땀[盜汗]을 멎게 하며 유정, 몽설, 적백대하를 치료하며 온학을 낫게 한다. ○ 굴조개껍질은 굳은 것을 물러지게 하고 수렴작용하는 약제인데 약 기운은 족소음경(足少陰經)으로 들어간다[총록]. ○ 동해에 있는데 아무 때나 잡는다. 음력 2월에 잡은 것이 좋다. 배쪽의 껍질을 남쪽으로 향하게 들고 보았을 때 주둥이가 동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좌고모려(左顧牡蠣)라고 한다. 혹 대가리가 뾰족한 것을 좌고모려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약으로 쓴다. 대체로 큰 것이 좋다. 먼저 소금물에 2시간 정도 끓인 다음 불에 구워 가루내어 쓴다[총록]. ○ 모려(牡蠣, 굴조개) 술을 마신 뒤에 번열(煩熱)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굴조개살에 생강과 식초를 넣어 날것으로 먹는다[본초]. ○ 모려육(牡蠣肉, 굴조개살)주갈(酒渴)을 치료하는데 생것으로 생강과 식초를 넣어서 먹는다. 민간에서는 굴을 석화라고 한다[본초]. ○ 모려(牡蠣, 굴조개껍질) 신을 보한다. 구워서 가루내어 알약에 넣어 쓴다. 굴조개살을 삶아 먹어도 좋다[본초].] 조선 순조 15년 1814년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16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어류, 해조류, 패류, 게 및 새우류, 복족류 및 기타 수산동물들의 방언과 형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자산어보(玆山魚譜)>이다. 자산은 흑산도를 말하는데, 9종류의 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굴(호=蠔) 1, 굴(모려=牡蠣)큰 놈은 지름이 한 자 남짓되고 두쪽을 합하면 조개와 같이 된다. 몸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품이 구름조각 같으며 껍질은 매우 두꺼워 종이를 겹겹이 발라 놓은 것 같다. 바깥 쪽은 거칠고 안쪽은 미끄러우며 그 빛깔이 눈처럼 희다. 껍질 한쪽은 돌에 붙어 있고, 다른 한쪽의 껍질은 위를 덮고 있으나 진흙탕 속에 있는 놈은 부착하지 않고 진흙탕 속에서 떠돌아 다닌다. 맛은 달콤하다. 그 껍질을 닦아 가지고 바둑알을 만든다. <본초(本草)>에는 모려(牡蠣)를 일명 여합(蠣蛤), <별록(別錄)>에는 모합(牡蛤)이라 이름했으며, <이물지(異物志)>에는 고분(古賁)이라고 칭하였다. 모두 이 굴을 말한 것이다. 2, 잔굴(소려=小蠣)지름이 6~7치 정도이고, 모양은 굴과 비슷하나 껍질이 엷으며 위쪽 껍질의 등에는 거친 가시가 줄지어 있다. 굴은 큰 바다의 물이 급한 곳에 서식하나 이 잔굴은 포구의 파도에 마멸되어 미끄러워진 돌에 서식하는 것이 다르다. 3, 홍굴(홍려=紅蠣)큰 놈은 3~4치 정도이고 껍질이 엷다. 색은 붉다. 4, 석화(石華)크기는 불과 한 치 정도이고, 껍질이 튀언와 있으며 엷고 색이 검다. 그 안쪽은 미끄럽고 희다. 암석에 붙어 있어 꼬챙이로 채취한다. <곽박(郭璞)>의 <강부(江賦)>에는 토육(土肉)과 석화(石華)가 나오는데, <이선(李善)>의 주(注)에는, <임해수토물지(臨海水土物志)>를 인용하여, 석화는 돌에 붙어서 산다고 했으니, 곧 이를 말한 것이다. 또 한보승(韓保昇)은 말하기를 부려(蜉蠣)는 몸통이 짧고 약에 넣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역시 석화를 가리킨 것으로 짐작된다. 5, 굴통굴(통호=桶蠔)큰 것은 껍질의 지름이 한 치쯤 되며 입이 둥글고 통과 같이 생겼다. 뼈처럼 단단하고 높이는 수 치 정도, 두께는 서너 푼 정도이다. 아래는 밑이 없고 위는 약간 깎여진데다 꼭대기에 구멍이 있는데 그 끝의 작은 구멍을 보면 간신히 바늘이 들어갈 정도이고 벌집과 같이 뿌리가 돌벽에 붙어 있다. 그 속에는 덜된 두부 같은 고깃살이 붙어 있고, 위에는 중들이 쓰는 고깔 같은 것이 실려 있다(방언=方言: 곡갈=曲葛). 두 개의 판(辦)이 있는데, 조수가 밀려오면 즉시 이 판이 열려 조수를 받아 들인다. 이 굴통굴을 따는 사람은 쇠송곳으로 급히 내리친다. 그러면 껍제기가 떨어지고 고깃살이 남는다. 그 고깃살을 칼로 떼어낸다. 만약 내려치기 전에 굴통굴이 먼저 알게 되면 차라리 부서질지언정 떨어지지 않는다. 6, 보살굴(오봉호=五峰蠔)큰 놈은 너비가 세 치 정도이고 오봉(五峰)이 나란히 서 있다. 바깥쪽 두 봉은 낮고 작으나 다음의 두 봉은 안고 있으며, 그 안겨져 있는 두 봉은 가장 큰 봉으로서 중봉(中峰)을 안고 있다. 중봉 및 최소봉(最小峯)이 서로 합하여 단단한 껍질이 된다. 그 빛깔은 황흑색이다. 봉근(峯根)의 둘레엔 껍질이 싸고 있는데, 이 껍질은 유자와 같으며 습기가 있다. 뿌리를 돌 틈의 좁은 곳에 박고서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 몸을 지탱한다. 속에는 살이 있는데, 살에도 붉은 뿌리와 검은 수염이 있다(수염은 물고기의 귀세미 같다). 조수가 밀려오면 큰 봉우리를 열어 수염으로 조수를 맞는다. 맛은 달콤하다. <소송(蘇頌)>이 말하기를 굴은 모두 돌에 붙어 돌무덤을 이루고 있으며, 서로 이어짐이 방(房)과 같아서, 이를 불러 여방(蠣房)이라고 한다. 진안(晉安) 사람은 이를 호보(蠔莆)라고 한다. 맨 처음에는 주먹만하다가 점차 사방으로 자라나 1~2자 정도로 되며 준엄하기가 바위산과 같아서 속담에 이를 여산(礪山)이라고 한다. 각 방마다 안에는 고깃살이 한 덩이씩 있다. 큰 방(房)은 말발굽 같고, 작은 방은 사람 손가락만하다. 조수가 밀려올 때마다 여러 방들이 모두 열려 작은 벌레가 들어오면 입구를 막아 배를 채운다. 이를 일러 오봉호(五峯蠔)라 하는데 곧 여산(礪山)이 이것이다. 7, 홍밀주알(석항호=石肛蠔)모양은 오랫동안 이질을 앓은 사람이 탈항(脫肛)한 것 같고, 빛깔은 검푸르다. 조수가 미치는 곳의 돌 틈에서 서식한다. 모양은 타원형이나 돌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르다. 다른 물체가 침범하면 오그라들어 작아진다. 복장(腹腸)은 오이 속과 같은데, 육지 사람들은 이것으로 국을 끓인다. 8, 석사(石蛇)그 크기나 서려 엉클어진 모습이 작은 뱀처럼 생겼으며, 몸은 굴껍질 같은데 속이 텅빈 것이 대와 같다. 몸에는 콧물 같기도 하고 가래침 같은 같은 것이 있으며, 빛깔은 연붉다. 깊은 물속의 돌틈에 부착한다. 용도는 아직 모른다. 굴의 효능에 대해서 북한에서 펴낸 <건강의 길동무> 168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참굴 참굴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B1, B2, B6, B12, E, PP), 칼슘, 인, 마그네슘, 칼륨, 철, 동, 요오드 등이 들어 있고 조가비에는 탄산칼륨이 많고 인산칼슘, 규산염 등이 있다. 굴은 음혈을 보하고 경련을 멈추며 조가비는 음을 보하고 담을 삭이며 굳은 것을 유연하게 하고 유정을 낫게 하며 설사와 땀을 멈추며 헌데를 아물게 한다. 위산중화작용과 피멎이작용을 나타낸다. ① 과산성위염에는 굴조가비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불에 달구어 가루내어 한번에 3~4g씩 하루 3번 더운물에 타서 끼니뒤에 먹는다. ② 식은땀이 나는데는 굴조가비 20g을 물에 달여 하루 2번에 나누어 끼니 뒤에 먹는다.] 참굴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1, 현기증모려(牡蠣) 6돈, 용골(龍骨) 5돈, 국화(菊花) 3돈, 구기자(枸杞子) 4돈, 하수오(何首烏: 적하수오) 4돈을 달여서 복용한다. [산동중초약수책(山東中草藥手冊)] 2, 백탁(白濁), 구갈이 멎지 않을 때괄루근(栝蔞根), 삶아 졸인 모려(牡蠣)를 같은 양으로 취하여 곱게 가루낸 후 방촌비(方寸匕)로 1일 3회 복용한다. [금궤요략(金匱要略), 괄루모려산(栝蔞牡蠣散)] 3, 모든 갈증큰 모려(牡蠣)를 양에 관계없이 황토로 싸서 센불에 태워 식힌 다음 가루내어 산 붕어를 달인 물로 1돈씩 복용한다. 소아는 반 돈을 복용한다. [경험방(經驗方)] 4, 빈뇨증태워서 재로 만든 모려(牡蠣) 5냥, 동변(童便) 3되를 2되가 되게 달여 3회로 나누어 복용한다. [건곤생의(乾坤生意)] 5, 약을 써도 소변 임비(淋閟)가 낫지 않을 때모려(牡蠣), 볶은 황백(黃柏)을 같은 양 가루낸 후 1회에 1돈씩 소회향탕(小茴香湯)으로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전자(傳滋), 의학집성(醫學集成)] 6, 붕중루하(崩中漏下), 적백대하가 멎지 않는 사람, 기(氣)가 허갈한 사람모려(牡蠣), 별갑(鼈甲)을 각각 3냥씩 체로 쳐서 술로 1방촌비(方寸匕)씩 1일 3회 복용한다. [천금방(千金方)] 7, 허(虛)하거나 부족해서 새로운 병이 생겨 갑자기 허약해진 증세, 진액이 고(固)하지 못한 증세, 항상 자한이 있고 수면 시에 특히 심하며 오랫동안 낫지 않는 증세, 여위는 증세 및 동계(動悸)와 단기번권(短氣煩倦)의 치료씻은 마황근(麻黃根), 황기(黃芪)를 쌀뜨물에 담그어 벌겋게 태운 모려(牡蠣) 각각 1냥을 함께 기칠게 가루내어 1회에 3돈을 물 한 컵 반, 밀 100여 알과 함께 8할이 되게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뜨거운 것을 1일 2회 수시로 복용한다. [국방(局方)] 8, 취침하면 도한이 나는 증상과 풍허(風虛)로 인한 두통모려(牡蠣), 白朮(백출), 방풍(防風)을 각각 3냥씩 가루내어 체로 쳐서 술로 1방촌비(方寸匕)씩 1일 2회 복용한다. [천금방(千金方), 모려산(牡蠣散)] 9, 도한(盜汗) 및 음한(陰汗)모려(牡蠣)를 곱게 가루내어 땀을 흘리는 곳에 두드려 바른다. [경험방(經驗方)] 10, 온병(溫病)이 다 나은 다음에 심한 설사에 걸려 그 횟수가 12시간에 3~4회씩 계속되는 증세와 맥이 빠른 증세의 치료생모려(生牡蠣) 2냥을 곱게 가루낸 후 물 8컵으로 3컵이 되게 달여서 3회로 나누어 따뜻할 때 복용한다. [온병조변(溫病條辨), 일갑전(一甲煎)] 11, 여러 가지 나력의 치료① 센불에서 태운 모려(牡蠣) 4냥, 현삼(玄蔘) 3냥을 체로 쳐 가루낸 후 밀가루로 벽오동씨 크기로 환을 짓는다. 이것을 아침 저녁 식사 후, 취침 시에 각각 30알씩 술로 복용한다. [경험방(經驗方)] ② 모려분(牡蠣粉) 5돈을 계담(鷄膽)의 즙과 혼합하여 연고를 만들어서 바른다. [맥인증치(脈因證治)] 12, 위산 과다모려(牡蠣), 해표(海螵)를 각각 5돈, 절패모(浙貝母) 4돈을 함께 곱게 가루내어 1회 3돈을 1일 3회 복용한다. [산동중초약수책(山東中草藥手冊)] 13, 큰 병이 거의 치료된 후 조금만 과로하여도 코피가 나는 경우좌모려(左牡蠣) 10푼, 석고(石膏) 5푼을 짓찧어서 가루내어 술로 방촌비(方寸匕)를 1일 3~4회 복용한다. 또 꿀로 벽도동씨 크기의 환을 지어서 복용한다. [보결주후방(補缺肘後方)] 14, 칼 종류의 베인 상처모려(牡蠣) 분말을 바른다. [주후방(肘後方)] 15, 폐결핵으로 인한 도한(盜汗)의 치료(임상보고)모려(牡蠣) 5돈에 물 500ml를 넣고 200ml가 되게 달인 것을 1일량으로 하여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며칠 복용한다. 여기에 당분(糖分)을 넣어서 마셔도 좋다. 계속해서 며칠 복용한다. 땀이 멎은 다음에도 2~3일 복용하여 치료 효과를 지속시킨다. 몇 첩 복용해도 치료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변증 치료의 원칙에 따라 증상을 보아 가감한다. 전체 치료 10례에서 일반적으로 2~3첩을 복용하면 땀이 멎었다. 3례는 초기 치료 효과가 현저하지 않았고 그중 2례는 용골(龍骨), 산조인(酸棗仁)을 가해서 몇 첩을 복용한 결과 효과가 비교적 좋았다.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중약대사전] [각가(各家)의 논술(論述)] 1, <장원소(張元素)>: "모려(牡蠣)는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껍질이 햇볕을 차단하기 때문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는 증상이 없어지게 된다. 때문에 모려류(牡蠣類)는 갈증을 가시게 하는 효능이 있다." 2, <탕액본초(湯液本草)>: "모려(牡蠣)는 족소음(足少陰) 즉 신경(腎經)에 들어간다. 짠 것은 단단한 덩어리를 연하게 하는 약이며 시호(柴胡)와 함께 사용하면 겨드랑이의 경결(硬結)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차를 인경약으로 함께 사용하여 결핵을 치료한다. 대황(大黃)을 인경약으로 사용하면 고간(股間)의 부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지황(地黃)을 사약(使藥)으로 하면 정(精)을 보익하고 수렴하는 효능이 있으며 소변을 멎게 한다. 신경(腎經)의 주요한 약이다." 3 <본초강목(本草綱目)>: "모려(牡蠣): 음(陰)을 보익할 경우네는 생것을 짓찧어서 쓴다. 불에 구우면 재가 되어 음(陰)을 보익하는 효능이 없어진다." 4, <본초경소(本草經疏)>: 모려(牡蠣)는 맛이 짜며 성질이 평(平)하고 약간 차며 독이 없다. 족소음(足少陰=신경=腎經), 족궐음(足厥陰:간경=肝經), 족소양(足少陽:담경=膽經)경(經)에 들어간다. 상한한열(傷寒寒熱), 온학(溫瘧), 경에노기(驚恚怒氣), 관절의 열이 수시로 오르내리는 증상, 번만(煩滿), 기결심통(氣結心痛), 심협하비열(心脇下脾熱)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모두 간(肝), 담(膽), 2경(經)의 병이다. 겨울에 2경(經)이 한사(寒邪)를 받으면 상한한열(傷寒寒熱)의 병이 되고 여름에는 더위를 받으면 온학(溫瘧)이 된다. 사(邪)가 숨어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관절에 뎔이 머물러 있으면서 수시로 내왕하게 된다. 2경(經)의 사(邪)가 막혀서 분산되지 않으면 심협하(心脇下)의 비(痞)로 되며 열사(熱邪)의 열이 심해지면 경에노기(驚恚怒氣), 번만기결심통(煩滿氣結心痛)이 된다. 이 약의 맛은 짜고 성질은 차기 때문에 2경(經)에 들어가 한열(寒熱)의 사기(邪氣)를 제거하고 영위(營衛)를 통하게 하며 구완(拘緩)을 조화시킨다. 따라서 모든 증상은 치료된다. 소음(少陰)에 열이 있으면 여자는 적색 또는 백색의 백대하가 나오고 남자는 유정이 생기게 된다. 소음(少陰)의 열을 완화시키면 정기(精氣)로 수렴하는 작용을 하므로 이런 증상들은 치료된다." 5, <본경봉원(本經逢原)>: "모려(牡蠣)는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에는 상한한열(傷寒寒熱), 온학(溫瘧)이 멎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하였따. 그러나 이것은 상한병(산한병)으로 발한한 후 한열이 멎지 않는 증상을 가리킨 것이다. 일반적인 발한약이 아니다. 중경(仲景)은 소양병(少陽病)으로 사기(邪氣)가 근본을 범했을 경우에는 시호용골모려탕(柴胡龍骨牡蠣湯)을 썼다. <금궤요략(金匱要略)>에서는 백합병(百合病)이 갈(渴)로 변하면 괄루모려산(栝樓牡蠣散)을 쓴다고 했다. 이런 경우에 모려(牡蠣)는 내결(內結)의 열을 발산시키는데 사용된다. 즉 온학(溫瘧)의 열이 내부에 쌓이고 경에노기(驚恚怒氣)가 역상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려(牡蠣)의 짠 것과 찬 것으로 강설(降泄)하여야 한다. 구완, 서루, 적백 대하는 모두 담적이 내부에 울체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본품은 대체로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결괴(結塊)를 제거하는 작용을 할 뿐이다." 6, <본초사변록(本草思辨錄)>: "별갑(鼈甲), 모려(牡蠣)의 용법은 확실히 차이가 있으나 처방에 혼동하는 일은 없지만 오직 열을 내리며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하는 효능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확실한 구분이 없다. 이 점을 잘 구별해야 하고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의하면 별갑(鼈甲)은 심복(心腹)의 징가(癥瘕), 적(積)을 주로 다스린다. 모려(牡蠣)는 경에노기(驚恚怒氣), 구완을 치료한다. 중경(仲景)은 배 안의 경결을 풀 목적으로 별갑(鼈甲)을 별갑전환(鼈甲煎丸)으로 사용하고 협만(脇滿)을 제거할 목적으로 소시호탕(小柴胡湯)에 모려(牡蠣)를 가하였다. 이것을 보면 별갑(鼈甲)으로 치료하는 음식(陰蝕), 치핵(痔核), 골증(骨蒸)을 어찌 모려(牡蠣)로 대체하여 치료할 수 있겠는가? 모려(牡蠣)로 치료하는 도한, 소갈, 나력경핵(瘰癧頸核)을 어찌 별갑(鼈甲)으로 치료할 수 있겠는가? 별갑(鼈甲)이 악육(惡肉)을 제거하고 궤양을 수렴하는 것은 음(陰)이 많아져서 양(陽)이 조화되었기 때문이다. 모려(牡蠣)가 경에(驚恚)를 치료하고 유설(遺泄)을 멎게 하는 것은 양(陽)을 수렴하여 음(陰)이 이미 튼튼해졌기 때문이다." [비고(備考)] 1, <촉본초(蜀本草)>: "또 악려(萼蠣=실제한자는 <虫+雩=虫雩>와 <虫+歷=虫歷>인데 사전이나 인터넷상 표현이 안되어 대만구글에서 표현한 방식을 채택하여 JDM이 옮김)라는 것이 있는데 형체가 짧아서 약용하지 못한다. <본초도경(本草圖經)>에서는 모려(牡蠣: 해중방속=海中蚌屬)이 지금 내주(萊州) 창양현(昌陽縣)의 바다에서 많이 난다고 했다. 2~3월에 채집한다." 2, <본초도경(本草圖經)>: "모려(牡蠣)는 지금은 어느 바다에든 있지만 남해민중(南海閩中) 및 통태간(通泰間)에 제일 많다. 모려(牡蠣)는 돌에 붙어서 자라며 돌이 방(房)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여방(蠣房)이라 부른다. 일명 호산(蠔山)이라고도 한다. 진안(晉安)의 사람들은 호보(蠔莆)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자라는데 권석(拳石)과 같은 성질이 있어 사면이 점차 늘어나서 1-2장(丈) 가량 된다. 산처럼 높고 험한 바위에 서식하는데 방 하나에 호육(蠔肉)이 한 덩어리씩 있다. 방의 크기에 따라 육질의 크기도 다르다. 큰 방은 지제(地蹄)과 같으며 사람의 손가락 마디 정도의 작은 것도 있다. 조수가 밀려들 때에는 방을 전부 열고 있다. 작은 벌레가 들어오면 방을 닫고 잡아 먹느다. 바닷가의 사람들은 이것을 채집하여 방에 구멍을 뚫은 후 센 불을 가해 열어서 막대기로 육질 부분을 긁어낸다." 참고문헌 및 출처(글/ 약초연구가 & 동아대 대체의학 외래교수 전동명), (두산백과), 여지도서, 동의보감, 본초강목,(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의학 및 한국고유의 한약재), 2004,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색 한국패류도감, 춘관통고, 역주탐라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영덕 삼척 오십천 ...1개월 정도 하천에 머물다가 바다로 나가 북해도 수역을 거쳐 베링해와 북태평양에서 성장하고, 3~4년 후 어미가 되어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산란 후 일생을 마치는 대표적 모천회귀성 어종이다.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는 지난 1970년부터 인공부화 방류사업을 시작해 2013년까지 4,276만마리의 치어를 울진 왕피천 등에 방류했다. 내년에는 수온자극을 통해 뼈에 나이테의 문양을 만들어 내는 발안란 이석표지법을 시험 도입해 연어의 회유기간, 회유경로, 회귀율 등 생물학적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가을이면 영덕 삼척 오십천을 위시하여 동해안의 각 하천에는 연어가 돌아오기 시작한다. 피레미 새끼보다도 작은 몸체로 동해안의 각 하천에 방류된 어린 연어가 험한 바다에서 줄기찬 생명력으로 자라고 자라서 어른들 장단지만큼 자란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잊지 못하고 돌아온다. 어만리호천리(魚萬里虎千里)라 하여 호랑이는 하루 밤에 천리를 가고, 물고기는 만리를 간다는 고사에서 멀리 북태평양의 알라스카 근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연어 떼의 아름다운 귀향이다. 송어(松魚)와 함께 진정한 가을 진객으로 대접받는 연어들이 생명의 고향, 연어의 모천인 양양 남대천을 위시하여 고성 의 북천, 강릉의 연곡천, 옥계의 주수천, 삼척의 오십천, 근덕의 마읍천, 호산의 가곡천, 울진의 왕피천을 비롯하여 멀리 포항의 형산강, 울산의 태화강에도 연어가 돌아온다고 한다. 국내 소상 연어들 중 70%가 남대천으로 몰리는 탓에 옛날부터 연어를 말려 조상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할 정도였으나 지금은 회귀량이 급감해 지난 84년 국립수산과학원 영동내수면연구소가 설립되고부터 함부로 잡으면 안되는 어종이 됐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춘관통보, 공선정례 등에 따르면 생연어(生魚連), 건연어(乾鰱魚), 연어알젓(鰱魚卵醢), 염연어(鹽連魚), 연란(連卵), 침연어(沈連魚) 등 다양한 연어 조리품을 임금님께 진상한 기록이 있다. 양양 연어의 특성 연어의 고향 울진 왕피천. 연어는 한해에 매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가 수만 마리가 넘는 연어가 자신이 태어났던 하천에서 산란을 한 뒤 곧바로 일생을 마친다. 연어는 담백한 맛이 일품으로 생 연어는 물론, 가공된 연어포와 연어알은 전통적인 임금님 진상품으로 유명하다. 또한 동의보감에는 “연어는 고기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알은 분홍색이며 맛이 매우 좋다.”고 전하고 있는데 특히 풍부한 것은 오메가-3지방산. 이는 심장병·염증 및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춰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며 류머티즘성 신경통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연어는 보통 크기가 60~70cm이며, 무게도 평균 3~4kg에 달해 웬만한 어류보다 덩치가 크다. 몸은 비교적 가늘고 위아래로 약간 납작하다. 해양에서의 몸빛은 등은 암청색, 몸 옆은 은백색이고, 몸과 지느러미에 검은 반점이 없다. 꼬리지느러미에는 은백색의 방사선이 지나고 있다. 그러다가 산란기에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은백색이 없어지고 몸 전체가 거무스름해지며 검정·노랑·분홍·보라가 섞인 불규칙한 줄무늬가 몸 옆에 나타난다. 바다에서 민물로 오다 성숙함에 따라서 머리가 길어지고 특히 수컷의 주둥이 끝은 아래쪽으로, 아래턱은 위쪽으로 굽고 양턱의 이가 강해진다. 성숙한 알은 지름이 7-8㎜, 빛깔은 붉은빛이 도는 오렌지색이고, 한배에 약 3,000개의 알을 품고 강의 중류에 산란한다. 부화한 치어(어린 고기)는 바다로 내려가서 성장한 다음 원래의 강으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다.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난 뒤 바다로 나가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다시 민물로 돌아와 산란한다. 알을 낳고 죽다 여름이나 가을에 산란하는데, 원양에서 여러 달 동안 수천km나 헤엄쳐서 산란지인 강 상류에 도착한다. 산란지에 도착한 암컷은 수심이 얕고 물결이 잔잔하게 이는 자갈밭에 구멍을 판다. 암컷이 꼬리를 앞뒤로 흔들어 접시 모양의 구멍을 파는 동안, 수컷은 주변을 돌며 암컷을 보호한다. 암컷이 구멍에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위에 정자를 뿌려 수정시킨다. 그러고 나면 암컷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구멍을 파고 더 많은 알을 낳는다. 수컷과 암컷은 이러한 과정을 여러번 반복한다. 산란 후에는 구멍 옆의 자갈로 알을 잘 덮어 준다. 산란을 끝낸 암수는 지쳐서 모두 죽는다. 유년시절 알은 3-4개월 만에 부화한다. 어린 연어는 배에 붙어 있는난황낭에서 양분을 섭취하며 몇 주 동안 자갈 사이에 숨어 지낸다. 어떤 종은 자갈밭에서 나오자마자 민물을 떠나 바다로 나가고 어떤 종은 3년 정도 민물에 머물러 있으면서 곤충과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 자신이 태어난 민물을 떠난 어린 연어 중 아주 일부만이 바다에 도착한다. 곤줄메기,물총새같은 다른 물고기와 새들한테 잡아먹히고, 오염된 물 때문에 죽기도 하며, 거대한 저수지를 빠져나가려다 많은 수가 죽는다. 바다에 도착한 연어는 그 곳에서 6개월-5년 동안 생활한다. 이 기간 동안 주로 새우, 오징어, 작은 물고기 등을 잡아먹는다. 산란여행 이들은 성어가 되어 산란기에 이르면 다시 강으로 간다. 강으로 돌아가기 위해 세찬 물살과 소용돌이를 거슬러 올라가며 높이가 3m나 되는 폭포도 뛰어넘는다. 산란하려고 민물에 올라오면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몸에 저장된 지방에서 영양분을 얻는다. 많은 연어가 산란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동 중에 죽는다. 어선과 낚시꾼들에게 잡히고, 공장에서 배출한 오염 물질에 희생된다. 또 어도(魚道:물고기 사닥다리)를 통해 댐을 오르다가 지쳐서 죽기도 한다. 연어는 동해안 특산 어종으로, 단백질과 지질의 함량이 높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골고루 함유되어 있으며 유럽에서는 연어를 미식의 제일로 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연어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속을 데워주며 부종에도 사용한다"고 했다. 그래서 혹간에는 산후에 잉어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연어는 비린내가 심하게 나므로 훈제를 해 먹게 된다. 1. 성인병 예방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는 혈액을 잘 흐르게 해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 혈전증, 뇌졸중, 당뇨병 등을 예방 및 치료 해주고 체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쇠고기, 돼지고기 와 같은 육류지방 에는 DHA 가 들어있지 않다. 세계적인 건강, 영양 전문가들이 몸에 좋은 '수퍼 푸드'를 꼽을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일한 생선이 바로 연어다.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오메가-3 지방(불포화지방의 일종)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식단에 연어 요리를 집어넣는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성분은 EPA DHA 등 오메가-3 지방으로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해준다. 전미심장학회가 건강한 사람에게 매주 2회 정도 연어 등 기름진 생선의 섭취를 권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오메가-3 지방이 대장암 등 암을 예방하거나 염증을 없애준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민간에서 류머티스성 관절염 환자에게 연어의 기름을 권장하는 것은 오메가-3 지방이 염증을 감소시킨다고 믿어서다. 2. 시력 보호 및 피부건강에 효과적 하루 종일 컴퓨터와 TV를 가까이 하는 많은 현대인들은 일명 "모니터병"이라고 부르는 VDT 증후군(눈의 장애, 두통, 목과 손목의 통증 등을 동반)에 시달리고 있다. 연어의 살몬핑크(Salmon Pink)라 부르는 예쁜 붉은색의 성분의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시력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 시력보호 외에도, 백내장의 예방과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연어에 눈의 망막을 구성하는 비타민A와 핵산이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시력보호뿐 아니라 점막, 피부건강에 도움을 준다. 특히 핵산과 비타민D, 비타민E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세포를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며, 풍부하게 들어있는 콜라겐이 세포의 수축을 돕고 건조한 피부의 보습효과를 강화시켜 준다. 비타민 A 는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 눈이 피로하기 쉬운 사람 살갗에 습기가 없는 사람에게 좋다. 특히 음체질인 사람들에게 보약과 같은 식품이다. 3. 피로회복 비타민E와 비타민B가 피로회복에 도와을 준다. 연어의 생활 행태는 거친 물살을 솟아오르는 스태미너를 갖고 있다. 연어는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다른 생선과 달리 비타민 D도 함유하고 있다. 이 영양소가 피로회복에 그만이며,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운동으로 소비되는 단백질의 보충에는 대단히 좋은 식품이다. 또한 운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산소가 오히려 많아지는데 이때 피부가 거칠어지는 역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연어의 비타민 A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연어알에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빈혈을 치료하는 헤모글로빈 생성에 필요한 페닐알라닌 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운동으로 소비되는 혈액의 성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며, 근육을 만드는 물질이 들어있어 보디빌더들이 찾아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4. 노화방지 비타민E와 비타민B가 노화방지에 도움을 준다. 또한 토코페롤 보다 훨씬 좋은 셀레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기 때문에 중년이나 노년의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핵산의 함량은 가식부 100g당 289mg으로 정어리(590mg) 멸치(341mg)다음으로 많이 들어 있어 인체의 노화를 방지하며 핵산 섭취가 부족하면 시력감퇴, 성기능 감퇴, 과산화지질의 생성과 간장의 노화등 여러 가지 노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5. 골다공증 예방 연어는 비타민도 풍부하다. 특히 '선샤인 비타민'(햇빛을 쬐면 몸 안에서 생성된다)으로 통하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다. 비타민 D의 주 기능은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따라서 중년 이후 골다공증이 심해 골절이 걱정된다면 연어 요리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감기와 눈병 예방을 돕는 비타민 A 소화를 촉진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타민 B군 '회춘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주로 알에 많다)도 꽤 들어 있다. 6. 두뇌발달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주는 DH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연어에는 기억학습 능력유지 효과가 있는 고도 불포화지방산 인 DHA 함유량이 820mg, FPU 함유량이 492mg 으로 많이 들어 있어 두뇌발달에 효과적인 식품이다. 7. 불필요한 기름 배출, 근육통/관절통에 효과 연어의 오메가-3 (Omega-3)는 체내 축적된 불필요한 기름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한다. 더불어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어 류머티즘을 예방하고, 노인성 치매를 방지해준다. 좋은 연어 고르는 방법 살 때는 선홍색을 띠고 지방에 흰 힘줄이 섞여 있는 것을 골라야 한다. 맛은 산란기 직전에 바다에서 잡은 것이 최고다. 강에서 태어난 연어는 바다로 나가 성장한 뒤 다시 강으로 되돌아가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 강은 연어의 산란 장소이자 무덤인 셈이다. 강에서 잡힌 연어의 맛이 떨어지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양식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이 극히 적을뿐더러 자연산보다 발암물질인 PCB와 다이옥신 등이 한층 많이 함유돼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및 출처 신증동국여지승람, 춘관통보, 공선정례 ,위키백과 , 양양군청 홈페이지


 전통발효식초 식초류 흑초 식품명인 73호 현경태 초두루미(흑초)
전통발효식초 식초류 흑초 식품명인 73호 현경태 초두루미(흑초)
 나전칠기문화재기능인 제5813호 장태복
나전칠기문화재기능인 제5813호 장태복
 태안자염소금굽는사람들
태안자염소금굽는사람들


사계절 내내 ...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피부 상태와 활동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활동에 따른 선크림 선택 방법 SPF 8~12 : 가벼운 산책, 장보기 SPF 15~25 : 실외 스포츠 SPF 20~30 : 한여름 레저 스포츠 SPF 50 : 스키, 해양 레포츠 SPF 50+ : 장시간 실외 활동 자 그럼, SPF 지수 옆에 붙는 ‘PA’와 ‘+’ 표시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PA는 ‘Protection Factor of UV-A’의 약자로 자외선 A의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가 붙을수록 차단 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외선 A는 거의 오존층에서 반사되어 땅에 도달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비합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외선 A에 대한 노출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되었죠. 2) 유통기한 자외선 차단제는 미 개봉 시 2년 정도를 유효기간으로 보고 있지만, 개봉 후에는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하다 남은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법이나 보관 방법에 따라 성분이 변질 되어 오히려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버리고 새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뜨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선크림 생략해야지~” 하시는 분들! 자외선 차단제 하나만 잘 발라도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피부를 책임지는 선크림, 잊지 마세요! Real 건강 Never Stops! http://www.aiablog.co.kr/418

■ 축구하는 1...31-652-4121 ■ 필가부 주방장 <태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86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68-3번지 전화번호:032-662-5298 http://wisdoma.tistory.com/1567

장마철 대나무밭에서만 잠깐 만날 수 있는 망태버섯, 바다를 대표하는 힘, 갯장어! 그리고 관절염과 통증을 다스리는 다릅나무까지~ 건강한 여름을 책임지는 약이 되는 여름 보양식을 리얼다큐 숨에서 공개한다. ■ 망태버섯 망태버섯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인 7월에 대나무밭에서 볼 수 있는 버섯이다. 죽순을 채취하고 난 뒤 대나무밭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이 버섯은 폐와 간을 보호해주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와 지방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가 온 뒤 습기가 많은 아침에 주로 피며 온도와 습도가 잘 맞으면 3~4시간 만에 폈다가 시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찾아 보기에 힘든 버섯의 종류다. 정구진 씨는 20년째 약초를 채취하고 있는 약초군이다. 장마철만 되면 담양으로 내려가 대나무밭을 찾아간다. 대나무밭은 모기들의 천국이라 잠시도 있기 힘들지만 정구진 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기 찾아낸 것은 바로 하얀 망태버섯이다. 버섯 갓에서부터 망사 모양의 새하얀 망태가 퍼져 내려와 마치 화려한 레이스를 쓴 것 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망태버섯은 막걸리 익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를 맡고 버섯을 찾는다고 한다. 혹시 버섯을 실수로 밟을까 조심하며 대나무 밑동을 밟으며 채취를 하는데 무려 5,000평이나 되는 대나무밭을 하나하나찾아 뒤져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망태버섯은 덜 자란 초기 상태인 버섯에서부터 갓 망사를 편 버섯과 활짝 핀 버섯까지 아주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 망태버섯은 갓 부분만 빼고는 모두 먹을 수 있다. 입맛을 돋우는 갖가지 요리로 먹을 수 있는데 생으로 먹으면 아삭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고 익혀서 먹으면 입안에 부드럽게 녹는다. 장마철에만 피는 망태버섯의 특성 때문에 1년 동안 맛보려면 말려야 한다.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당류, 아미노산,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망태버섯의 뛰어난 약효로 인해 항암 버섯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 갯장어 허준의 동의보감에 성질이 평하고 여러 가지 충을 죽이는데 악창과 옴, 누창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나와 있는 갯장어! 개의 이빨을 닮아 무시무시한 생김새의 갯장어는 겨우내 제주도 남쪽의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다가 연안으로 올라오는 5월 말부터 11월까지가 제철! 하지만 그중에서도 7월이 가장 맛있을 때라는데~ 7월 갯장어는 산란기를 맞아 살이 탱탱하게 오르고 기름기가 많아 고소하며 영양가가 높다고 한다. 이 시기에 남해안에서는 물때에 맞춰 올라오는 장어를 잡기 위해 바다에서 살다시피 한다는데! 전남 고흥에 사는 경력 30년의 손유복 선장 역시 갯장어를 잡기 위해밤낮없이 조업을 나선다. 갯장어는 주낙 방식으로 잡는다. 활동성이 강하고 식성도 좋아서 그물로는잡기 힘들기 때문에 미끼를 끼운 주낙으로 잡는 것! 대야에 바늘을 꽂아두고 하나씩 던지는 방식인데, 대야 하나당 바늘의 개수는 100개, 대야의 개수는 200개나 된다. 무려 2만 개의 바늘에 자른 전어를 끼워 던지는데 어깨가 아프고 팔이 떨어져 나갈 듯한 고통에도 7월의 귀한 갯장어를 낚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한 번 조업에 던진 낚싯줄의 총 길이만 해도 3km가 넘는다. 따라서 건져 올리는 시간도 그만큼 길다. 갯장어는 양식이 불가능하므로 한 땀 한 땀 걸려 올라오는 한 마리마다 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잡은 갯장어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나머지는 식당으로 팔려나간다. 제철 갯장어를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식당의 공급량도 부족할 정도!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비타민A, 미네랄 등이 풍부한 갯장어! 원기 회복에 좋으며 갯장어 껍질은 피부미용,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특히 오메가3 계열 지방산(EPA, DHA)의 함량이 높아성인병 예방, 허약 체질 개선, 피로 해소에 탁월하다. 샤부샤부, 회, 탕 등으로 먹어도 좋지만, 더욱 효과적으로 갯장어를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 바로 즙으로 먹는 것이다. 고흥에서 25년째 갯장어즙을연구, 개발해 온 박웅기 씨는 자신만의 비법으로 갯장어즙을 만든다는데! 바다생선으로 즙을 내리기 때문에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제거하고, 갯장어와 어울리는 다른 한약재를 함께 넣는 것이 경력 25년 박웅기 씨의 노하우!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름 바다에서 갯장어와 사투를 벌이는사람들을 리얼다큐 숨에서 만나보자! ■다릅나무 옛말 중에 다릅나무는 "병마를 쫓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있다. 북한에서 펴낸 <동의학 사전>에는 다릅나무를 진통제로 관절염에 쓰며 종양 치료제로도 쓴다고 나와 있다. 다릅나무를 생약명으로는조선괴, 양괴라고 부른다. 회화나무를 괴목이라고 부르는데 회화나무는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이지만다릅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조선괴 즉 조선회화나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처럼 귀한 대접받는 다릅나무를 가장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기름을 내는 것이라는데! 경남 창원에서 20년째 약초를채취하는 이효기 씨는 산에서 다릅나무를 직접 벌목해서 기름을 만든다고 한다. 다릅나무는 산에서쉽게 보기는 힘든 나무! 따라서 이효기 씨만 알고 있는 다릅나무 자생지를 찾아가 필요할 때마다채취해온다.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껍질을 일일이 벗겨야 한다는데! 거친 껍질을 벗기고 나면 초록빛 부드러운 속살이 모습을 드러낸다! 깨끗이 씻은 다릅나무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 항아리에 넣는다. 삼베로 입구를 막고 짚으로 항아리를 감아 황토를 바르고 왕겨를 사용해 기름을 내는 방식을사용한다는데! 왕겨를 통해 기름을 내기 때문에 서서히 추출된다. 기름을 내는 데 필요한 시간만 해도 무려 3일! 3일 동안 곁을 지키며 살뜰히 살펴야 한다. 3일의 추출시간을 거치면 왕겨가 식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칫 열이 남아있을 때 해체를 하면 항아리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 항아리가 깨지면 공들여 추출한 기름이 헛수고가 된다. 3~4일 정도 서서히 식혀 얻어낸 다릅나무 기름의 양은 대략 2L 정도! 고생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이마저도 6개월의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 항아리에서6개월간 숙성 과정을 거치면 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르나 메틸알코올 등이 날아간다. 여기서 끝이아니다. 기계를 통해 깨끗하게 최종 정제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걸러내면 비로소 항산화 작용, 통증을다스리는 다릅나무 기름이 완성된다. http://wisdoma.tistory.com/1799

순남 씨의 비...나물과 꽃들이 자라는 순남 씨의 비밀 정원이 됐다. 매일 아침 남편 조태연(68)씨가 짜 준 산양유로 커피를 타 마시고 꽃들의 문안인사를 받으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순남 씨. 과연, 이 정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 비밀정원의 탄생 술과 육식을 좋아했던 남편 조태연(68) 씨, 업무 스트레스를 핑계로 회식마저 잦아지다보니, 태연 씨의 몸은 비만, 고혈압, 심장병 등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결국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고.. 아내 최순남(63) 씨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찾아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힐링 프로젝트’! 남편에게 맨 먼저 녹즙을 먹이기 시작하고, 채소라면 김치도 먹지 않던 남편의 식성을 바꾸기 위해 약선 요리에 효소 담그는 법까지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갔다. 그렇게 10년... 채소를 입에 대지도 않던 남편이 이제는 알아서 산나물을 뜯어먹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진맥진, 식은땀을 흘리던 남편의 건강도 넓은 농장 일을 혼자서 도맡아 할 정도로 좋아졌다. 몸이 회복되자 마음의 건강도 회복한 태연 씨, 매사에 불만이 많고 짜증만 내던 사람이 아내를 위해 모닝커피를 대령하고 자칭 '마님을 위한 머슴'을 자처한다. 몸과 마음의 행복을 자연에서 찾은 부부 제주도 깊은 숲속에 자신들의 지상낙원을 만들었다. 이름도 모를 희귀한 산약초들이 지천이고 소담하게 가꾼 정원은 계절마다 꽃들이 만발한다. 숲에서 나는 재료들로 자급자족~ 순남 씬 오늘도 남편을 위한 화려한 밥상을 차려낸다. # 가족을 위한 밥상 매일 손자 조환희(8) 군을 등하교 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손자의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는 할머니 순남 씨. 손자를 위해 뉴질랜드에서 산양을 공수해올 정도로 환희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 이렇게 손자를 열심히 돌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 젊은 시절,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던 순남 씬, 일하느라 바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준 적이 별로 없다.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력에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자란 세월이 보태져 순남 씨의 자녀들은 그다지 건강한 체질이 아니다. 엄마로서 가슴 한켠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던 순남씨, 자식에게 진 빚을 손자에게 갚는다는 심정으로 환희에겐 직접 재배한 산약초로 채식 밥상을 차려준다. 손자뿐이랴, 아들며느리를 위해서도 매일 아침 갖가지 산나물들을 따와 그 전날 컨디션에 따른 맞춤형 녹즙까지 대령하는데~ 이런 순남 씨의 정성 가득한 아침 만찬에 건강은 물론이요, 가족애도 충만해진다. # 이웃을 위한 밥상 남편을 살리기 위해 약선 요리를 독학한 순남 씨. 약선 요리는 남편을 살려준 약이기도 했지만 사람과 인연을 맺게 해준 약이기도 했다. 순남 씨의 농장에 매일같이 놀러오는 정은희(50) 씬, 원예 치료 수업을 다니면서 알게 된 후배다.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순남 씨, 혈액 쪽으로 몸이 좋지 않았던 은희 씨에게 자신의 삶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순남 씨의 정원으로 초대해 같이 산약초를 뜯고~ 그 산약초로 은희 씨의 건강에 좋은 재료며 요리법을 가르쳐준다. 맛좋은 음식은 물론이요, 기분 좋은 웃음은 덤이다. 순남 씨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은희 씨의 맞춤 밥상은 은희 씨에게 치유를 선물해 주었다. 은희 씨뿐만 아니라 주변의 고마운 사람들에게 건강밥상을 차려 보답하는 순남 씨, 기력이 약한 사람에겐 겨우살이 삶은 물로 밥을 짓고, 위염을 앓는 사람에겐 번행초 잡채를 대접하고... 먹는 사람의 입맛과 건강을 배려해서 차려내는 순남 씨의 밥상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든다. # 순남 씨의 비밀정원 순남 씨가 비밀정원을 만든 지도 벌써 10년, 그 동안 비밀의 정원을 찾아온 그녀의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은 회복되었고 거친 억새밭이었던 산에도 많은 생명들의 숨결이 살아났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순남 씨의 정원에 오면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녀의 정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맑은 공기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건강에 보탬이 되겠지만.. 순남 씨와 이웃들이 건강을 회복한 진짜 이유는, 풀 한 포기, 들고양이 한 마리에도 사랑을 쏟는 순남 씨의 정성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밟고 간 식물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워주고 비가 오면 꽃이 무거울까봐 일일이 빗물을 털어주는 순남 씨, 그 정성을 먹고 자란 꽃과 풀과 나무들은 건강한 에너지를 내뿜으며 정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자연이 주는 충만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정원에서 순남 씨는 오늘도 꽃들과 미소를 주고받고 있다. http://wisdoma.tistory.com/1812

▣ 창수...sp;▣ 창수린 오늘 방송한 수요미식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태국요리집을 소개 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를 여행하면서 그나라에 음식을 먹어 볼 일들이 많다. 동남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태국이다. 태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태국 현지에서 맛본 여러가지 태국 요리들을 먹을 수 있는 곳들을 찾고 있다. 오늘은 태국음식을 그대로 맛 볼수 있는 곳이다. 그중에서 후암동에 있는 창수린이라는 곳을 소개 한다. 창수린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태국 사람이라 더욱 태국요리를 믿고 먹을 수 있다. 태국음식이 향신료가 강하다고 별로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방문하면 더욱 좋을 듯하다. 그냥 부드러운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 맛이라고 하면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요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똠양꿍일 것이다. 창수린에서 만들어 내는 똠양꿍은 대충 만든 것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태국요리전문점을 다녀보면서 먹어본 똠양꿍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맛을 선보인다. 강렬한 맛 뒤에 토마토의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창수린은 굉장히 작은 식당이다 테이블이 4개가 전부인 곳이다. 4인용 테이블 2개 2인용 테이블 2개 이렇게 가게 안은 12명이 들어가면 꽉차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좁은게 조금은 흠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가게가 좁아도 그만큼 음식에 자신감이 넘쳐보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유인가 보다. 이곳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지번) 용산구 후암동 194-8전화:02-3789-7625 http://wisdoma.tistory.com/1921



마두... 등 1일 3~10g 달여서 복용한다. 태자삼 너도개미자리과의여러해살이풀인 큰개별꽃의 뿌리. 성미는 따뜻하며 달면서 약간 쓴 맛이 난다. 강장과 폐, 위를 이롭게 하는 효능이 있어 신체허약, 식욕부진, 소화불량, 설사, 마른기침, 가슴이 뛰는 증세 등에 쓰인다. 달이거나 가루약, 환약으로 만들어 복용한다. 어린 순은 나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여지 무환자나무과의 상록교목. 씨(여지핵)가 약재로 쓰이는데 6~7월에 채취하여 말린다. 성미는 따뜻하고 달다. 이기, 산한, 진통, 소염의 효능이 있어 위통,부인어혈복통, 치통, 임파선종, 고환종통 등에 응용된다. 1일 12~18g 달이거나 가루약으로 만들어 복용한다. 위령선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 덩굴풀인 으아리의 뿌리. 성미는 따뜻하고 매우며 짜다. 진통, 거풍습 등의 효능이 있어 수족마비, 언어장애, 각종 신경통, 관절염, 편도선염, 간염 등에 이용한다. 달이거나 환약, 가루약으로 복용하며 또는 찧어서 환부에 붙인다. 백부 백부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파부초의 뿌리. 백부근이라고도 한다. 성미는 약간 따뜻하며 달고 쓰다. 진해, 거담, 살충의 효능이 있어 폐결핵, 백일해, 해소, 만성기관지염, 습진, 피부, 살충의 약재로 쓰인다. 달이거나, 가루약, 환약으로 만들어 복용하며 또는 물로 달여 환부를 닦아낸다. 보골지 콩과에 딸린 한해살이풀. 40~100cm정도 곧게 자라는데 약재로 쓰이는 것은 씨앗이다. 성미는 따뜻하고 맵다. 보신, 조양, 온비, 흥분의 효능이 있어 신허, 양위, 요슬냉통, 허한해소, 빈뇨 등에 사용한다.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것을 쓰는데 달이거나, 환약, 가루약으로 만들어 복용한다. 또는 환처에 개어 바른다. 상륙 자리공과의 여러해살이 풀인 자리공의 뿌리. 성미는 차고 쓰다. 이수, 소종의 효능이 있다. 적용질환은 소변불리, 변비, 수종, 창만, 각기, 옹종, 창독, 후두염 달이거나 가루약으로 복용하며 갈아서 환부에 개어 붙이거나 찧어서 붙이기도 한다. 영지 모균류에 딸린 버섯. 충북, 강원도 등에 분포하며 산중 넓은 잎나무의 썩은 그루터기에 자생한다. 성미는 평하고 단맛이 난다. 강장, 진정, 진해, 구어혈 등에 효능이 있어 신체허약, 신경쇠약, 불면증, 심장병, 심교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옹종, 각종 암종 등의 치료약으로 쓰인다. 가을에 채취하여 달이거나 가루약으로 만들어 1일 2~4g 복용한다. [이 게시물은 master님에 의해 2020-06-02 09:43:02 건강과 생활에서 이동 됨]

■ 태양인태양인은 폐가 크고 간은 작으며 가슴 윗부분이 발달한 체형이다. 목덜미가 굵고 실하며, 머리가 크다. 대신 허리 아랫부분이 약하며,엉덩이가 작고 다리가 위축되어 서있는 자세가 안정되어 보이지 않는다. 다른사람과 사교하는데 소통을 잘하는 장점이 있고, 과단성이 있어 사회적 관계에 유능하다. 태양인은 소변량이 많고 잘 나오면 건강하다. 입에서 침이나 거품이 자주 나오면 병이 된다. 담백한 음식이나 간을 보하고 음을 만들어주는 식품이 맞다. 태양인은 폐에 상승하는 양기운이 많고 간에 하강하는 음기운이 적으므로, 하허상실하다. 따라서,양을 억제하고 음을 도와 상승한 기운을 아래로 낮춰주어야 한다. 허약한 하체에서 오는 병 오가피, 소나무 마디 얼격, 해역, 반위증 모과, 포도뿌리, 다래, 합조개, 순채나물 간을 보할 때 채소, 과일, 조개류 ◈ 약차의 적용솔잎차, 감잎차, 녹차, 보리차, 모과차, 미역차, 다시마차, 오가피차 등이 몸에 이로움. 인삼차, 꿀차, 도라지차, 은행차, 영지버섯차, 호두차 더덕차, 땅콩차 율무차, 차조기차 등은 과음하지 않는것이 좋음.

■ 태음인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작으며 허리 부위의 형세가 성장하여 서있는 자세가 굳건하다.반면에 목덜미 기세가 약하다. 키가 큰 것이 보통이고 작은 사람은 드물다. 대개는 살이 쪘고 체격이 건실하며 간혹 수척한 사람도 있으나 골격만은 건실하다. 성격은 꾸준하고 침착하며 무슨 일이든 시작한 일, 맡은 일을 이루어 성취하는 데 장점이 있으며 어느 곳에서나 잘 적응하는 재간이 있다. 태음인은 땀구멍이 잘 통하여 땀이 잘 나오면 건강하다. 호흡기와 순환기 기능이 약해서 심장병․고혈압․중풍․천식 등에 걸리기 쉽고 지방질이 많은 식품은 좋지 않다. 고단백질의 식품이 좋고, 채소류․해물류가 좋고, 자극성 있는 조미료나 닭고기․개고기는 해롭다. 폐에 발산하는 기운이 적고 간에 모아 들이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안으로 열이 쌓이기 쉬우므로 항상 소변과 대변을 잘 소통하게 하여야 한다. 허약한 폐의 기운을 보하는 약재 맥문동, 오미자, 산약, 길경(도라지), 우황, 황금, 상백피, 행인, 마황, 의이인, 황율, 웅담, 원지 주의해야 할 약재 감수(가슴이 조이며 답답하며 아플 수 있음), 계지(발진이 생길 수 있음), 영사(구갈이 생길 수 있음), 석고(손발이 궐랭하게 될 수 있음),시호(땀이 멎지 않을 수 있음), 황백(소변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 ◈ 약차의 적용율무차, 현미차, 칡차, 땅콩차, 도라지차, 더덕차, 미역차, 다시마차, 오미자차, 둥굴레차, 맥문동차, 차조기차, 마차, 버섯차, 은행차, 살구차, 매실차, 귤차, 들깨차 등이 몸에 이로움. 보리차, 결명자차, 녹차, 인삼차, 꿀차, 생강차등은 과음하지 않는것이 좋음.
소태나무과로 이 나무를 대표하는 맛은 '쓰다'는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지독하게 쓴 것을 '소태보다도 더 쓰다'고 말한다. 아이를 연년생으로 두어서 어머니가 젖이 모자랄 때 젖을 빨리 떼려면 소태나무 껍질이나 이파리 또는 열매를 짓찧어서 젖꼭지에 발랐다. 그렇게 하 면 어찌나 쓴지 아이가 다시는 젖을 물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소태를 너무 장기간 또는 과량 복용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경우 나중이 불임이 될 수 있다. 민간에서 소태나무는 껍질을 소화불량을 해소하고 식욕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 했는데, 임산부는 제외. 잘못하면 낙태하거나 유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껍질을 한방에서는 고수피(苦樹皮), 고목피(苦木皮)라고 한다. 끓는 기름으로 입은 화상 이나 입술이 튼데 바르며 건위약(健胃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위염에도 쓰인다. 잎과 껍질은 장염이나 습진․감기․소염에 사용하며 잎과 줄기를 달인 물은 농작물에 뿌리 면 살충제가 된다. 근래 위암환자나 유방암 환자 중에는 소태나무 잎을 가루로 만들어서 환 을 지어먹고 암을 극복했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위암에는 더욱 잘 듣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대 약리학이 밝힌 결과로도 소태나무의 잎과 열매․껍질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죽이는 제암제의 성분이 있다고 한다.

1. 입... 1.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 간 기능이 떨어졌다.▶ 건강 상태 / 유달리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은 몸이 좋지 않다는 신호. 특히 간이 많이 지쳐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지나치게 긴장하면 뇌신경에 무리를 주어 간 기능이 저하, 입술이 마르게 된다.▶ 치료 방법 / 잠자기 전 립밤을 듬뿍 바른 뒤 랩으로 감싸는 응급처치법을 실시해볼 것.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의 꾸준한 섭취다. 싱싱한 과일이나 귤차, 녹차, 박향차 등을 자주 마셔도 좋다.2. 입술에 물집이 생기거나 붓는다 - 면역기능이 저하 되었다.▶ 건강 상태 / 비장은 몸의 면역 기능을 관할하는 곳. 비장이 약해지면 몸이 피곤해지고 저항력이 약해져 평소에는 몸속에 숨어 있던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가 입술에 물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장을 튼튼히 해주는 것이 관건이다.▶ 치료 방법 /인삼차와 황기차를 꾸준히 마실 것. 집에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몸의 원기를 북돋워 줄 것이다.출처: 코리아콤 블오그 네얀이3. 입술 주변에 뾰루지가 난다 - 자궁 방관에 혈액순환 장애.▶ 건강 상태 / 입 주변에 뭔가 많이 난다면 자궁이나 방광 쪽의 이상 여부를 체크해보아야 한다. 이런 증상은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등으로 자궁 주변에 혈액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특히 인중 부분이 탁하고 어두운 색이 나타난다면 자궁 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다.▶ 치료 방법 /여성의 자궁과 방광을 튼튼하게 해주는 당귀차, 천궁차를 매일 1회에서 수 회 마신다. 그러나 인중 부분의 탁한 색이 집중되어 점처럼 나타나면 자궁에 종양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4. 입술이 잘 트고 갈라진다 - 위장에 열이 많다.▶ 건강 상태 / 입술은 비장과 위장의 지배를 받는다. 입술이 잘 트고 갈라지는 것은 위장에 열이 많기 때문. 위장에 영양을 공급해 비위를 건강하게 해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 영양상으로 비타민 B2가 부족해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신경을 많이 쓰거나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런 증상은 더욱 악화된다.▶ 치료 방법 / 백출차, 박향차를 마시면 위장에 열을 내리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비타민 B2가 풍부한 간, 육류, 달걀, 우유 그리고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블랙푸드(검은색이 나는 음식)를 섭취한다.5. 입술색이 검거나 푸르스름하다 - 몸에 어혈이 뭉쳐있다.▶ 건강 상태 /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입술색에 변화가 생긴다. 혈액이 탁하냐 부족하냐 넘치느냐에 따라 입술색이 달라지는 것. 입술이 검푸른색을 띤다면 어혈이 뭉쳐 있기 때문이다.▶ 치료 방법 / 몸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겼는지 알아야 치료도 가능하다. 병원에 가볼 것.6. 입술에 핏기가 없다 - 혈허증, 빈혈증이 있다.▶ 건강 상태 /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면 자주 어지럽고 안색과 입술에 핏기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혈허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혈액 중 적혈구 수나 헤모글로빈의 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악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치료 방법 / 빈혈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가벼운 빈혈 증세라면 홍화잎차, 당귀차, 생기황차 등을 꾸준하게 마시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7. 입술색이 지나치게 붉다 - 몸에 열이 많다.▶ 건강 상태 / 위 속에 열기가 많은 ‘위화’ 상태이거나 감기나 결핵 같은 질환이 있어 열이 올라올 경우 입술색이 유난히 붉게 된다. 특히 위에 열이 많은 체질은 배가 조금만 고파도 속이 쓰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며 입 안이 헐기도 한다.▶ 치료 방법 / 감기 등 질환이 원인일 경우에는 병의 치료가 우선이며, 심한 위화 체질은 병원에서 위에 열을 내려주는 전문적인 처방을 받는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위의 열을 내려주는 백출차, 박향차를 꾸준하게 마시는 민간요법을 실시한다.*입술은 건강의 바로미터김상호(규림한의원 원장)한의학에서는 입술은 위장, 혀는 심장을 관리한다고 본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윗입술은 비장, 아랫입술은 위장, 치아는 신장, 입 안은 비위와 연관되어 있는 것. 따라서 입술에 무언가가 잘 나고 겨울에 잘 트거나 갈라지는 사람은 위장, 또는 비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다. 신장의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치과 치료를 받고, 혀에 무언가가 잘 나는 사람은 심장의 열기를 떨어뜨려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마늘 : ...후 2시간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법이다. 몸의 독소나 지방 암세포를 태우려면 저녁식사 2시간 후 밤에만 물마시면 효과적이다. 보통은 매식후 2시간의 물시간에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냉한 식품(찬음식, 냉수, 열대식품,,)은 일절 금하는 것이다. 봉산물 : 봉산물은 꿀벌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가리킨다. 꿀(밤꿀이 좋음),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화분 등은 모두 온한 음식이므로 몸이 냉할 때 좋은 식품이다. 현미,현미유산균 : 현미는 냉한 음체질에 가장 좋은 매우 뜨거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지방과 암세포를 몸이 태우는데 아주 좋은 식품이다. 휘친산 등 독소를 배출하는 영양소와 온갖 미량요소들이 함유 되어 영양 보충식으로도 우리 조상들이먹어오던 쌀이므로 인체의 적응성도 매우 높다. 유산균을 첨가하여 장의 활동을 도와 다이어트나 암 등 환자의 투병에 좋은 보조식품이 된다. 현미의 엑기스만 모아 유산균을 첨가한 현미유산균은 정량을 지켜 먹을 것을강조할 만큼 태우는 효과가 강력하고 최근 현미에 대한 항암연구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다. 현미유산균이나 현미를 검색해 보면 더 깊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얼굴을 보면 내 건강상태가 보인다. 얼굴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이다. 한의학적으로 얼굴의 각 부위는 오장육부에 해당하는데이마는 폐, 턱과 귀는 콩팥, 코는 대장, 눈과 혀는 심장, 입술은 자궁을 나타낸다. 얼굴에서 몸의 건강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눈’으로 체크할 수 있는 질병 ● 눈 밑 기미 피가 탁하다 눈 밑은 다른 부위보다 피부가 얇아서 혈액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눈 주위의 검은 기미는 피가 탁하다는 얘기다. 혈액순환 장애, 비뇨기와 생식기를 관장하는 신장 기능 저하가 그 원인. 신장이 약해지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전체적인 얼굴색도 칙칙해 보인다. ● 부은 눈꺼풀 신장, 위장 장애 잠자기 전 물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눈꺼풀이 부어 있다면 체내 수분 순환에 탈이 났다는 증거다. 신장이나 위장, 심장 장애 등을 의심할 수 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다’, ‘입 안이 바짝 마른다’,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고 자주 마렵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대변이 묽고 식욕 부진이 찾아오면 위장, 발이 자주 붓는다면 심장 기능을 검진해봐야 한다. ● 아래 눈꺼풀 안쪽이 하얗다 대표적인 빈혈 증상 아래 눈꺼풀을 살짝 뒤집으면 점막에 많은 실핏줄이 보이는데, 만약 이것이 흐리다면 빈혈이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어지럽다면 틀림없이 아래 눈꺼풀 안쪽이 하얄 것이다. 여성은 월경으로 빈혈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아래 눈꺼풀을 자주 뒤집어보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눈물이 줄줄 흐른다 간장이 약하거나 자율신경 이상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 흐른다면 간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눈은 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간에 이상이 생기면 눈도 제 기능을 못한다. 운동과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눈물샘을 자극하는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도 이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 눈꺼풀에 생긴 작은 알갱이 콜레스테롤 과다 간혹 눈꺼풀에 좁쌀 같은 부스럼이 볼록 솟아오르는 때가 있다. 눈을 많이 사용해 충혈이 되었거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자극을 주었을 때,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나빠져 지방질이 뭉친 것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자연히 없어지는데, 계속 재발하면 콜레스테롤이 과다하다는 신호로 여기고 식생활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코’로 진단해보는 건강 상태 ● 콧방울을 실룩거린다 호흡 곤란 평상시 호흡할 땐 코를 움직이지 않지만, 호흡이 곤란하면 콧방울을 실룩거리게 된다. 폐렴이나 기관지염, 천식, 감기 등으로 호흡기의 기능이 약해진 사람은 콧방울을 실룩거리는 경우가 많다. 습관이 될 수 있으므로 감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처방한다. ● 코에 생긴 뾰루지 폐, 대장에 이상 폐나 폐와 함께 움직이는 대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의심해봐야 한다. 배변은 호흡과 연관이 깊은데, 이는 변을 볼 때 숨을 멈췄다 내쉬었다 하면 배변이 촉진된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관지 천식 등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변비로 고생할 확률이 높다. ● 빨간 코 간장에 혈액이 고여 있다 코끝이 항상 빨갛게 부어 있으면 과음이나 심한 운동, 혈관 운동 장애 등으로 간장에 혈액이 고여 있다는 신호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코가 울퉁불퉁하고 커진다. 간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손바닥도 빨갛다. ● 잦은 코피 위장이 약하다 미미한 자극에도 코피가 터진다면 위장을 점검해보자. 위장이 약한 사람은 영양분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근육 조직이 약하다. 잇몸에서 피가 잘 나고, 멍이 잘 생기며, 혈관도 물러 찢어지기 쉽다. 간혹 아이들이 몸에 열이 많을 때 코피를 자주 터뜨리는데, 이는 대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입’으로 파악 가능한 질환 ● 입가 뾰루지 위장이 약하다 입이나 턱에 뾰루지, 습진이 생기는 사람은 대개 위장이 허약하다. 입가의 부스럼은 위장 점막의 염증이 의심되는 징후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대개 입이 큰 사람은 위장이 튼튼하고, 입이 작은 사람은 위장이 허약하고 편식하는 경향이 있다. ● 입아귀가 잘 헌다 위염 입아귀(위아래 입술이 만나는 이음매)가 헐거나 빨갛게 짓무르면 위염이 의심된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거나 과식을 하면 위벽이 헐고, 입아귀도 헌다. 위염이 있으면 가끔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가짜 식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매운 음식도 금물. 위액이 부족해져 위장이 마르고, 열이 생겨 입아귀가 헌다. ● 창백한 입술 빈혈 입술은 입 안 점막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점막은 표피가 얇기 때문에 혈액 색깔이 그대로 비친다. 따라서 붉어야 건강한 입술. 입술이 창백하다면 혈액이 붉지 않다는 말로, 혈색소가 부족해 빈혈을 일으킨다. ● 입술이 거칠다 당뇨, 체온 상승 입술이 건조해지는 것은 체온이 상승했기 때문. 미열이 나고 손발이 뜨거워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당뇨가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 입술이 건조해지고, 만성위염으로 침이 줄어 까칠해진다. 노화나 피로로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마찬가지. 이때 입술에 침을 바르거나 손으로 뜯는 것은 금물. 주위의 살아 있는 조직도 함께 뜯겨 상태가 더 악화된다. ● 구내염 면역력 저하 입 안 점막에 생기는 염증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적신호다. 사람의 침에 들어 있는 항균물질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는데, 만약 면역력이 떨어져 항균물질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점막이 세균에 감염돼 구내염이 생긴다. 과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구내염에 걸리기 쉽다. ‘입 안’에도 청진기가 있다 ● 혀에 생긴 균열 수분 부족, 허약 체질 혀 중앙에 있는 정중선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정중선이 아닌 곳에 균열이 생겼다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젊은 사람이 혀가 갈라지고, 입 안이 자꾸 마른다면 허약 체질이거나 과로로 체력이 많이 소모된 거라고 보면 된다. ● 설태가 두껍다 위장 장애 설태(혓바닥에 끼는 하얀 찌꺼기 같은 물질)는 주로 혀 세포의 각질이 변해서 생기는 것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얀 이끼처럼 낀다. 설태가 두껍다면 위장에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나 수분이 가득 쌓여 있다는 뜻. 설태가 노란색을 띠면 열이 있다는 것이고, 보라색은 혈액순환 장애, 검은색은 몸이 냉하거나 체력이 극도로 저하돼 있음을 가리킨다. ● 충치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양치질을 하는 ‘333운동’을 잘 지키는데도 유난히 충치가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뼈가 약하다. 뼈가 약하면 충치뿐만 아니라 골다공증도 잘 생긴다. 신장이 약해도 치아 발육이 떨어져 충치균에 쉽게 점령당할 수 있다. ● 회색 치아 이가 썩고 있다 치아 색깔은 유전이나 음식물로 인한 착색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유독 회색을 띠는 치아가 있다면 안에서 썩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충치는 별다른 통증 없이 치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늦은 감이 있다. ● 빨갛게 부은 잇몸 위염, 쌓인 피로 먼저 위장의 염증이 의심된다. 이가 흔들리고 입 냄새가 심하다면 치아나 잇몸 질환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다. 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 역시 잇몸 질환을 초래한다. ‘애를 낳았더니 이가 부실해졌어’, ‘피곤하니까 이까지 덜덜거리는 것 같아’ 등의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다. ● 잇몸에서 피가 난다 위장이 약하다 잇몸 질환뿐 아니라 위장이 허약해도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날 수 있다. 위장이 약하면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져 영양이 부족해지고, 혈관이 약해져 사소한 자극으로도 출혈이 일어난다. 위장을 튼튼히 하려면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갖자. ‘머리카락’이 알려주는 건강 상태 ● 청년 탈모증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 청년 탈모증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버터나 고기 등 동물성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남성호르몬이 과다 분비돼 생식기 기능이 떨어진다. 생식기를 관장하는 곳은 신장. 따라서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되었다면 신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성적 기능이나 정자 수도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 갑작스러운 탈모 스트레스 환절기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진다고 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머리를 감을 때 등 평상시에도 눈에 띄게 빠진다면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성장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빠졌다는 것이므로 탈모를 의심해봐야 한다. 신장 기능 약화, 영양 불균형에서 오는 빈혈,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다. ●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빈혈, 노화 현상 중년으로 접어들면 머리카락이 힘없이 가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어 신장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머리카락도 탄력을 잃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인데도 머리카락이 가늘다면, 빈혈이나 신장병 여부를 검사해봐야 한다. ● 새치 신장이 약하다 새치의 양과 시기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머리가 하얗게 셌다고 해도 머릿결이 윤택하고 찰랑찰랑하다면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10~20대부터 흰머리가 눈에 띄거나, 30대에 이미 백발이 성성하다면 유전이라기보다는 신체 이변에서 오는 ‘조로(나이에 비해 빨리 늙는 것) 현상’일 수 있다. 새치는 신장이 약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얼굴을 보면 내 건강상태가 보인다. 얼굴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이다. 한의학적으로 얼굴의 각 부위는 오장육부에 해당하는데이마는 폐, 턱과 귀는 콩팥, 코는 대장, 눈과 혀는 심장, 입술은 자궁을 나타낸다. 얼굴에서 몸의 건강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눈’으로 체크할 수 있는 질병● 눈 밑 기미 피가 탁하다 눈 밑은 다른 부위보다 피부가 얇아서 혈액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눈 주위의 검은 기미는 피가 탁하다는 얘기다. 혈액순환 장애, 비뇨기와 생식기를 관장하는 신장 기능 저하가 그 원인. 신장이 약해지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전체적인 얼굴색도 칙칙해 보인다.● 부은 눈꺼풀 신장, 위장 장애 잠자기 전 물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눈꺼풀이 부어 있다면 체내 수분 순환에 탈이 났다는 증거다. 신장이나 위장, 심장 장애 등을 의심할 수 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다’, ‘입 안이 바짝 마른다’,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고 자주 마렵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대변이 묽고 식욕 부진이 찾아오면 위장, 발이 자주 붓는다면 심장 기능을 검진해봐야 한다.● 아래 눈꺼풀 안쪽이 하얗다 대표적인 빈혈 증상 아래 눈꺼풀을 살짝 뒤집으면 점막에 많은 실핏줄이 보이는데, 만약 이것이 흐리다면 빈혈이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어지럽다면 틀림없이 아래 눈꺼풀 안쪽이 하얄 것이다. 여성은 월경으로 빈혈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아래 눈꺼풀을 자주 뒤집어보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눈물이 줄줄 흐른다 간장이 약하거나 자율신경 이상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 흐른다면 간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눈은 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간에 이상이 생기면 눈도 제 기능을 못한다. 운동과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눈물샘을 자극하는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도 이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눈꺼풀에 생긴 작은 알갱이 콜레스테롤 과다 간혹 눈꺼풀에 좁쌀 같은 부스럼이 볼록 솟아오르는 때가 있다. 눈을 많이 사용해 충혈이 되었거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자극을 주었을 때,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나빠져 지방질이 뭉친 것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자연히 없어지는데, 계속 재발하면 콜레스테롤이 과다하다는 신호로 여기고 식생활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코’로 진단해보는 건강 상태● 콧방울을 실룩거린다 호흡 곤란 평상시 호흡할 땐 코를 움직이지 않지만, 호흡이 곤란하면 콧방울을 실룩거리게 된다. 폐렴이나 기관지염, 천식, 감기 등으로 호흡기의 기능이 약해진 사람은 콧방울을 실룩거리는 경우가 많다. 습관이 될 수 있으므로 감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처방한다.● 코에 생긴 뾰루지 폐, 대장에 이상 폐나 폐와 함께 움직이는 대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의심해봐야 한다. 배변은 호흡과 연관이 깊은데, 이는 변을 볼 때 숨을 멈췄다 내쉬었다 하면 배변이 촉진된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관지 천식 등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변비로 고생할 확률이 높다.● 빨간 코 간장에 혈액이 고여 있다 코끝이 항상 빨갛게 부어 있으면 과음이나 심한 운동, 혈관 운동 장애 등으로 간장에 혈액이 고여 있다는 신호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코가 울퉁불퉁하고 커진다. 간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손바닥도 빨갛다.● 잦은 코피 위장이 약하다 미미한 자극에도 코피가 터진다면 위장을 점검해보자. 위장이 약한 사람은 영양분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근육 조직이 약하다. 잇몸에서 피가 잘 나고, 멍이 잘 생기며, 혈관도 물러 찢어지기 쉽다. 간혹 아이들이 몸에 열이 많을 때 코피를 자주 터뜨리는데, 이는 대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입’으로 파악 가능한 질환● 입가 뾰루지 위장이 약하다 입이나 턱에 뾰루지, 습진이 생기는 사람은 대개 위장이 허약하다. 입가의 부스럼은 위장 점막의 염증이 의심되는 징후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대개 입이 큰 사람은 위장이 튼튼하고, 입이 작은 사람은 위장이 허약하고 편식하는 경향이 있다.● 입아귀가 잘 헌다 위염 입아귀(위아래 입술이 만나는 이음매)가 헐거나 빨갛게 짓무르면 위염이 의심된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거나 과식을 하면 위벽이 헐고, 입아귀도 헌다. 위염이 있으면 가끔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가짜 식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매운 음식도 금물. 위액이 부족해져 위장이 마르고, 열이 생겨 입아귀가 헌다.● 창백한 입술 빈혈 입술은 입 안 점막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점막은 표피가 얇기 때문에 혈액 색깔이 그대로 비친다. 따라서 붉어야 건강한 입술. 입술이 창백하다면 혈액이 붉지 않다는 말로, 혈색소가 부족해 빈혈을 일으킨다.● 입술이 거칠다 당뇨, 체온 상승 입술이 건조해지는 것은 체온이 상승했기 때문. 미열이 나고 손발이 뜨거워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당뇨가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 입술이 건조해지고, 만성위염으로 침이 줄어 까칠해진다. 노화나 피로로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마찬가지. 이때 입술에 침을 바르거나 손으로 뜯는 것은 금물. 주위의 살아 있는 조직도 함께 뜯겨 상태가 더 악화된다.● 구내염 면역력 저하 입 안 점막에 생기는 염증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적신호다. 사람의 침에 들어 있는 항균물질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는데, 만약 면역력이 떨어져 항균물질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점막이 세균에 감염돼 구내염이 생긴다. 과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구내염에 걸리기 쉽다. ‘입 안’에도 청진기가 있다● 혀에 생긴 균열 수분 부족, 허약 체질 혀 중앙에 있는 정중선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정중선이 아닌 곳에 균열이 생겼다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젊은 사람이 혀가 갈라지고, 입 안이 자꾸 마른다면 허약 체질이거나 과로로 체력이 많이 소모된 거라고 보면 된다.● 설태가 두껍다 위장 장애 설태(혓바닥에 끼는 하얀 찌꺼기 같은 물질)는 주로 혀 세포의 각질이 변해서 생기는 것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얀 이끼처럼 낀다. 설태가 두껍다면 위장에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나 수분이 가득 쌓여 있다는 뜻. 설태가 노란색을 띠면 열이 있다는 것이고, 보라색은 혈액순환 장애, 검은색은 몸이 냉하거나 체력이 극도로 저하돼 있음을 가리킨다.● 충치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양치질을 하는 ‘333운동’을 잘 지키는데도 유난히 충치가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뼈가 약하다. 뼈가 약하면 충치뿐만 아니라 골다공증도 잘 생긴다. 신장이 약해도 치아 발육이 떨어져 충치균에 쉽게 점령당할 수 있다.● 회색 치아 이가 썩고 있다 치아 색깔은 유전이나 음식물로 인한 착색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유독 회색을 띠는 치아가 있다면 안에서 썩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충치는 별다른 통증 없이 치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늦은 감이 있다.● 빨갛게 부은 잇몸 위염, 쌓인 피로 먼저 위장의 염증이 의심된다. 이가 흔들리고 입 냄새가 심하다면 치아나 잇몸 질환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다. 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 역시 잇몸 질환을 초래한다. ‘애를 낳았더니 이가 부실해졌어’, ‘피곤하니까 이까지 덜덜거리는 것 같아’ 등의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위장이 약하다 잇몸 질환뿐 아니라 위장이 허약해도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날 수 있다. 위장이 약하면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져 영양이 부족해지고, 혈관이 약해져 사소한 자극으로도 출혈이 일어난다. 위장을 튼튼히 하려면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갖자. ‘머리카락’이 알려주는 건강 상태● 청년 탈모증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 청년 탈모증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버터나 고기 등 동물성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남성호르몬이 과다 분비돼 생식기 기능이 떨어진다. 생식기를 관장하는 곳은 신장. 따라서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되었다면 신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성적 기능이나 정자 수도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갑작스러운 탈모 스트레스 환절기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진다고 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머리를 감을 때 등 평상시에도 눈에 띄게 빠진다면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성장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빠졌다는 것이므로 탈모를 의심해봐야 한다. 신장 기능 약화, 영양 불균형에서 오는 빈혈,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빈혈, 노화 현상 중년으로 접어들면 머리카락이 힘없이 가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어 신장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머리카락도 탄력을 잃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인데도 머리카락이 가늘다면, 빈혈이나 신장병 여부를 검사해봐야 한다.● 새치 신장이 약하다 새치의 양과 시기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머리가 하얗게 셌다고 해도 머릿결이 윤택하고 찰랑찰랑하다면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10~20대부터 흰머리가 눈에 띄거나, 30대에 이미 백발이 성성하다면 유전이라기보다는 신체 이변에서 오는 ‘조로(나이에 비해 빨리 늙는 것) 현상’일 수 있다. 새치는 신장이 약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건강상태 알려주는 신체의 아침신호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소음이 갑자기 커졌다면 내부 쿨러의 먼지를, 프로그램 실행이 느려지기 시작했다면 램이나 하드디스크의 부족 혹은 바이러스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자동차 역시 시동을 걸 때 나는 작은 소리나 떨림 등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어디가 고장 난 것인지 감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인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잠을 자고 있어났는데 평소와 다르게 붓거나 눈곱이 심하게 끼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이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 잠을 자는 동안 몸속의 장기들도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장기들도 함께 깨어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각 장기들이 깨어나는 아침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주의 깊게 살핀다면, 자신의 몸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아침에 나타나는 몸의 이상은 대부분 피곤하거나 생활리듬이 깨질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심각한 위험 신호일 수도 있으니 잘 살피도록 하자. 아침에 나타나는 증상별 진단Case 1.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다.아침에 유난히 잠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단순히 아침잠이 많아서라고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면, 만성피로를 의심해볼 것. 평소에 풀지 못한 피로가 누적되어 면역기능에 이상을 일으키고 이 때문에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누적된 피로 때문에 몸의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각종 균이 침입하기 좋은 상태가 되므로, 쌓인 피로는 가능한 한 빨리 수면과 휴식, 적절한 영양공급 및 규칙적인 운동으로 풀어주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Case 2. 뒷목이 뻣뻣하게 당긴다.잘 자고 일어났음에도 아침에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띵하다면 베개 높이와 잠을 자는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개를 너무 높게 베면 목 관절에 무리를 주어 목 부분이 뻣뻣하고 당기게 되며, 새우처럼 몸을 쪼그리고 자면 목 부위가 경직돼 뒷목이 뻐근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베개나 수면자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혈압을 측정해보는 것이 좋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뒷목이 뻣뻣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Case 3. 이부자리가 축축할 정도로 식은땀이 난다.성인이 흘리는 하루 평균 땀의 양은 대략 700∼900ml 정도이다. 땀은 몸에서 열을 방출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와 이불이 축축할 정도로 식은땀을 흘렸다면, 대체로 방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악몽을 꾸었을 경우. 혹은 너무 긴장하고 피로했을 때나 살이 쪘을 때에도 땀을 많이 흘린다. 주의해야 할 것은 밤에 미열이 있으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체중까지 감소될 경우인데, 이럴 때에는 폐결핵이나 드물지만, 백혈병까지 의심해볼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보는 게 좋다. Case 4.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찾는다.이럴 때에는 방이 너무 건조하거나 덥지는 않았는지, 전날 저녁을 짜게 먹지는 않았는지 먼저 체크해 본다. 만일 이런 일이 없는데도 매일 아침 갈증을 느낀다면 당뇨를 의심할 수 있다.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인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해 생기는 병으로, 목이 마르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며 많이 먹지만, 체중은 감소한다. Case 5. 눈곱이 많이 낀다.잠에서 깼을 때 눈가에 유난히 눈곱이 많이 낄 때 가장 흔한 원인은 결막염이다. 낮에는 눈을 자주 깜빡이기 때문에 눈물샘이 자극되어 눈곱이 잘 끼지 않는다. 하지만 자는 동안에는 눈물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결막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혹은 눈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안구건조증일 경우에도 눈곱이 낀다. 이밖에도 콘택트렌즈 사용자의 경우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은 렌즈에 의해 눈이 감염되어 눈곱이 끼기도 한다. 그러므로 눈곱이 많이 끼는 이유를 찾아 빨리 치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Case 6.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아침에 일어나 처음 뱉는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면 폐결핵을 의심할 수 있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 피로가 쌓였을 때는 수면 중에 흘린 코피가 목으로 넘어가 고여 있다가 아침 가래에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래에 지속적으로 피가 섞여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아침마다 피가 섞인 가래를 뱉게 될 때에는 폐암, 폐결핵 등의 폐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밖에도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등 기관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계속될 때는 병원을 찾도록 하자. Case 7. 얼굴과 손, 발이 자주 붓는다.아침의 부기는 평소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 짠 음식을 먹은 후에는 일시적으로 몸이 붓기 쉽고,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먹어도 같은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몸이 붓는 증상은 잠자는 동안 신체의 연한 부분으로 수분이 몰리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들이 걱정하듯 신장의 이상으로 인한 부종은 실제로는 드물다. 더욱이 다른 증상 없이 몸이 붓는 신장병은 거의 없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했다면 심장, 신장, 간장을 검사하고 순환계 이상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도 계속 부기가 지속된다면 되도록 음식을 싱겁게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간식이나 수분 섭취를 줄인다. Case 8. 양치할 때 헛구역질이 난다.대부분의 경우에는 양치할 때 칫솔을 너무 깊숙이 넣어 목젖을 자극해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체질적으로 비위가 약해 치약 냄새로 인해 헛구역질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때는 냄새가 강하지 않은 치약으로 바꾸면 된다. 또 헛구역질 외에 다른 증상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평소 피로를 많이 느낀다든지 황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나 콩팥 기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절에 가면 명부전 ...하나씩 있다. 흔히 절에서는 이를 두고 '소대'라고 부른다. 여러가지를 태우는 곳이다. 그러나 이 소대는 쓰레기 등을 태우는 곳이 아니다. 절에서 망자의 극락왕생을 비는 천도제를 마친 후에, 그 때 사용한 각종 번이나 망자의 옷가지, 천더제에서 사용한 각종 기물 등을 사르는 곳이다.소대의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절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모습으로 꾸민다. 대개는 벽돌을 이용하거나 황토 등을 이용해 웅장하게 꾸며 놓은 곳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그렇게 불을 많이 피우지 않는곳은 아담하게 꾸민다. 얼핏보면 아름다운 조형물과도 흡사하다. 울산 도솔암 소대의 아름다움 울산시 북구 회봉동 30번지에 소재한 도솔암. 넓지 않은 경내에는 대웅전과 삼성각, 요사 등이 자리하고 대웅전 앞에는 석탑이 자리한다. 도솔암을 들어가기 전에 이 작은 절이 색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우선 일주문인 불이문은 사람이 겨우 한 사람 비집고 들어가야 할만큼 작다. 그리고 그 우측에 새롭게 조성한 소대가 보인다.소대는 기와와 황토로 꾸몄으며 앞에는 기대석을 하나 놓았다. 아마 제상으로 사용하는 듯하다. 암기와와 숫기와를 이용해 문양을 넣은 소대. 그리고 지붕은 이층으로 만들어 맨 위에는 옹기굴뚝을 올렸다. 소대의 변신은 무죄절마다 있는 소대. 각양각색으로 꾸며진 소대는 그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조형물이 된다. 요즈음 절을 찾아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소대가 많이 눈에 띤다. '소대의 변신은 무죄'라서 일까? 조금은 답답하기만한 절을 찾아 가노라면 이렇게 작은 소대 하나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출처 : http://rja49.tistory.com/

충남 부여군 부여읍... 자리를 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중문을 두고 연이어져 있어 ㅁ 자형태의 집이다. 그러나 뒷면이 좌우로 길게 삐져나와 있어, 이런 형태를 날개집이라고 부른다. 10칸의 ㅡ 자형인 대문채 민칠식 가옥은 대문부터가 색다르다. ㅡ 자형으로 길게 뻗은 대문채는, 좌측에서 5번째 칸에 솟을대문으로 구성을 했다. 밖에서 보면 우측으로 네 칸이 광채와 대문채를 들여놓고, 좌측으로 다섯 칸을 역시 방과 광들을 마련하였다. 대문채는 一자 맞걸이 집으로 솟을대문을 만들고 양끝을 박공으로 처리했다. 대문채는 동에서 서로 길게 나열을 하였으며, 밖의 담장은 밑에는 돌로 쌓고, 위에는 기와로 문양을 넣었다. 자칫 단조로운 담장을 돌과 기와를 이용하여 멋을 내었다. 담장의 대문 쪽에는 숨어 있는 듯한 낮은 굴뚝이 있다. 현재는 한옥체험을 하느라 그랬는지, 광으로 사용하던 일부의 칸을 화장실로 꾸며 놓았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좌측에 사무실을 두었는데, 안으로는 넓은 마당이 펼쳐진다. 작지만 쓰임새 있는 사랑채 민칠식 가옥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리 작은집은 아니다. 그러나 대문을 들어서면서 정면으로 보면, 좌측으로 사랑채를 두고 그 옆에 담장을 이어 중문을 내었다. 중문을 들어서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꺾어 안으로 들어가도록 구성을 하였다. 중문의 동편에는 사랑채의 아궁이가 있으며, 안채를 들어가는 곳에 다시 중문 안문을 두었다. 이 문이 예전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것 하나서 부터가 특별한 집이다. 사랑채는 앞으로는 세 칸으로 구성을 하였다. 사랑채 내림마루 끝에는 숭정(崇禎) 87년인 1705년이라는 기명의 망와가 있어, 이 집을 처음 지은 년대가 아닌지 추측을 한다. 사랑채 앞에는 큼직한 판석으로 댓돌을 만들어서 위엄을 표현하였으며, 사랑마당에서 중문간까지도 장대석으로 쌓은 여러 단의 계단을 오르도록 하였다. 사랑채는 마름모형의 주추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새웠다. 좌측 두 칸은 방을 드리고, 동편 맨 끝 방은 누정과 같이 누마루방으로 구성을 하였다. 사랑방 앞에는 툇마루를 놓고, 사랑채 서남쪽 모퇴에는 볏광을 드렸다. 사랑의 측면은 두 칸으로 되어 있으며, 사랑채에서 안채로 들어갈 수 있는 일각문이 안채와 연결된 담장에 나 있다. 이 사랑채의 특징은 담으로 안채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 연결 선상이 단지 담장이 아니라, 방과 한데부엌 등으로 꾸며졌다는 점이다. 돌출된 안마루가 특이한 안채 중문을 들어서면 동쪽으로 꺾어서 안채를 들어가게 하였다. 안채는 왼쪽부터 부엌, 큰방, 대청, 작은방, 안마루 순으로 구성된 8칸 집으로, 오른쪽에 돌출하여 덧붙여진 안마루가 특이하다. 사랑채는 광과 중문간, 부엌, 사랑방, 마루로 배치하였는데, 안채와 비슷한 구조기법을 보이고 있지만 안채보다 높게 지어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안채의 구성은 사랑채를 제하고 나면 ㄷ 자 형태이다. 동편으로는 사랑채와 맞물리는 일각문이 있고, 일직선상에 놓인 안방의 뒤편으로는 담장을 쌓아 보호를 한 날개채가 자리하고 있다. 이 집을 날개집이라고 부르는 연유이다. 서쪽 끝에 놓인 부엌은 앞이 개방되어 있으며, 중문채와 구별을 하기 위해 담장에 일각문을 내었다. 그 앞으로는 방을 드렸는데, 이곳은 중문채를 사용하는 여인들의 거처로 보인다. 안채와 중문채가 접해지는 부분에는 다시 일각문을 두어 서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ㅁ 자형태의 구조를 갖고 사랑채와 중문채, 안채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그 구분을 일각문으로 했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런 형태의 집은 대개 영남지방의 양반가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이다. 그러나 충청지방의 집에서는 매우 드문 집의 구조이기 때문에, 민칠식 가옥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하겠다. 고택답사를 하다가 이렇게 보존이 잘되고, 특이한 집을 만나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고 보면 나도 이제는 집을 보는 안목이 조금은 생긴 듯하다. 출처 : http://rja49.tistory.com/

여주군 여주읍 능현... 못했다는 조성문 여주문화원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황후가 태어날 만한 기가 응집된 곳 명성왕후 생가를 돌아보다가 보니 특이한 점이 있다. 생가는 솟을대문을 중심으로 양편에 행랑채와 곳간, 측간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솟을대문 안으로는 사랑채가 있고, 사랑채는 중문에 연결되어 대청과 방으로 연결된다. 헛간을 두고 꺾여 중문채를 두었다. 중문과 사랑채, 중문채가 한 건물로 이어져 배치가 되었다. 안채는 ㄱ 자 형으로 부엌과 안방, 대청, 건넌방, 곳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안채와 중문채 사이에 일각문을 두어 별당채로 들어가게 되어있다. 명성황후 생가를 출입구는 솟을대문이다. 솟을대문을 들어가면 중문 곁에 붙은 사랑채의 마루가 된다. 일직선상에 놓인 대청은 솟을대문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집 주위를 두른 담장이 바람을 막는 것을 피해, 솟을대문과 마루를 일직선상에 놓아 바람이 맞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랑채는 마루와 방으로 연결이 되며 마루에 안으로 문을 내어 바람이 안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중문은 사랑채의 마루에 붙어 있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좌측으로 조금 비켜나 있다. 이 중문 안에 방과 헛간은 청지기가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안채의 부엌과 안방이 일렬로 배열이 되어있다. 안채는 중문을 들어가 방과 헛간, 부엌을 지난 후 ㄱ 자로 꺾여 있으며 대청과 건넌방, 곳간으로 마련되었다. 문제는 바로 이 건넌방이다. 대청을 지난 건넌방은 안채의 대청보다 높은 마루가 앞에 있다. 그리고 그 마루 밑에서 불을 때는 아궁이가 있다. 이 건넌방은 솟을대문과 샤랑채의 마루, 그리고 건넌방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 집 뒤가 낮은 구릉인 명성황후 생가는 기(氣)가 이곳에 집결되는 형상이다. 솟을대문을 통한 바람이 사랑채를 마루문을 지나 이곳에서 아궁이로 들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밖에서 들어온 기가 모이는 곳이다. 이곳 마루 밑에 아궁이는 무엇일까? 이 아궁이는 솟을대문을 통해서 들어온 기는 불로 부풀리고, 액은 태워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에서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후일 황후라는 위치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한 요인이 바로 이 기가 모이도록 지은 집안의 구조 때문이었을 것이란 생각이다. 좁은 대지를 최대한 활용한 기능성 명성황후 생가는 대지가 그리 넓지 않다. 원래는 숙종의 장인이며 인현황후의 아버지인 민유중의 묘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어진 집이라고 한다. 안채만 남아있던 이 집을 1995년 주춧돌을 근거로 사랑채와 행랑채, 별당을 복원하였다. 묘막으로 지어진 집이라고는 해도 생가는 조선 중기의 살림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갖출 것은 다 갖춘 집이지만 넓은 대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집의 구조는 조금은 답답한 면도 있으나, 그런 점이 오히려 푸근한 느낌이 들게 한다. 사랑채와 중문채를 이어서 구성한 점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반가의 집과 같이 집을 띄엄띄엄 지은 것이 아니고, 오밀조밀하니 붙여지었다. 앞으로 펼쳐지는 평지와 작은 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뒤편에 있는 구릉에 막히는 곳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형태의 집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었을 것이란 생각이다. 여유를 보이는 별당채 안채와 사랑채의 담장이 이어지는 곳에 일각문을 통해 별당채로 들어갈 수가 있다. 별당채는 명성황후가 8세가 될 때까지 살던 곳이다. 별당채는 안채와 사랑채보다도 넓은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곳을 드나드는 문은 행랑채와 사랑채의 담에 연결한 일각문과, 안채에서 드나들 수 있는 일각문이 있다. 그런데 행랑채와 사랑채의 담장에 연결된 일각문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다. 별당채는 안채보다도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다. 그런데 행랑채의 끝에 있는 초가로 만들어진 측간 곁에 별당채로 들어가는 일각문을 내었다는 것은, 우리 전통가옥의 구조상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별당채는 초가로 지어졌다. 이 별당채도 1995년 복원이 되었다. 별당채는 매우 간결하게 꾸며져 있다. 별당채는 정면 세 칸으로 좌측의 한 칸은 방으로, 우측의 두 칸은 대청으로 꾸몄다. 방과 대청의 앞으로는 길게 툇마루를 놓았다. 대청의 문은 들어 올리게 되어있어 여름이면 시원하고, 추운 계절에는 문을 닫아 보온을 하였다. 대청의 뒤는 판자문으로 막았는데, 대청 끝 우측 벽을 창호를 내어 멋을 더했다. 어린 소녀가 이곳에서 자라, 한 나라를 뒤흔들만한 역사의 중심에 서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굴뚝이 없는 거북등 연도와 부엌의 비밀 안채의 뒤로 돌아가면 이상한 점이 있다. 연도는 있는데 굴뚝이 없다.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굴뚝이 없다. 대신 거북이가 웅크리고 앉은 듯 한 연도가 있다. 안채는 옛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었다고 하니, 아마 이 집은 굴뚝을 세우지 않고 연도를 뺀 듯하다. 그 모습이 재미있다. 우연히 이 집을 복원할 때 일을 맡아했다는 사람을 만났다. 이야기를 하다가보니 복원을 할 때 안채의 부엌바닥을 조금 고쳤다는 것이다. 어째 옛 모습 그대로였다면 조금은 더 깊어야 할 부엌바닥이다. 그리고 우리의 부엌바닥은 조개무덤이 생긴다.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조개를 엎어놓은 듯한 형태로 바뀐다. 이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다. 예전 어머니들은 이 조개무덤이 복이라고 하셨다. 많은 집들이 보수를 하면서 이런 조개무덤이 사라졌다. 부엌이 깊어야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방에 불을 때고 음식을 조리하려면 부뚜막이 있어야 하고, 그 부뚜막의 아궁이에서 불을 때서 방을 데우게 만든다. 그러려면 부엌의 아궁이가 깊어야 불길이 위로 잘 솟아 방이 빨리 뜨듯해진다. 아마 바닥 정리를 하면서 조금 돋은 듯 하다. 고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옥의 이야기는 그래서 재미있다. 출처 : http://rja49.tistory.com/

여주군 대신면 보통...을 주추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다. 잘 다듬어진 석재와 누마루를 놓은 형태. 그리고 처마 등을 살펴보면 한양에서 집을 짓던 경장(京匠) 등을 데려다가 지었음을 알 수 있다.해시계가 왜 여기 있을까? 김영구 가옥의 안채로 들어가면 사랑채 뒤에 붙은 높은 굴뚝이 있다. 그 굴뚝 앞에는 문화재 안내판이 서 있고, 경기도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된 해시계가 있다. 별 장식이 없이 화강암으로 만든 이 해시계는 높이 0.76m에, 위 평면의 넓이는 25cm 정도가 된다. 가운데는 깊이 1cm 정도의 구멍 흔적이 있다. 아마 이곳에 나무 같은 것을 꽂아, 태양의 일주운동에 따라 그 그림자로 시간을 쟀을 것이다.이 해시계에는 명문이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읽을 수가 없다. 이 해시계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조선 세종 16년인 1434년 세종의 명에 의해 장영실이 해시계를 만들어, 흠경각에 처음으로 설치를 하였다. 그리고 서울 혜정교와 종묘 앞에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집에 있는 해시계는 언제 제작된 것일까? 명문이 없어 제작 년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아쉽다. 다만 이 집을 지었다는 조석우는 고종 때 판서를 지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해시계도 당시에 이집에 두었을 것으로 추정한다.사랑채에 달아낸 누정이 압권김영구 가옥의 사랑채 서쪽에는 누정이 붙어있다. 마루로 놓인 이 누정은 김영구 가옥의 모습을 뛰어나게 만든다. 누정은 밑을 잘 다듬은 돌로 주추를 하고 그 위에 정자를 올렸다. 정자는 삼면이 모두 들창으로 되어있으며, ㅡ 자로 되어있는 사랑채에서 앞으로 돌출이 되어있다. 그 누구도 집안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도록 구조가 되어있다. 대문을 열어놓아도 안을 들여다보기가 힘든 것도 이집의 특징이다. 대문 안은 바로 서쪽날개채의 벽이기 때문이다. 대문을 열어도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개채의 벽이 바람을 막는 방풍의 역할도 하고 있다. 둘러볼수록 빠져드는 집이다.김영구 가옥의 또 하나 특징은 바로 작은 사랑채다. 사랑채와 동편 날개채가 붙은 일각문 옆으로 사랑채와 같이 ㅡ 자로 붙어있는 작은 사랑채. 이곳도 방과 마루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 작은 사랑채도 사랑채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사람들을 접대하기도 하고, 이곳에서 손들이 묵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점으로 보아 이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작은 사랑채도 일각문을 열어야 안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어, 결국 이집은 밖에서 외부인들이 안으로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다. 행랑채 앞에 솟을대문이 있었다고 하는 여주 김영구 가옥.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밖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열린 대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집 하나하나에 참으로 대단한 정성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출처 : http://rja49.tistory.com/
한옥에 담긴 배려의 마음 그 기본에는 빌림, 어울림, 되돌림의 태도가 있다 자연과의 관계를 중시하다 삶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공간이었던 옛집의 핵심적인 요소에는 자연과의 관계도 포함되었다. 옛집에는 다양한 형태로 자연과의 관계 맺음이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옛집에 반영되어있는 자연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빌림, 어울림, 되돌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빌림은 자연으로부터 터를 빌린다는 것이다. 어울림은 일생 동안 자연과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다. 되돌림은 삶의 필요를 충족한 다음에는 다시 자연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비롯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옛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그 첫 절차는 지신에게 땅을 빌려서 집을 짓는다고 고하는 텃제이다. 텃제는 개기제開基祭라고도 하는데 땅을 파내고 집을 세우기 전에 땅의 주인인 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때 지신에게 ‘집 지을 땅을 빌려 주어 고맙다’는 제를 지낸다. 자신이 소유한 터에 집을 지으면서 ‘빌린다’는 표현을 쓴다. 땅의 진정한 주인은 대지의 신이고 인간은 잠시 그 땅을 빌려서 사는 유한한 존재라는 생각이다. 빌린 땅이기에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최대한 보전하려고 하였다. 요즘 같으면 땅을 깎고 메우고 높여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지만 옛 집과 마을들은 원래의 땅 생긴 모양에 맞추어 지어져 있다. 안동 하회마을의 집들은 둥근 원추 모양의 땅 생김을 따라서 각기 앉은 방향이 달라서 남향에서 북향까지 다양한 방향을 보이고 있다. 지형을 따라서 흐르는 물줄기를 바꾸는 것도 꺼려해서 때로는 집마당을 휘돌아 나가는 물줄기를 그대로 살리기도 하고(아산 외암마을 송화댁) 담장 아래로 물줄기가 흘러가기도 한다(담양 소쇄원). 이 또한 자연을 더 근본으로 여기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배려의 결과이다. 집을 짓는 재료들도 자연의 보전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서 선택하고 가공하였다. 흙과 돌과 풀과 나무들이 옛집의 주 재료들이다. 그래서 집은 주변의 자연과 어울린 모양새다. 오래되어 집이 무너지고 재료들이 썩고 흩어지면 모든 것이 원래의 자연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된다. 빌린 땅을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리려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재료를 가공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배려가 작용하였다.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형태를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였다. 우리 옛집이 가진 두드러지지 않는 부드러운 아름다움은 이와 같은 자연에 대한 배려가 만들어낸 자연과의 어울림의 결과인 것이다. 자연재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가공해야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가공하려고 노력했다. 생긴 그대로 휘어진 나무를 가져다가 기둥이나 대들보 등의 부재로 삼았다. 주춧돌도 자연석 그대로를 사용해서 때로는 기둥의 길이가 각기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내소사 봉래루를 떠받치고 있는 주추와 기둥은 자연을 배려하는 재료의 선택과 가공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예이다. 봉래루를 받치고 있는 주추와 기둥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다. 낮았다가 높아지고 다시 낮아지는 돌의 높이와 그에 맞추어 잘라낸 기둥의 길이들이 획일적이지 않은 리듬을 만들어낸다. 모양과 크기가 각기 다른 자연석을 가져다 주춧돌로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의 높이를 돌의 크기에 맞추어 서로 다르게 가공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흔적을 남기면서 자연과 어울린 건물을 만들어 사용하고자 한 세심한 배려를 읽을 수 있다. 자연석 위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양에 따라 기둥의 아랫부분을 깎아내야 한다. 이러한 가공의 방법을 그렝이질이라고 한다. 매우 까다롭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 방법인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기둥이 흔들리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고려가 작용한 면이 있다. 이와 함께 자연에 대한 배려가 작용하였다. 나무는 세월이 지나서 썩으면 흔적 없 이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돌은 한 번 깎아내면 절대로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연으로 되돌릴 때를 생각해서 가공의 방법과 대상의 우선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에 대한 배려와 삼가는 마음은 옛집과 마을들에 골고루 배어 있다. 안동 하회마을이나 아산 외암마을 등 지금까지 보존된 옛 마을들에서 그와 같은 자연과의 어울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마을들의 지붕과 지붕들이 연이어 만들어낸 곡선은 주변산들의 윤곽과 닮은 모양이다. 자연의 원래 모양을 훼손하지 않고 그 안에 조화롭게 안겨들고자 했던 배려가 두드러지지 않고 닮은 모양새를 만들어낸 것이다. 공동체적 삶을 배려하다 자연에 대한 배려의 마음은 인간과의 관계에도 반영되었다. 그래서 옛집에는 곳곳에 인간에 대한 배려, 공동체적 삶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 흔히 조선시대를 남녀유별의 사회로 보고 여성들은 집안에 갇혀서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양반가의 경우는 남녀유별이 엄격해서 여성들의 공간이 매우 폐쇄적으로 닫힌 구조였다고 이해한다. 사실 여성공간은 남성들의 공간에 비해 외부에 대해 폐쇄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인과의 관계에 한정된 경우가 더 많다. 한 집 사람들끼리는 남녀의 유별보다는 남녀간의 어울림을 배려하고 또 여성들을 배려한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남녀유별을 유지하면서도 집 안에서는 비교적 편리하게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다. 외암마을 참판댁의 경우에서도 그와 같은 여성에 대한 배려 장치를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참판댁의 안채는 사랑채의 뒤에 위치해서 바깥사람들의 눈길에서 거의 완전하게 차단되어 있다. 대문간에서 집 안을 들여다보면 안채는 사랑채에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사랑채의 측면에 위치한 안채 출입문도 대문간에서는 보이지 않게되어 있었다. 그러면서도 안채 사람들이 바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작은 문을 안채 출입문 곁에 따로 마련하여 출입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한층 더 여성을 배려한 장치는 협소한 안채에서의 살림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텃밭(참판댁에서는 이 텃밭을 남새밭으로 부른다.)과의 출입 통로이다. 참판댁에서는 이곳을 텃밭으로 사용하지만 많은 경우에 안채의 뒤뜰은 텃밭과 더불어 아름다운 수목을 심어서 자연을 접할 수 있 게 하였다. 이를 통해서 외부출입이 제한된 삶의 답답함과 무료함을 달랠 수 있도록 하였다. 참판댁의 텃밭 출입 통로는 사랑채의 왼쪽 측면에 작은 쪽문으로 마련되어 있다. 사랑채의 옆이 바로 텃밭이기 때문에 이 쪽문을 통해서 바로 텃밭으로 출입할수 있다. 더구나 이 텃밭은 큰집과 작은집 두 집으로 이루어진 참판댁의 작은집 안채 쪽문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큰집의 쪽문과 텃밭, 작은집의 안채는 외부인들의 눈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여성들이 공유하고 활용하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결국 남녀유별의 질서를 따르면서도 집안사람들끼리 서로 편리하게 교류하고 텃밭에서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배려를 여기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다. 안동하회의 양진당養眞堂이나 충효당忠孝堂에도 외부인들은 쉽게 찾을 수 없는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출입 통로가 있다. 이들은 모두 남녀유별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가족들 간의 실제적인 어울림과 소통을 배려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옛집에는 인간과 자연의 어울림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울림을 위한 배려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그 근원은 자연과의 어울림의 마음이다. 자연을 전체로서 조화로운 질서로 생각하고 인간 역시 그 안에 포함된 존재로서 파악하였다. 전체 안에서 자신을 보는 태도와 커다란 질서 안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파악하는 자세가 한국인의 옛 삶의 근본 질서였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역시 그와 같은 어울림의 틀 안에서 고려되었다. 집에 반영된 다양한 배려들은 그와 같은 어울림에 기초한 것이었다. 집에 반영된 어울림의 질서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이고 체험적으로 습관화되는 어울림의 교육으로 연결되었다. 그 어울림의 마음이 한국인의 삶을 관통하는 배려의 근원이다. 낮은 울타리를 두르고 이웃과 더불어 살며 좁은 집 안에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사는 삶의 바탕에는 그와 같은 배려와 어울림의 마음이 깔려 있었다. ※ 참고문헌『빌림 어울림 되돌림』, 윤재흥, 민속원, 2015 출처: 문화재청 글. 윤재흥 (나사렛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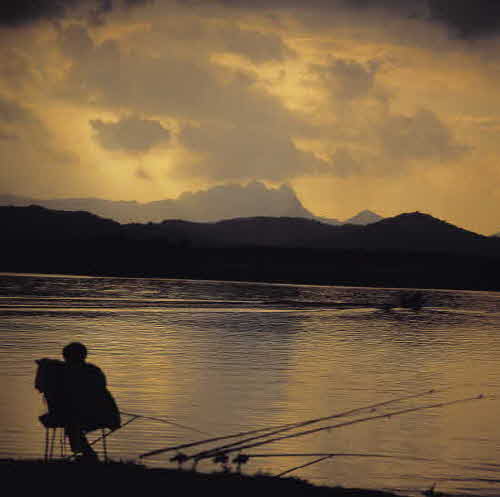
... 노인이 점잖은 말로 거절하자 문왕이 다시 말했어요. "선왕이신 태공께서 돌아가시기 전 내게 말씀하시길, 후에 반드시 성인 이 찾아와 그의 힘으로 주나라가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그 성 인임에 틀림없소. 부디 사양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 주시기 바라오." 그제야 노인은 낚싯대를 접고 문왕을 따라 나섰어요. 문왕은 그를 수레에 태워 궁궐로 모신 후, 그를 '태공이 바라던 성인'이 란 뜻으로 '태공망'이라 불렀어요. 이분이 바로 주나라 문왕을 도와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푼 강태공이지요. 요즘 낚시광을 가리켜 '강태공'이라 일컫는 것을 강테공이 문왕을 만나기 전까지 늘 강가에 나가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거지요.

...이 맨손으로 일어났겠어 요? 하지만 일본놈들은 아주 잔인했어요. 맨손에 태극기 하나만 들고 만세 를 부르는 사람들을 마구 총으로 쏘고 칼로 찔렀지요. 어린아이나 노인, 아 낙네라고 봐 주는 것도 없었어요.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잡아 갔으니까요.... 그 ㄸ 내 친구 하나도 일본놈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나는 다행히 팔만 하 나 잃고 살아났는데 죽은 사람들한테는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 때 이웃집 얌체씨가 머리를 긁적이며 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저어.... 여기 독립 유공자를 조사하러 나온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얌체씨는 쪼르르 다가와 조사 나온 공무원 곁에 앉았어요. "아, 사실은 저도 3.1운동 때 독립 만세를 부른 사람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도 물어 보세요. 그 당시에...." 얌체씨는 얘기를 하면서 애국씨의 눈치를 흘끔흘끔 보았어요. 사실 얌체 씨는 만세 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다못한 애국씨가 따 끔하게 한 마디 했어요. "여보게, 자네가 만세를 불렀다는 소리 처음 듣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할 때 자네만 혼자 빠지지 않았나?" "아니, 무슨 소린가. 나도 그 당시 독립 만세 운동에 참가했네." "그게 정말인가? 그런데, 왜 본 기억이 없지?" "우리 집 뒷간(화장실) 있지 않나. 그 안에 들어가 목이 터져라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네." 옆에서 듣고 있던 공무원은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렇게 했다면 그건 '찻잔 속의 태풍'이군요. 그건 독립 운동으로 보기가 어렵겠는데요." 얌체씨는 결국 창피만 당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찻잔 속의 태풍'이란 아주 큰일 같지만 넓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를 비유한 말이지요.

성교(性交)에 의하지 않고 어떤 사물에 감응됨으로써 잉태하여 아기를 분만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여러 민족 사이에 널리 전승되어 왔는데, 그 유형으로는 ① 암석 ·수목 등에 접촉하여 잉태하는 유형, ② 몸에 햇빛을 받고 잉태하는 유형, ③ 해 ·달 ·별 ·번개 등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하는 유형, ④ 알 또는 어떤 것을 삼키고 잉태하는 유형, ⑤ 어떤 것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하는 유형, ⑥ 여러 가지 정기(精氣)를 감지(感知)하고 잉태하는 유형 등이 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朱蒙)의 잉태설화와 박혁거세의 난생(卵生)설화, 중국 여러 제왕(帝王)들의 탄생 설화, 그리스 전설의 영웅 페르세우스의 설화, 멕시코 전설의 군신(軍神) 설화 등 매우 많다. 감생설화는 단순한 공상의 산물이 아니고 저층문화민족(低層文化民族)이 가진 여러 가지의 실제적인 관찰적상상 ·신앙 등이 그 원인이 된다. E.S.하틀란드가 주장한 것처럼, 낮은 문명기에 있는 민족은 성교에 의한 자연잉태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성(性)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부족하였기 때문에 잉태시(孕胎時)의 주위의 사물이나 현상에 그 원인을 구하였거나, 또는 아기를 얻으려는 염원에서 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주법(呪法)의 자료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감생설화의 원초기(原初期)에는 보통 여자들 모두에게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것이 점차 제왕이나 영웅 등에 한정되어 전해지게 된 것은 감생(感生)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부터 제왕이나 영웅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탁월한 존재임을 내세우기 위하여 이용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출처 : 엔사이버동아세계대백과사전) 희망의 문학 감생설화(感生說話) 남녀의 결합이 아닌 특이한 계기나 성스러운 물체의 정기를 받아 잉태하게 되었다는 설화. 비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신화나 인물전설에 주로 나타난다. 잉태의 계기가 되는 행위나 상황을 신령스러운 존재의 계시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아, 이러한 비정상적인 잉태 과정은 태어나는 인물에게 신성성을 부여하는 상징적 기능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유사≫·≪삼국사기≫·≪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과 여러 가지 구전설화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다.감생설화는 그 행위나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하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햇빛을 받고 잉태했다는 모티프(motif)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 제1 고구려조에 금와왕(金蛙王)에 의해 방에 갇힌 유화(柳花)가 햇빛을 받고 임신했다는 주몽신화가 대표적이다.가야산 여신인 정견모주(正見母主)의 목욕 장면을 훔쳐본, 하늘의 남신 이비가지(夷毗訶之)가 정견모주의 몸에 햇빛을 비추어 그녀로 하여금 뇌질주일(惱窒朱日: 대가야의 시조)과 뇌질청예(惱窒靑裔; 금관 가야의 시조, 곧 수로왕)를 낳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국에서는 햇빛 외에도 달빛·별빛·무지갯빛 등을 받아 잉태하였다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르세우스(Perseus)는 어머니 다나에(Dana○)가 방 안에서 햇빛을 받고 잉태했다 하여 주몽신화와 비슷하다. 물을 마시고 잉태했다는 모티프도 범세계적이다. ≪임영지 臨瀛誌≫에는 어느 양갓집 처녀가 물을 길으러 갔다가 우물에 비친 해를 보고 그 물을 마신 뒤에 범일(梵日)을 잉태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 경우에 물은 생생력(生生力)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해가 있었다는 것은 건국신화에서와 같은 고귀한 혈통을 나타내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범일이 죽어서 대관령 성황신(大關嶺城隍神)이 되었다는 점도 이와 관련된다. 즉, 범일은 나라신보다는 격이 낮은 마을신이므로 바로 햇빛을 받지 않고 물에 비친 해에 의하여 잉태되었다고 한 것 같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보통의 물이 아닌 마법이 걸린 물이거나, 신령스러운 물이 보통이다. 또한, 오줌을 마시고 잉태하였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줌의 생생력을 상징화한 것이다. 과일 따위를 먹고 잉태했다는 모티프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세종실록≫지리지 영암조(靈巖條)에는 최 씨의 딸이 일 척이 넘는 오이를 먹고 도선(道詵)을 잉태했다고 하고, ≪조선읍지≫ 화순조(和順條)에는 향리 배 씨의 딸이 우물에 있는 오이를 건져 먹고 진각국사(眞覺國師)를 잉태했다고 한다. 구전설화에서는 무학(無學)도 그 어머니가 오이를 먹고 잉태했다고 하며, 오이 대신 복숭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과일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남성의 정액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알도 과일과 비슷한 상징적 조건을 갖추어서 흔히 등장하는데, 사마천(司馬遷)의 ≪사기 史記≫ 열전에 실린 은나라 설(楔)의 어머니가 목욕하다 현조(玄鳥)의 알을 먹고 설을 잉태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먹는 것 외에 꽃·돌·고기·손가락뼈·피 및 여자의 심장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들도 역시 생명의 원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이 투영되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꿈을 꾸고 잉태했다는 모티프는 주로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다. ≪삼국사기≫나 ≪동국여지승람≫에는 해(金怡의 경우)·별(김유신의 경우)·무지개(金方慶의 경우)·용(고려 혜종의 경우) 등의 꿈을 꾸고 잉태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중국에서도 여러 제왕의 출생설화에 비슷한 양상으로 등장한다. 기원을 하여서 잉태했다는 모티프는 우리 나라에서만 나타나는데, 특히 무속신화에 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고유한 성격이 거듭 확인된다. 〈바리공주〉의 오구대왕 부부, 〈세경본풀이〉의 세경할미, 〈칠성본풀이〉의 칠성님 등은 모두 백일기도를 드리고서야 비로소 자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신령스러운 존재를 자신의 노력으로 감동시켜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서민층의 민속신앙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구소설에서 치성을 드리고 나이가 들어 늦게 자식을 얻는다는 설정과도 관련된다. 이 밖에도 별·천둥·바람·냄새와 같은 여러 가지 정기를 받아서 잉태했다는 모티프나, 다른 존재의 눈길을 받거나 발자국을 밟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교섭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모티프는 우리 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다. 다양한 모티프로 구현되는 감생설화는 공통적으로 생명의 근원에 대한 원초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티프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위대한 업적이나 신이한 행적을 남긴 사람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은 한 집단이 공동으로 칭송하고, 기억할 만한 인물에게 그 집단이 소유한 문화적 체계를 바탕으로 신성함을 부여하는 데서 감생설화가 창출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결국, 감생설화는 단순히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의 산물이 아닌, 나름대로의 깊은 역사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사고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우리 나라의 경우 감생설화는 처음에 나라신·건국시조·왕 등에 적용되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마을신·가문시조·이인·고승 등에도 적용되었고, 그에 따라 햇빛에서 해가 비친 물· 과일· 꿈 등으로 신성성의 정도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국신화로부터 이어져 오는 감생설화의 전통은 조선 후기에 성행한 영웅소설의 창작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거북이는 정말 예로...아 온다는 뜻도 있다고 하네요. 9. 거북이를 타고 있는 꿈 이 꿈은 태몽으로 알려져 있는데 훗날 큰 인물이 되는 아이를 얻게 되는 것을 암시 하고 있는 꿈이에요. 10. 거북이 알 낳는 꿈 알을 낳거나 혹은 잡아서 방으로 들어오는 꿈은 아들을 낳는 꿈이라고 해요. 11. 거북이가 무는 꿈 이 꿈은 길몽으로 큰 행운이 찾아 온다는 것을 의미 하고 큰 재물을 얻게 되는 꿈이라고 해요. 12. 거북이가 옥구슬을 토하는 꿈 생각 하지도 않았던 큰 행운이 찾아오게 될 것을 뜻한다고 하네요. 13. 거북이가 화장실 안에 들어 있는 꿈 큰 재물이 가정으로 찾아 오게 된다고 해요. 14. 길에서 기북이는 잡는 거북이꿈 생각 하지도 않았던 행운을 얻게 된다고 하네요. 15. 거북이를 죽이는 꿈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에요. 16. 거북이 죽는 꿈 이는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는 흉몽인데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꿈이에용. 질병에 걸리게 될것을 암시 하니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하네요. 출처: 에비츄우 http://youngeun01.tistory.com

뱀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엄마가 태몽으로 백사를 잡는 꿈을 꾸었다고 해요. 좋은 꿈을 꾸면 꿈에서 깨었을때 이건 좋은 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뱀 꿈은 길몽도 있고 흉몽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그 중 오늘은 뱀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1. 백사 꿈 뱀꿈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꿈이에요. 정말 생각치도 못한 곳에서 생각치도 못한 타이밍에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꿈이라고 하네요. 2. 백사가 나를 쫓아오는꿈 가정은 더욱 더 화목해지고 회사의 경우는 자신의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풀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꿈이라고 해요. 3. 땅에서 황금색 구렁이가 나오는꿈 이 꿈은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따르는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몽으로도 해몽이 되는데 태몽으로는 이 꿈을 꾸고 태어난 아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도 하네요. 4. 꽈리를 틀고 있는 뱀을 보는꿈 이 꿈은 여자아이가 태어날 대표적인 태몽이라고 하네요. 5. 뱀을 만지는꿈 뱀의 색에 따라 조금씩 해몽이 달라지는데 특히 만진 뱀이 푸른쪽 계열의 뱀이면 재물운이 크게 따라주는 좋은 꿈이라고 해요. 6. 뱀에게 물리는꿈 이 꿈은 결혼을 아직 안하신 분에게는 조만간 천생연분을 만나는 꿈이고. 큰 재물운이 따르는 좋은 길몽 중에 하나라고 해요. 하지만 독사에서 물리는 꿈은 뱀 꿈 중에 가장 좋지 않은 흉몽이지만 가족이 물릴 것을 대신해서 자신이 물린다면 가족의 평화와 안정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7. 뱀한테 쫓기는꿈 주위의 사람들의 입에 안 좋은 의미로 오르내리게 될 일이 생기거나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 꿈이라고 해요. 8. 많은 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꿈 이 꿈은 부정한 일이나 비밀등이 탄로나 가정의 행복, 화목이 한 순간에 깨질 수가 있는 꿈이라고 해요. 9. 큰 뱀이 사람으로 변하는꿈 이미 시작한 일 중 자신에게 맞지 않고 자신의 능력밖의 일이라고 판단하여 그만 두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될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해요. 10. 뱀이 칼을 먹는꿈 지금까지의 노력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권리, 명예를 얻을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11. 집에 있던 뱀이 밖으로 나가는꿈 이 꿈은 재물이 나감을 의미하는 꿈으로 사업을 한다면 좀 주의를 해야 할듯 하네요. 12. 방 천장에서 구렁이가 떨어져 죽는꿈 이 꿈은 아주 안 좋은 꿈으로 가족 중 누군가에게 큰 병이나 큰 사고가 찾아 올 수가 있는 꿈이라고 해요. 13. 뱀이 혀를 날름날름 대는꿈 이 꿈은 자신의 입단속을 제대로 해야하는 꿈으로 무심코 했던 말들이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와 구설수에 오르는등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는 꿈으로 조심해야 하는 흉몽 중에 하나에요. 14. 뿔이있는 뱀을 잡은꿈 이 꿈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아주 좋은 꿈으로 현재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15. 뱀이 산으로 기어서 올라가는꿈 이 꿈은 아주 귀찮고 시끄러운 사건에 휘말려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시달릴수 있는 꿈이라고 해요. 16. 뱀이 침대로 들어오는꿈 이 꿈은 태몽중의 하나로 뱀이 침대로 와 자신의 몸을 감싼다면 이는 임신을 하는 꿈이라고 하네요. 17. 거울 속에 비단구렁이가 비치는꿈 조만간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꿈이에요. 18. 구렁이가 허물을 벗는꿈 이 꿈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까지의 과거와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으로 재시작을 하게 되는 꿈이라고 하네요. 19. 구렁이가 다리를 조여와 고통스러운꿈 이 꿈도 역시 태몽이라고 해요. 20. 뱀과 키스하는꿈 건강과 관련된 매우 안좋은 흉몽이라고 해요. 이는 사고나 혹은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다고 하니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21. 뱀과 성교하는꿈 아주 좋은 태몽이라고 해요. 이 꿈을 꾸고 태어나는 아이는 권력 그리고 특히 명예운이 따르는 그런 태몽이라고 하네요. 22. 뱀이 물속이나 수풀에 있는 것을 보는꿈 이 꿈은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그 기회를 잡아 크게 성공을 하는 꿈이라고 해요. 출처: 에비츄우 http://youngeun01.tistory.com

차량점검의 중요성은...서 누구든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부분별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 타이어, 전조등 등 간단한 점검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세요!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시각을 통한 점검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차량을 살펴보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타이어에 공기가 부족한 경우이다. 구멍이 나 아예 바람이 빠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바퀴에 비해 바람이 많이 빠져있는 타이어는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엔 지체 말고 타이어에 공기를 충전해 줘야 한다. 공기압이 낮으면 마찰지수가 높아져 연료 소모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엔진의 무게로 인해 뒷바퀴보다는 앞 바퀴의 공기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 바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자!전조등 상태도 눈으로 쉽게 점검이 가능하다. 야간운전 시, 평소보다 전조등이 어둡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해 보자. 전조등은 야간운전 시 운전자의 시야를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므로, 수명이 다한 전구는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안전을 위하는 지름길이다. 만약 새 전구를 끼웠는데도 운전 도중 전조등이 어두워진다면 알터네이터가 차량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카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겨울만 되면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난다?겨울철, 시동을 켜고 얼마 안되어 브레이크를 밟으면 “끼이익”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모닝이펙트(morning effect, ME) 현상일 확률이 높다. 날씨가 추워지면 차량 유리에 성에가 끼듯 브레이크 디스크에도 수분이 맺히게 된다. 이 수분이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의 철 성분과 산화반응을 일으켜 녹이 생기게 되는데, 아침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녹과 철이 상대부분을 긁어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몇 회 제동을 걸다 보면 디스크 온도가 올라가고 녹이 떨어져나가면서 소음은 없어지게 된다. 이처럼 아침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모닝이펙트라고 부른다.만약 장시간 주행을 했는데도 소리가 점점 커진다면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이 마모됐을 확률이 높다. 이런 소음이 지속적으로 난다면 브레이크 제품을 교환하라는 신호이며, 이 교체시기를 놓치면 고가의 브레이크 디스크까지 바꿔야 할 수 있으니 신속한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하다.■ 서스펜션! 손으로 눌러보고 점검하세요!골목길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을 많이 지나게 된다. 이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부품이 바로 서스펜션이다. 이 부품에 이상이 생기면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거나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소음이 발생하기도 한다.서스펜션의 이상여부는 주행 중과 주행 후의 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행 중에는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 급정거 혹은 급출발 시 쏠림 현상 등이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 주행 후에는 타이어 윗부분의 스프링 모양으로 된 서스펜션을 손으로 눌러보아야 한다. 다른 차량의 서스펜션에 비해 너무 부드럽게 움직인다면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가까운 카센터를 방문하도록 하자.■히터에서 나는 먼지냄새! 필터 교체의 신호입니다!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차량 내, 외부에 부유먼지가 많고 두꺼운 외투에서 떨어진 먼지까지 더해져 공조기 내에 쌓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히터를 작동하면 수 많은 먼지들이 차 안에 떠다니게 되는데, 이 미세먼지에는 진드기나 세균, 또는 배기가스의 유해 성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추운 날씨로 잦은 환기가 쉽지 않은 요즘, 차량 내의 상쾌한 공기를 위해 캐빈필터(에어컨•히터필터)의 권장 주기(매 6개월 혹은 1만5,000km)를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자.
땀은 지나치게 많이... 땀이 나는 부위가 다르다. 내가 흘리는 땀은 어떤 땀이고,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체크해보자. 땀은 99%의 물과 소금, 칼륨, 질소 함유물로 구성된 액체로 우리 몸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체온이 올랐을 때 땀샘에서 분비된 땀은 노폐물과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때 주위의 열을 흡수하면서 체온을 낮추게 된다. 정상적인 땀은 아무런 색깔과 냄새가 나지 않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결핵 같은 병에 걸렸을 때는 색깔이 약간 누렇거나 붉은 땀이 난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체질과 몸 상태에 따라 우리가 흘리는 땀의 종류는 각양각색이다. 손, 발, 겨드랑이에 집중적으로 나는 땀 우리 몸 특정 부위에서 과도하게 땀이 난다면 일단 다한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다한증이 있는 사람은 주로 손과 발, 겨드랑이와 얼굴에서 땀이 나는데 글씨를 쓸 때 필기구가 젖거나, 땀 때문에 손에 습진이 생기거나 발에 땀이 나서 샌들을 신을 때 미끄러질 정도면 다한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땀의 배출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증세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도가 심해진다. 독서, 차분한 음악 감상과 명상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땀을 덜 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세요 긴장을 완화하는 대추차와 꿀차를 마시고 커피, 홍차 등과 같이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는 피한다. 고추, 후추 등 자극적인 향신료 역시 신경계를 자극해 땀을 더 나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하지만 사실 수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치료법은 없다. 수술은 종종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한다.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을 흠뻑 적시는 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가 허해지고 몸의 여러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는 몸이 땀구멍을 열고 닫는 작용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움직임이 많지 않은데도 땀을 과다하게 분비하는 것이다. 옷을 두껍게 입지 않아도 땀이 수시로 나며, 심한 경우 가벼운 운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기도 한다. 유산소 운동을 하되 30분 이상은 하지 말고 무리한 업무를 피해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하세요 평소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인삼차, 황기차, 오미자차를 마시고 기운을 보충한다. 여름 보양식으로는 삼계탕이 기운을 보충해주는 좋은 음식이다. 속옷 색깔을 누렇게 변하게 하는 땀 땀을 분비하는 땀샘에는 아포크린샘과 에크린샘 두 종류가 있다. 특히 아포크린샘이 많이 분포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서 나오는 땀은 몸의 세균에 의해 부패되면서 속옷을 누렇게 오염시킨다. 노르스름한 색을 띠는 땀은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간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데 혈액 속에 황달을 일으키는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이 증가했다는 표시다. 처음에는 무색의 땀이 나다가 점차 색깔이 변하는 것은 피부 조직에도 이상이 있다는 증거로, 땀이 날 때 몸에 열이 나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세요 평소 목욕을 자주 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어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과식은 절대 금물.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누런색 땀이 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자. 잠잘 때 흘리는 식은땀 밤에 잠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땀이 나서 옷과 침구를 적시는 사람이 있다. 이는 몸이 허하고 특히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서 나는 땀이다. 잘 때는 자동으로 체온도 낮아지는데 주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 신경이 안정되지 않아서 땀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잠을 잘 때에도 땀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다. 과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것. 침구가 젖거나, 한기를 느껴 잠을 깰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린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세요 당귀차, 둥굴레차, 산수유차는 몸의 기운을 안정시킨다. 음식으로는 전복죽이 좋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과 술을 피해야 한다. 몸 한쪽에서만 나는 땀 몸을 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한쪽에서만 땀이 나는 것은 몸 안에서 음과 양이 균형을 잃어 한쪽 기능이 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통 한방에서는 신체의 왼쪽 편에만 땀이 나는 경우는 피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신체의 오른쪽에만 땀이 나는 경우는 몸 안의 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심신이 허약해지면서 몸의 항상성이 깨져 불균형한 상태이므로 먼저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질을 진단받아 보약을 먹고 몸의 기운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세요 인삼차, 쌍화차는 허한 기운을 보충해줄 수 있다. 기름진 음식이나 향이 강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한다. 음식을 먹으면 비 오듯 흐르는 땀 식사를 하는 내내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현상을 ‘미각다한증’이라고도 하는데 위에 과다한 열이 생겨 땀이 나는 경우다. 위에 열이 생기는 것은 평소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음주가 잦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위의 열기를 빼기 위해 성질이 찬 음식을 많이 먹고, 냉수 찜질을 자주 하면 좋다. 이렇게 하세요 식사를 담백하게 하고 음주를 줄여야 한다. 녹차는 성질이 차서 위의 열을 줄여주는 데에 효과적이다. 녹차를 자주 마시고 위를 자극하는 커피나 청량음료는 피한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땀 겨드랑이의 아포크린샘에서 나는 땀은 약간 끈적끈적하다. 그 자체로는 냄새가 거의 없는데 이 땀이 세균에 의해 부패되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다. 데오도란트를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데오도란트는 장기적으로 쓰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샤워를 자주 하고 면 소재 옷을 자주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답이다. 고기 썩는 것과 같은 노린내가 난다면 간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세요 달걀과 육류, 생선을 과다 섭취해도 땀에서 고약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적절한 양만 먹는다. 아예 땀이 나지 않는 경우 체질에 따라 땀이 적게 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평소 땀이 잘 나다가 갑자기 온몸에 땀이 나지 않는 것은 특정한 질환 때문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는 것이 필요하다. 땀이 나지 않으면 발생한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해 일사병에 걸릴 수 있고, 건조해진 피부에는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 너무 자주 목욕을 하면 각질이 일어나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고 심하면 땀이 잘 나지 않는 만성무한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세요 땀이 적은 사람은 목욕 횟수를 줄이고 여름철이라도 목욕 후에는 로션을 발라 피부에 보습을 충분히 한다
담백하면서 얼큰한 국물이 당기는 계절. 제철 식품인 동태와 대구로 만들 수 있는 색다른 국물요리를 제안한다.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로 저녁상에, 바특한 찌개로 술상에 올리기 좋은 동태&대구 뉴 레서피. 동태콩나물해장탕 재료 동태 1마리, 무·콩나물 100g씩, 쑥갓 50g, 붉은고추 1개, 대파 1대, 쌀뜨물·물 2컵씩, 생강 1톨, 대파 2대, 소금 약간, 양념장(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반, 청주 1큰술, 간장 1작은술, 된장 1/2작은술, 다진 생강 1/4작은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만드는 법 1 동태는 해동시켜 비늘을 긁어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뺀 다음 옅은 소금물에 흔들어 씻어 3cm 길이로 썬다. 동태의 내장과 알도 따로 떼어내 옅은 소금물에 흔들어 씻은 뒤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머리는 버리지 말고 아가미를 깨끗하게 씻어 놓는다. 2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붓고 생강, 대파잎을 넣어 끓으면 동태살과 머리를 넣고 애벌로 살짝 익혀 물기를 뺀 후 식힌다. 3 무는 사방 4cm의 크기로 납작하게 썰고 콩나물은 머리와 꼬리를 떼어내고 씻어 물기를 턴다. 쑥갓은 깨끗이 씻어서 3cm 길이로 썬다. 붉은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씨를 턴다. 대파는 큼직하게 채 썬다. 4 그릇에 분량의 재료를 넣고 섞어 매콤한 양념장을 만든다. 5 냄비에 무, 콩나물, 동태머리를 담고 쌀뜨물과 물을 부어 뚜껑을 덮어 익힌다. 동태머리를 넣어 함께 끓여주면 국물 맛이 달고 감칠맛이 느껴져 더욱 진한 동태의 맛을 느낄 수 있다. 6 국물이 끓으면 뚜껑을 열고 준비한 찌개양념을 멍울 없이 풀어 끓인다. 7 냄비에 동태살을 넣고 끓이다가 애와 알을 얹어 한소끔 끓인 후에 소금으로 모자라는 간을 맞추고 쑥갓, 고추, 대파를 듬뿍 올려서 살짝 끓여 바로 먹는다. tips 동태찌개는 보통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는데 여기에 집된장을 약간 넣으면 된장의 구수한 맛이 동태의 비린맛을 완전하게 없애주므로 국물이 탁하지 않고 칼칼하다. 대구지리 재료 대구 1마리, 미나리·쑥갓·무 50g씩, 양파 1/2개, 마늘 3쪽, 청주 1큰술, 대파뿌리 2개, 대 파 1대, 배춧잎 2장, 붉은고추 1개, 다시마 국물 4컵, 소금· 후춧가루 약간씩, 간장소스(간장 2큰술, 다시마 국물·식초·맛술 1큰술씩, 레몬 슬라이스 1쪽) 만드는 법 1 대구는 비늘을 긁어내고 머리를 잘라 소금물에 씻어서 4cm 길이로 토막낸다. 2 체에 손질한 대구를 담고 끓는 물을 끼얹어 살이 부서지지 않게 탄력을 준다. 3 냄비에 다시마 국물, 마늘, 청주, 대파뿌리를 넣고 팔팔 끓여 국물이 3컵 정도 남을 때까지 우린다. 4 체에 ③의 국물을 따라내어 맑은 국물만 냄비에 담아 무를 납작하게 썰어 넣고 함께 끓인다. 5 배춧잎은 3cm 길이로 썰고 미나리는 다듬어 4cm 길이로 썬다. 쑥갓은 짧게 자르고 양파는 곱게 채 썬다. 6 붉은고추는 어슷하게 채 썰어 씨를 빼고 대파는 굵게 채 썬다. 7 ④의 무가 익어 단맛이 우러나면 대구를 넣고 한소끔 끓인 뒤 양파, 대파, 배춧잎, 미나리, 쑥갓, 붉은고추를 넣어 끓인다. 8 대구가 익으면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해서 상에 낸다. 대구살은 간장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다. tips 지리는 맑은 국물을 담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생선살이 부서지지 않고 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살을 탄력 있게 하려면 대구를 손질한 후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 미리 애벌로 익혀두는 것이 좋다.
오늘날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의사소통이 막혀 있다."우리가 피해야 할 바르지 못한 대화의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1. 격렬한 화약 같은 말 -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당신은 늘 그래!" "똑바로 좀 들어!" "이제는 당신 좀 변해!"이런 식으로 불 같이 말해서 문제를 확대시킵니다.자신의 말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줄을항상 본인이 알면서도 그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2. 침묵 - 침묵은 의심, 혼동, 추측, 경멸, 무관심, 냉정함을 상대방에게 전합니다.침묵 속으로 빠지지 말고, 험한 말로 남을 침묵 속으로 빠뜨리지 마십시오.3. 실망시키는 말 - "어린애도 너보다는 낫겠다."상대방의 잘못을 인식시키겠다는 의도로 이런 말을 하지만이런 말은 태도 변화를 이끄는데 가장 부적합한 말투입니다.처음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어 보이나나중에는 그 말을 아예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그래서 정작 중요한 말을 할 때도 '녹음기 틀어놓은 말'로 무시해 버립니다.4. 빗대어 하는 말 -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남을 끌어들여 말합니다.선한 얘기는 그렇게 해도 좋지만 나쁜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5. 방어적인 말 - 불편한 말을 들었다고대뜸 맞대응해서 짜증 섞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이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6. 감정 섞인 말 - 큰 소리, 화난 소리, 격렬한 소리,극적인 소리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솔직한 반영이라기보다는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나쁜 획책입니다.7. 너무 말을 많이 함 -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하거나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그 외에도 이중적 의미를 지닌 말, 미덥지 못한 눈빛,가로채는 말, 분별없는 말, 경청하지 못하는 태도 등을 피해야 합니다.혹시 자신의 말에 어떤 고칠 점이 발견되었습니까?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보너스로~~성공자의 3가지 공통점미국 템플대학 창시자 러셀 코웰 박사가2차대전 후 미국에서 백만장자로 성공한 4043명을 조사한 결과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 두 가지를 발견했다.하나는 그 많은 성공자들 가운데 고졸 이상의 학력자는 69명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사람이 성공하는데 학벌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또 두번째 공통점은그 성공자들에게는 세 가지 분명한 철학이 있었다는 것이다. 첫째는 목적이 아주 분명했다는 것이고둘째는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며셋째는 자신의 무능과 무식을 통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에 무학대사가 간월암에서 수도하면서 태조에게 진상한 궁중 진상품 서산 간월도 어리굴젓. 간월도의 굴은 자연산 갯벌에서 자라며 하루에 두 번 조수 간만의 차이로 해서 바깥 공기에 노출된다. 굴은 잘고 단단하다. 여기에 간월도 굴만의 특징이 또 하나 붙는다. 굴이 바닷물 속에 있을 때 플랑크톤을 잡아먹기 위해 내미는 ‘날감지’가 잘 발달해 있다. 물살이 거세어 그렇다고 한다. ‘날감지’는 검은 띠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간월도 굴은 검은색의 줄이 진한 편이다. 간월도 굴은 바위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갯벌에 제각각 박혀 있다가 웬만큼 자라면 갯벌로 떨어져 자란다고 한다. 그래서 간월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굴을 ‘토굴’이라고 부른다. 한방의학대전을 보면 일주일에 한번씩 먹으면 정력과 영양을 돕고 갈증에 좋다고 적혀 있다. 빈혈증, 병후의 보신, 황달, 대하증 치료에 좋고 고혈압, 신경쇠약, 피로회복, 성장발육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전통발효식초 식초류 흑초 식품명인73호 현경태흑초
전통발효식초 식초류 흑초 식품명인73호 현경태흑초
 <식품명인64호>순창고추장 강순옥 명인
<식품명인64호>순창고추장 강순옥 명인
 원주 치악산 장바우 황골엿 대표 식품명인 70호 김명자
원주 치악산 장바우 황골엿 대표 식품명인 70호 김명자

 태극잠자리 베개 커버
태극잠자리 베개 커버
 황태 델리황 3종 선물세트 오리지날맛25g+버터맛40g+매운맛 40g
황태 델리황 3종 선물세트 오리지날맛25g+버터맛40g+매운맛 40g
 황태스낵 델리황(오리지널 대30g+버터맛 대50g+ 매운맛 대50g+ 코코넛맛 대50g)
황태스낵 델리황(오리지널 대30g+버터맛 대50g+ 매운맛 대50g+ 코코넛맛 대50g)
 고소한 황태의 유혹 황홀태 황태채 75g*2개
고소한 황태의 유혹 황홀태 황태채 75g*2개
 별미레 바다한상 뚝딱세트(기본찬김, 미역, 황태무침, 생김무침, 멸치무침
별미레 바다한상 뚝딱세트(기본찬김, 미역, 황태무침, 생김무침, 멸치무침

 명인이종칠 전통목침 관광명품 180호 태극경두침(270*60*160 여성용)
명인이종칠 전통목침 관광명품 180호 태극경두침(270*60*160 여성용)
 용대리 황태포 40g*4마리
용대리 황태포 40g*4마리
 기장미역 기장사람들 사랑을 청해담은 선물세트 정성8호 미역,다시마,밥새우,황태채,맛육수,맛간장
기장미역 기장사람들 사랑을 청해담은 선물세트 정성8호 미역,다시마,밥새우,황태채,맛육수,맛간장
 황태 명절할인 4호 4(10미) 40~41cm
황태 명절할인 4호 4(10미) 40~41cm
 해남 태평농원 [자연재배]무농약 도라지배즙(도라지 20%,착즙,100ml, 30포)
해남 태평농원 [자연재배]무농약 도라지배즙(도라지 20%,착즙,100ml, 30포)

 별미레 명품 해물볶음고추장 1호 고추장으로 볶은 깨장어(250g), 중하새우(250g), 황태채(250g), 잔멸치(250g) 각 1병
별미레 명품 해물볶음고추장 1호 고추장으로 볶은 깨장어(250g), 중하새우(250g), 황태채(250g), 잔멸치(250g) 각 1병
 고추장&생돌김 세트2호 고추장으로 볶은 황태채(100g)+잔멸치(100g)*2+생돌김반절6매*8봉
고추장&생돌김 세트2호 고추장으로 볶은 황태채(100g)+잔멸치(100g)*2+생돌김반절6매*8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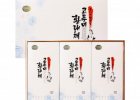 요리가 맛있는 고풍미 황태채 세트 황태채 90g *3봉
요리가 맛있는 고풍미 황태채 세트 황태채 90g *3봉
 참빛멸치세트2호 남해안산 자멸270g+중멸270g
참빛멸치세트2호 남해안산 자멸270g+중멸270g
 천연조미료6호 멸치+다시마+황태+야채해물
천연조미료6호 멸치+다시마+황태+야채해물

 석사동 CGV앞 맛집, RICE STORY 라이스스토리)베트남, 태국식 음식 :꿍팟퐁커리, 나시고렝, 파인애플 볶음밥
석사동 CGV앞 맛집, RICE STORY 라이스스토리)베트남, 태국식 음식 :꿍팟퐁커리, 나시고렝, 파인애플 볶음밥
 매콤,달콤,상큼한 강남역 동태찜집을 소개합니다.
매콤,달콤,상큼한 강남역 동태찜집을 소개합니다.
 생생정보통 바닷가재꼬치삼계탕 대게해물보쌈 임봉학 왕가리 황제탕 황제코치탕 황제해물탕 황제해물보쌈
생생정보통 바닷가재꼬치삼계탕 대게해물보쌈 임봉학 왕가리 황제탕 황제코치탕 황제해물탕 황제해물보쌈
 생생정보통 주먹시(토시살)곱창전골 영남식당 곱창식당 대구 중리동
생생정보통 주먹시(토시살)곱창전골 영남식당 곱창식당 대구 중리동
 생생정보통 대구 선지 해장국 대덕식당 선지국수 선지국밥
생생정보통 대구 선지 해장국 대덕식당 선지국수 선지국밥

아름다운 태백산의 자연환경과 어우려져 소도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마을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족과 함께하는 가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올해는 연리지지역관광명소 조성과 캠핑, 체험, 상설이벤트 헹사 등을 다채롭게 마련하여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중에 있다. 행사내용 [개막식 및 축하공연] - 식전행사 - 개막식 - 축하공연 [체험 프로그램] - 연리지나무 소원만들기 - 연리지 소원엽서 - 전통놀이 문화체험 - 매직풍선만들기 - 물풍선 터트리기 - 유채꽃 캐릭터우드 - 바람개비 만들기 - 유채밭 관람 - 유채꽃 사진/그림전시 - 물축구장, 에어바운스 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 - 유채꽃 어린이 모델 선발대회 - 유채꽃 사진 콘테스트 - 유채꽃 그림 그리기 대회 - 유채꽃 노래자랑대회
주최/주관 경상일보/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운영위원회 Tel. 052-220-0611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99 행사장소 울산교, 태화강 일대 연락처 052-220-0611 행사소개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는 현대미술과 도시의 특성을 융합한 국제 설치미술 축제이다. 국내외 현대미술작가 25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설치미술제에서 조각, 설치, 영상과 행위 예술가들의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태화강이라는 울산의 랜드마크와 실험적인 현대미술이 어우러져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울산의 정체성과 색깔을 만들어 갈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태화강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역사적인 공간 울산교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올해 미술제는 'Bridge'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다리는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을 연결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점/문화를 연결하다는 의미로 이번 미술제는 '울산'과 '현대미술'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가치와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의 장이 될 것이다.
주최/주관 태안군/태안군 모항항수산물축제 추진위원회 Tel. 태안군청 해양수산과 041-670-2870 행사소개 태안앞바다에서 어민들이 태안 바다에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 태안모항항에서 수산물축제가 열린다.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싱싱한 수산물을 주제로 한 가 개최되며 특히 모항항의 해삼이 유명하다. 해삼 심포지움, 맨손 물고기 잡기대회, 물고기 방류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위치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행사장소 충남 태안군 모항항 연락처 태안군청 해양수산과 041-670-2870 행사내용 - 개막식 - 해삼 심포지움 - 바다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 태안요리 및 수산물 무료시식 - 방류체험 - 바다낚시체험 - 맨손물고기잡기 - 수산물 경매 및 중량 맞추기 - 도전 골든벨 등
태백 해바라기축제 주최/주관 해바라기문화재단/후원:태백시, 할아텍, 후아즈, 대진전기판매, 태백광업소 등 Tel. 033-553-9707 행사소개 전국 최대의 해바라기 꽃밭과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야생화와 함께하는 해바라기축제가 강원 태백시 황연동 (구와우마을)에서 펼쳐진다.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해바라기 꽃밭 탐방로를 비롯해 야생화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꾸며진다. '자연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화두를 갖고 해바라기의 바다와 태초의 숲길, 그리고 300여 종이 넘는 야생화를 20만평이 넘는 축제장에 준비하였다. 행사기간 2014.07.25 ~ 2014.08.16 위치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38-33 (황지동) 행사장소 강원 태백시 구와우마을 연락처 고원자생식물원 033-553-9707 행사내용 6월 중 확정 예정
태백 쿨시네마페스티벌 주최/주관 태백시/태백산쿨시네마 축제위원회 Tel. 033-550-2085 행사소개 도심평균 해발이 약 650여 미터에 이르는 태백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대표적인 고원관광휴양도시로 유명하다. 태백시에서는 7월 26일 ~ 8월 3일까지 9일간 을 개최한다. 1997년부터 시작된 '태백 쿨 시네마 페스티벌'은 오랜 기간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하게 하였으며 태백시민 노래자랑대회도 개최한다. 또한 전년과 마찬가지로 시내 중앙로에서 워터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이번 워터 페스티벌에는 신나는 물싸움과 타악퍼포먼스, 버블체험을 새롭게 도입되어 참가자들이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행사기간2014.07.26 ~ 2014.08.03 위치강원도 태백시 서학로 861 (황지동) 행사장소오투리조트스키하우스 등 연 락 처033-550-2085 행사내용 - 개막식 - 시상식 및 축하공연 - 시민노래자랑, 초대가수 - 영화/야간영화 상영 - 문화공연 등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찾기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찾기
 [인천 가볼만한곳]습지생물 군락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가다.
[인천 가볼만한곳]습지생물 군락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가다.
 [블로그 공모전 당선작] 인천 소래포구와 소래습지생태공원 가족여행
[블로그 공모전 당선작] 인천 소래포구와 소래습지생태공원 가족여행
 [인천 여행] 소래습지생태공원~물왕저수지 자전거 라이딩
[인천 여행] 소래습지생태공원~물왕저수지 자전거 라이딩
 산정에서 느끼는 궁극의 쾌적함! 평창 가볼만한 곳 BEST(태기산의 풍력발전기,청옥산 중턱의 자작나무군락지,평창강의 평화로운 풍경)
산정에서 느끼는 궁극의 쾌적함! 평창 가볼만한 곳 BEST(태기산의 풍력발전기,청옥산 중턱의 자작나무군락지,평창강의 평화로운 풍경)

고흥김(흥양김) 해태(海苔), 해의(海衣), 자채(紫菜),청태(靑苔), 감태(甘苔), 건태(乾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숨 쉬는 땅, 전남 완도. 완도가 김과 미역의 천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인의 밥상에…
&nb...의(海衣)’, ‘자채(紫菜)’라고 하며 우리에게는 ‘해태(海苔)’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일본식 표기로, 우리나라에서의 ‘파래’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김에 관한 기록으로는 경상도지리…
광천김은 해태(海苔), 해의(海衣), 자채(紫菜),청태(靑苔), 감태(甘苔), 건태(乾苔) 김은 한자어로는 ‘해의(海衣)’, ‘자채(紫菜)’라고 하며 우리에게는 ‘해태(海苔)’로 …
≪ 굴(참굴) 무엇...경기도(강화도호부,교동현,김포현,남양도호부(화성),부평도호부,수원도호부,안산군,인천도호부,통진현,풍덕군) 경상도(고성현(통영),곤양군,김해도호부,동래현,사천현,울산군,熊川縣,진해현,창원도호부,하동현) 전라도(강진현,나주목,낙안군,무…
영덕 삼척 오십천 ...1개월 정도 하천에 머물다가 바다로 나가 북해도 수역을 거쳐 베링해와 북태평양에서 성장하고, 3~4년 후 어미가 되어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산란 후 일생을 마치는 대표적 모천회귀성 어종이다.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는 지난 1970년부…
초두루미(흑초) 전통발효식초 식초류 흑초 식품명인 73호 현경태 초두루미(흑초)식초 효능 (흑초 효능) 1) 몸의 피로를 만드는 유산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또 만들어진 유산을 분해하여 피로를 풀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2) 혈액의 순환을 도와 동맥경화나 …
선해수산바다소리,건...다소리,건어물, 해산물, 생돌김, 자연산 돌미역, 새우, 죽염 멸치, 황태
국화농원국태,국화차, 국화베개,감국
소금 전문업체, 태안자염, 끓여만든 전통소금 등 제품 소개, 태안바다 및 갯벌 관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