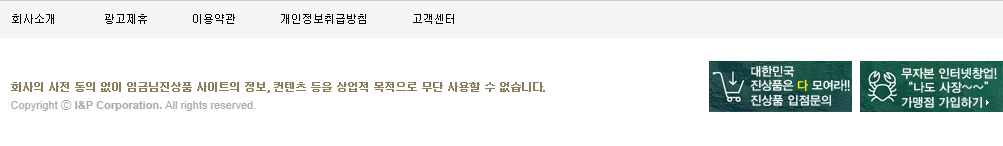무형유산 지식백과(무형문화지식연구원)
http://hidream.or.kr/dongeuibogam/index.html - 한글 동의 보감 -음양오행 -사상의학 -장부학 -쑥뜸과 부항 -지압과 경락 -수지침요령 -민간요법과 질병기초 -한방약초의 종류와 효능 -한방식품의 종류와 효능 -한방약차 -한방약술 -암에 도움되는 약초 -건강 상식 -건강정보자료 -한방처방전 -민간약상식 -향약집성방과 향약본초 -1000가지 일반 요리법
태조 - 철종 1대 태조(1392년~) 2대 정종(1399년~) 3대 태종(1401년~) 4대 세종(1418년~) 5대 문종(1450년~) 6대 단종(1452년~) 7대 세조(1455년~) 8대 예종(1468년~) 9대 성종(1469년~) 10대 연산군(1494년~) 11대 중종(1506년~) 12대 인종(1545년~) 13대 명종(1545년~) 14대 선조(1567년)선조수정(1567년~) 15대 광해군중초본(1608년~)광해군정초본(1608년~) 16대 인조(1623년~) 17대 효종(1649년~) 18대 현종(1659년~)현종개수(1659년~) 19대 숙종(1674년~)숙종보궐정오(1674년~) 20대 경종(1720년~)경종수정(1720년~) 21대 영조(1724년~) 22대 정조(1776년~) 23대 순조(1800년~) 24대 헌종(1834년~) 25대 철종(1849년~) 고종 - 순종 26대 고종(1863년~) 27대 순종(1907년~) 순종부록(1910년~)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보통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작다고 생각하면 주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십니다. 엄마 혹은 아빠를 닮았기 때문에 작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키작은 아이는 단 한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키작은 아이 무엇이 문제일까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은 이유 1. 유전적인 요인 앞서 말한 유전적인 요인은 실제 원인의 30% 정도에만 해당합니다. 즉 나머지 70%의 역량은 부모의 관심과 아이의 습관, 후천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때문에 우리아이가 키가 작다면 유전적인 요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키가 크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키가 크기 위한 진리입니다. 밤 10시에서 2시 사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왕성한 시간대이기 때문이지요. 요즘 아이들은 과도한 학업량으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학교에서 조는 시간이 많은데요. 밤시간대만큼은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균형잡힌 영양상태 아이의 영양상태에 따라서 평균 키가 5cm 가량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타고나는 것 이상으로 균형잡힌 식사는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영양상태가 불균형하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역량보다 더 작게 자라게 됩니다. 환경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 소화가 잘 되는 영양풍부한 음식으로 준비해주세요 4. 운동부족 잠을 잘 자는 것 외에 운동이 부족해도 성장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키 작은 아이가 고민이시라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 능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농구처럼 몸을 뻗을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키가 작은 아이들로 고민이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워낙 외모가 중시되는 풍토에서 키는 빼놓을 수 없는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각종 한의원 프로그램에는 아이의 성장을 돕도록 오장육부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히 아이가 부족한 부분의 영양상태를 균형있게 맞춰주기 때문에 키가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근본적으로 튼튼해 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키 작은 아이 무엇이 문제일까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충분한 부모님의 관심과 아이의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는 조건들이니만큼 가정에서도 아이의 키에 한결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아이의 키도 한뼘 더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