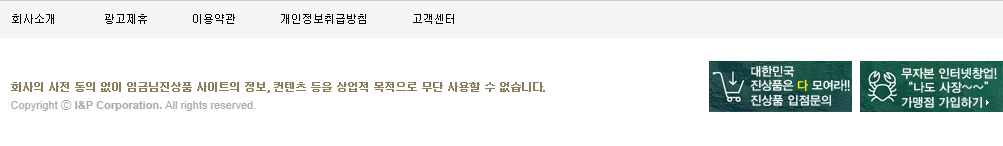조선시대 집이나 누정, 사찰 같은 공간에는 하나같이 문학과 예술, 풍류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선비들은 도성 안에 살면서도 늘 귀거래(歸去來)를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풍류를 생각하며 전원으로 물러가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몸은 도시에 있으면서 마음을 전원에 두기 위한 방편을 마련했으니, 이를 특히 동아시아에서 와유(臥遊)라 했다. 와유라는 말은 송(宋)의 종병(宗炳)이 사람이 늙고 병들면 명산을 두루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노년에 누워서 보기 위해 유람했던 곳을 모두 그림으로 그려 방에 걸어두었다는 일화에 연원을 두고 있다.
조선의 문인들은 풍류를 즐기는 데 녹록치 못한 현실에서 와유로써 사랑하는 산과 물을 그린 그림을 벽에 붙이고 두고 온 전원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한 예로 조선 중기의 문인 이정귀(李廷龜)는 자신이 살고 싶어 했던 섬강(蟾江)의 풍경을 그린 그림을 두고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랴. 나로 하여금 매일 이를 마주하게 하니 종병의 와유에 해당할 만하다. 어찌 반드시 초가를 짓고 은거해 내가 있는 자리에서만 차지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되겠는가?”라 하고, 그 화첩에다 “비 내리는 대숲 안개속의 배가 눈앞에 가득한데, 종일 누워서 노니노라니 그 또한 나의 집이로다(雨竹煙帆森在眼 臥遊終日亦吾盧)”라는 시를 붙였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익(李瀷)은 “와유라는 것은 몸은 누워있으나 정신이 노니는 것이다. 정신은 마음의 영(靈)이요 영은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 불빛처럼 순식간에 만 리를 갈 수 있기에 사물에 기대지 않아도 될 듯하다. 하지만 볼 수 없는 자는 꿈을 꾸지 않는다. 사물의 모습과 빛깔은 시각기관에서 관장한다.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생각도 말미암아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와 방불한 것은 모두 눈으로 얻는 법이다”라고 했다. 이익은 와유를 위해서는 매개물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매개물을 이용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대신하거나 가짜로 진짜를 대신해 풍류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매개물을 통해 자연을 끌어당기다
조선 선비가 풍류로써 즐긴 와유의 매개물로는 화분에 꽃을 키우거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가산(假山)이 널리 이용됐다. 화분용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전문서 『양화소록(養花小錄)』이 15세기에 출현했거니와, 이른 시기부터 대궐이나 귀족들의 집에는 계절에 따라 수십 종의 화분이 진열됐다. 공간이 넓지 않은 곳에 작은 못을 만드는 지혜도 있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조덕린(趙德?)은 승정원(承政院)에 연꽃을 재배하기 위해 항아리를 이용해 인공의 작은 못을 만들고 연꽃을 심어 감상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앞 뜰의 빈 땅에다 돌을 쌓아 사방에 기둥 넷 들어갈 크기의 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흰 모래를 깔고 잔디를 입힌 다음 한가운데 질 옹기 둘을 두고 물을 진흙과 함께 채운 다음 그 안에 연꽃을 심었다. 이리해 넓지 않은 관공서의 뜰에서 연못에 핀 연꽃을 감상할 수 있었다.
정원에 제법 규모가 있는 가산(假山)을 조성한 것도 이른 시기부터 유행했다. 신라 경덕왕이 침단목(沈檀木)을 조각한 목가산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보이거니와 조선시대에도 가산이 크게 유행했다. 조선 초기의 문인 채수(蔡壽)는 높이가 5척, 둘레가 7척 규모의 바위로 가산을 만들고 조그만 나무를 심었으며 대통을 이용해 물길을 땅으로 끌어와서 2척 남짓한 폭포를 만든 바 있다.
18세기의 학자 박세채(朴世采)는 “바위로 가산을 만들고 꽃을 여기저기 심어 사시사철 울긋불긋한 꽃이 어리비치도록 했으며 건물 곁에 물을 끌어들여 늘 그 사이에 노닐면서 와유의 뜻을 부쳤다”고 했으니 멀리서나 볼 수 있는 꽃 피는 산이 그의 작은 뜰 안으로 들어왔다. 조선 후기의 문인 이의숙(李義肅)은 자신이 만든 석가산을 두고 “그 작은 것으로부터 작게 여긴다면 주먹만 한 바위를 포개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것을 유추해 크게 여긴다면 천하의 큰 산도 이 석가산보다 큰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산이 비록 작지만 누가 감히 작다고 하리요? 이 때문에 누워서 보면서 정신으로 유람하는 것이기에 이름을 와유산이라 했다”라 한 바 있으니, 적당한 매개물만 있으면 상상으로 자연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대신한 풍류의 방편
도성 안의 집에서 바다를 상상으로 즐기기 위해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는 방편을 만든 예도 있었다. 어항은 어분(魚盆)이라고도 하는데 돌이나 자기로 된 것이 아닌 유리로 된 것은 조선 후기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초반 조위한(趙緯韓)의 시에 유리병에 물을 담아 붉은 물고기 몇 자리를 길러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고 한 것을 보면 이 무렵부터 서서히 유리 어항이 유행하게 된 듯하다. 17세기 후반의 문인 김성최(金盛最)는 이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바다를 끌어들이고자 해 그 이름을 유리해(琉璃海)라 불렀다. 그가 만든 유리해는 길이가 한 자가 되지 않는데 바깥은 둥글고 안은 비어 있으며 영롱하고 투명해 마치 웅덩이 하나에 은을 녹여놓은 듯했다. 그 안에 물고기 수십 마리가 놀고 있는데 파닥파닥하면서 왕래해 마치 큰 골짜기에서 멋대로 노닐고 구름 같은 파도 위로 뛰어오르는 듯 자유로웠다. 그 위에는 기괴한 소나무와 삐죽삐죽한 절벽이 빽빽하게 깎은 듯 솟아 있었다. 이렇게 만든 어항 앞에 앉아서, “종일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고 자리에서 떨어지지도 않아도 정신은 바다와 산에 노닐게 됐네. 방문을 밀고 나서지 않아도 하늘과 연못에서 노니는 듯했네”라 자랑했다. 유리병 위에 술잔 받침대를 올려놓아 유리병을 바다로 삼고 받침대를 산으로 삼고서, 방안에서 바다와 산에서 노니는 신유해악(神游海岳)의 경지를 터득한 것이다.
조선 후기의 문인 오연상(吳淵常)은 자신의 집 연못에다 좀 더 종합적인 강호를 재현했다. 7~8월 사이 장마가 끝나고 가을 물이 일어나면, 몇 평의 연못은 물이 쪽빛보다 파래진다. 연꽃은 붉게 줄이어 피어나고 푸른 잎은 차곡차곡 펼쳐진다. 그 위에 푸른 소나무와 오래된 버드나무가 있어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때 아이종을 시켜 박을 쪼개어 배를 몇 척 만들어 띄웠다. 나무로 인형을 만들고 색깔 들인 종이로 옷을 입혀, 그 교묘함을 지극하게 한 다음 바람에 흘려보냈다. 빙빙 돌아 흘러내리다가 배가 서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작은 돌섬에 서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무성한 물풀 잎사귀에 걸려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 난간에 기대어 바라보면 완전히 강남땅 횡당(橫塘)의 풍경을 보는 듯하며, 고기 잡는 어부들이나 연밥 따는 아낙네의 노랫가락이 들려올 듯만 같다고 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대신하고 상상의 힘으로 풍류를 즐기는 와유의 방식이라 하겠다.
글을 통해 상상 속 자연을 즐기다
자연을 즐기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란 도심에서는 그리 쉽지 않다. 이럴 때에는 글을 통한 풍류도 가능하다. 조선 후기의 학자 서유구(徐有?)는 『장자(莊子)』에서 이른 차여택(此予宅)이라는 용어를 빌려 상상의 주거 공간을 설계했다. 길이가 2장, 폭이 4척 정도 되는 배를 만들어 손님과 주인 여섯 명, 노복이 네 명이 탈 수 있게 했다. 배 중앙에는 기둥을 세우고 장막을 쳐 실내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 버드나무 늘어선 제방과 갈대 우거진 물가에 둥실 띄우고 마름을 캐거나 물고기를 낚노라 했다. 또 길이가 6장 2척되고 넓이가 5장 1척되는 배를 만들어 일백 개의 술병을 저장하는 창고를 두고 한 구석에는 자그마한 집 한 채를 지어서 누워서 시를 읊조린다고 했다. 서유구는 이런 글을 지어놓고 상상으로 자연을 즐겼다.
또 비슷한 시기의 문인 신위(申緯)는 자신의 집 이름을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집이라는 뜻으로 문의당(文?堂)이라 이름 붙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륙조차 섬이요, 이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들조차 수중생물이라 하면서 도성 안의 문의당도 크게 보면 바다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고 했다. 또 신위의 선배인 이종휘(李種徽)는 자신의 집을 함해당(涵海堂)이라 했다. 젊은 시절 부산의 몰운대(沒雲臺)와 해운대(海雲臺)에서 보았던 바다의 기억을 잊지 못해 서울의 남산 아래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이름을 바닷물로 적시는 집이라는 뜻에서 함해당이라 했다. “눈은 내 방안에 있지만 오래 사방의 벽을 보고 있노라면 벽에서 파도 문양이 생겨나 마치 바다를 그려놓은 휘장을 붙여놓은 듯하다. 절로 마음이 탁 트이고 정신이 상쾌해져서 내 자신이 좁은 방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라고 했다. 상상력만으로 부산 앞바다도 방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마음을 열어 풍류를 품에 안다
도시화로 인해 산과 물이 더욱 멀어진 시대지만, 누워서 산과 물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럴 듯한 산수화를 걸어두기도 거실에 물기가 마르지 않은 수석을 두거나 화분을 놓고 완상하기도 한다. 심지어 현대식 건물의 2층에다 마당을 만들고 툇마루를 둔 집도 본 적이 있다. 이러한 물질적인 매개를 통한 풍류도 즐겁지만, 마음의 눈을 열어 관념에 의한 풍류 역시 현대인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도시를 떠나지 못하더라도 전원에 살면서 누리고 싶은 꿈을 차분하게 적고 이를 읽거나, 그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옛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러한 글을 읽노라면 몸은 도심에 있어도 정신은 전원에 있게 된다. 이조차 어려우면 바다나 산을 끌어들이겠다는 이름을 작은 방에 걸면 바다와 산이 가슴 속에 열린다. 이것이 옛글을 읽는 뜻이다.
출처 : 문화재청홈페이지 글 이종묵(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